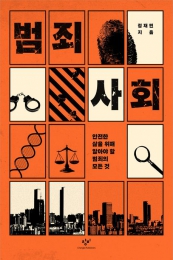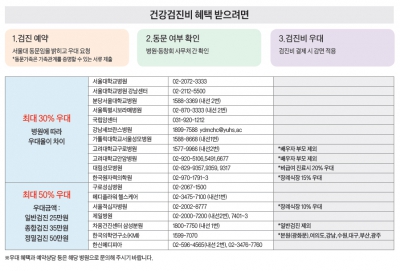[488호 2018년 11월] 기고 에세이
녹두거리에서 : 대입 치르던 날
정재민(법학96-01) 전 판사·작가·방위사업청 과장
대입 치르던 날
정재민(법학96-01)
전 판사·작가·방위사업청 과장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나는 법대 96학번이다. 1996년 1월 초 경이었던가, 대입 본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처음 모교인 서울대를 가보았다. 그 전까지는 아예 서울에 와본 적이 없었다. 시험 이틀 전 나와 어머니는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새마을호도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의자 등받이 머리를 두는 곳에 호텔 시트처럼 깨끗한 천이 걸린 것을 보고 감탄하고, 서울역이 가까워질 때 기차의 선로가 예닐곱 개 이상으로 퍼지는 것을 보고서 살짝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촌놈이었다.
서울역 광장에서 고풍스러운 서울역 건물과 육중한 대우빌딩을 번갈아가며 넋 놓고 바라보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던 사촌형님이 다가왔다. 어느 중견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던 사촌형님이 우리를 주차장에 세워둔 ‘각 그랜저’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향했다. 사촌형님이 자신의 이모인 우리 어머니에게 나의 시험기간 이틀 동안 용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머물러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그때는 사촌형님이 시골에서 맨손으로 서울로 가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면서 고급차를 타고 집도 장만한 것으로도 굉장히 출세한 것 같았다.(따지고 보면 그때 사촌형님은 지금의 나보다 다섯 살이나 어렸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의 형님처럼 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다)
낮고 오래된 주택이 가득한 언덕의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올라가자 비로소 사촌형님의 주택이 나왔다. 그런데 형님의 집은 우리 두 식구가 머물기에는 너무 좁았다. 게다가 형수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 두 식구까지 죽치고 있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다. 애초에 사촌형님이 서울 사는 조카라는 체면상 우리 어머니에게 자기 집에 있으라고 인사치레처럼 말한 것인데 어머니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그냥 서울대 근처 하숙집에 숙소를 구하기로 하고 말리는 형수를 억지로 떼어놓고 형님 댁을 나왔다. 전철도 생전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신용산역에서 블루라인 4호선을 타고 가다가 사당역에서 그린라인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리면 되어요, 도련님.”이라는 형수의 지시사항만 반복해서 되뇌었다. 우리는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2호선의 초록색 전철이 우리를 태우러 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하나의 버스정류장에 여러 종류의 버스가 오듯이 같은 지하철 플랫폼에 여러 종류의 지하철이 다니는 줄로만 알았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초록색 전철은 오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지하철 역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탔다. 그마저도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 서울대를 찾는 그 흔한 바보짓을 몸소 했다.
우리는 신림동 녹두거리 근처에 허름한 하숙방을 하나 구했다. 시험 특수라 이틀 숙식에 30만원의 거금을 주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국과 갈비를 떠주던 기억이 난다. 밤새 창밖에는 눈발이 날렸다. 겨울바람이 휘파람 소리와 함께 유리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잠이 깊이 들지 않았다.
다음 날 법과대학 현관 앞에서부터는 수험생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옷을 춥게 입은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서 숙소에서 쉬고 계시라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건성으로 끄덕이면서 나에게 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오전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점심도시락을 먹지 않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보았다. 손바닥으로 성에가 가득 낀 현관문 유리창을 닦아보니 예상대로 어머니가 아침에 보았던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무덤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시험 중에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주먹 쥔 손의 가운데 손가락 마디로 유리창을 톡톡 두들겼다. 몇 번을 반복하자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눈을 떴다. 나는 추운데 덜덜 떨면서 몇 시간을 기다린 것에 대해 원망이 담긴 눈초리로 잠시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한 자 한 자 입 모양을 만들었다. “시, 험, 잘, 봤, 어, 요.”
어머니는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었다. 나는 더욱 천천히 같은 입 모양을 반복했다. 그러자 얼어붙은 어머니의 깡마른 얼굴이 풀리면서 미소와 함께 불그스름한 생기가 돌았다.
그것이 모교에서의 첫 추억이었다. 곧이어 펼쳐질 대학생활과 서울생활과 새롭게 맺을 인간관계가 새마을호, 전철, 서울역, 대우빌딩에 비할 수 없이 낯설고 어렵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였다.
*정 동문은 '소설 쓰는 판사'로 불린다.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판사와 유고유엔국제 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16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 ‘보헤미안랩소디'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 이사부’로 2010년 매일신문주최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했다.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에 이어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과 일본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썼다. 이를 계기로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 신동아에 '판사 정재민의 리걸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달 초 법정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를 출간했다.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