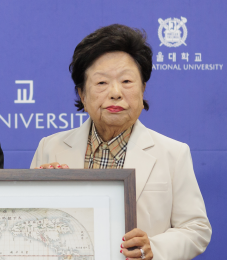[483호 2018년 6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노벨상 타려면 ‘빅 사이언스’ 해야
조장희 수원대 뇌과학연구소장
노벨상 타려면 ‘빅 사이언스’ 해야
조장희
전자공학55-60
수원대 뇌과학연구소장
본인이 처음 구라파로 유학 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한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다. 지하 50미터에 반경이 몇 백 미터가 넘는 거대한 것이었다. 1960년대였으니까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연구시설로 한 대학이 이러한 큰 연구 기기를 놓을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거대한 플라즈마 핵융합 연구시설을 보았는데 이 플라즈마 실험실은 4층 건물의 지하실과 지상 1층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연구시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실들이 당시 벌써 노벨상을 탄 교수와 후에 노벨상을 탈 세계적인 교수들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빅 사이언스’가 있고 이를 설계하고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교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마도 노벨상인 것 같다. 10월달이면 신문에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 받느냐고 야단법석을 할 정도로 받고 싶은 상이며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없는 노벨상 제로 실적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하고 국민 전체가 안타까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모두는 우리 대학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대학이 노벨상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벨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본인이 70년대 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이후 고등과학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는 노벨상을 꼭 타기 위해 만든다고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문제는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이 투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빅 사이언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독지가들이 다투어 “장학금” 나누어 주기에 바빴고 근래에 와서는 서울대에서 노벨상을 탈 젊은 교수들을 선발해 매년 1억원씩 연구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 내용인즉 이렇다. “모든 노벨상은 젊었을 때 한 연구 결과로 탄다. 그러므로 젊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주어야 한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내가 젊은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는 연구는 젊어서 한 것이라는 오해를 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는 연구는 사실 나이와는 상관없다. 그것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연구한 것만 노벨상을 타느냐 하는 것은 노벨상은 그 연구에 대한 평가가 있기까지 몇 십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연구’ 에서 ‘노벨상’까지는 평균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벨상 받을 연구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벨상을 받을 30~40년 후에는 정작 죽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젊어서 연구한 것들만 노벨상을 탄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젊은 연구원이나 대학원 학생 또는 젊은 교수들은 경험과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교수와 더불어 그 연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문제를 같이 풀었을 때 30~40년 후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연구할 수 있는 저변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젊은 교수가 새로이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비를 받아서 조그만 (남이 다하는 또는 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만들어 연구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벨상급 연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벨상급 연구는 주로 빅 사이언스와 관련이 있다. 앞서 빅 사이언스로 언급한 입자가속기를 예로 들어보면, 입자가속기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인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76명이나 배출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학 같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노벨상급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빅 사이언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세계에 없는 규모가 큰 연구, 즉 빅 사이언스를 할 수 있겠는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빅 사이언스를 해낼 수 있는 그 분야에 리더를 영입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많은 좋은 예가 있다. 최근에 USC(남가주대학)에서 UCLA의 토가(Toga)교수를 영입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 토가 교수는 100여 명의 동료교수 및 연구원들과 함께 USC에 영입되면서 유전자 연구를 통한 뇌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연구비는 USC의 켁 재단(Keck Foundation)에서 지원하였다. 한 대학에서 한 대학으로 100여 명의 동료연구원과 교수를 이동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빅 사이언스인 것이다.
우리는 단 10명의 연구원과 교수가 움직였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았다. 노벨상은 선진국의 대명사와도 같으며, 한 국가나 민족의 명예이며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고 또한 한 나라의 대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좋은 대학 없이 노벨상을 타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좋은 대학은 필히 세계에 앞서가는 빅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수많은 젊은 연구원들과 젊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30~40년 후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용어가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이다. 피를 말리는 투자와 제대로 된 투자가 우리의 ‘대학’을 ‘대학’같이 만들 것이며, 이에 대한 결실이 노벨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