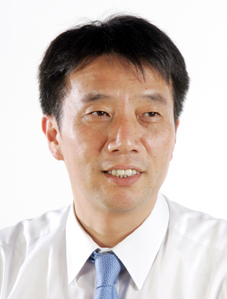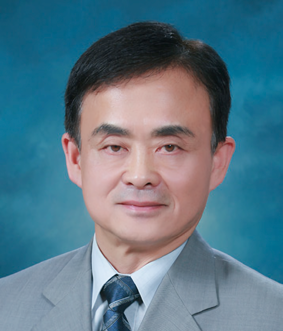[450호 2015년 9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정년퇴임 자리에 서서
백종현 서울대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 자리에 서서
오늘 함께 퇴임하는 우리 스물 셋은 모두 1950년 6.25 한국전쟁 직전후 민족상잔의 때에 태어나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68년, 69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교사도 식민지 시절의 대학건물 그대로, 교탁과 책걸상도 대부분 식민지 시절에서 넘겨받은 것을 아직도 사용하던 때입니다. 1971년 4월 우리 대학의 종합캠퍼스가 이 관악에 조성되던 날 당시 국문과 재학생이던 64학번 정희성 시인은 이런 축시를 썼습니다.
‘그 누가 길을 묻거든 / 눈 들어 관악(冠岳)을 보게 하라.’ <중략>
시인의 장중한 구절들은 우리의 혼에 천세의 힘을 넣어주었고, 서울대인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를 늘 일 깨워주었습니다.
서울대인은 늘 매사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사회의 현안 중 현안은 양극화 문제이고, 그 안에 비정규직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대학 내 근무자 중 절반이 비정규적인 현실을 우선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 없으면 시한을 정한 단계별 해결 방안을 내놓고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한다면 사람들이 눈 들어 관악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서울대 교수는 늘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는 진정한 의미의 ‘학자’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 하는데, ‘학문(學問)’, 곧 ‘배우고 물음’이란 본디 “배움으로써 덕을 모으고, 물음으로써 그것을 변별함(學以聚之[=德] 問以辨之)”(‘周易’, 乾爲天)을 그 내용으로 갖는 것이며, 여기서 ‘덕(德)’은 단지 지식의 힘뿐만 아니라 도덕적 실천의 힘을 지시합니다. 그런데도 세속세계에서는 학문=지식=과학기술이 동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식이야 말로 힘이다(ipsa scientia potestas est)’라는 매력적인 표어는 과학적 지식이 전근대적인 삶의 고초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의식주의 필수품을 구하는 데 매인 사람들의 삶에 자유와 여가를 줌으로써 충분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힘인 지식은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서도 세계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데서도 어떠한 한계도 알지 못합니다. 힘인 지식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연을 개작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 없이 이용됩니다. 지식은 기술에든, 자본에든, 권력에든, 전쟁에든, 가리지 않고 힘이 됩니다. 갈수록 자연과학이 대세로 자리 잡고, 진리로 찬양받는 것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을 이용하는 지식=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릇 어떠한 힘이라도 중심에 ‘사람’이 놓이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로봇공학이든 생명공학이든, 아니 과학기술 일반이 인간의 창출인 이상 인간의 품격을 고양하는 데 유용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 캠퍼스는 떠나지만 오랜 세월 대학에서 한 공부를 더 다듬어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 합니다. 이 보배로운 ‘빛의 성전’에 남아 연찬을 거듭하실 후학 여러분들은 더욱 더 매진해 나라 번성의 토대를 닦고 인류 문화 창달을 쉼 없이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