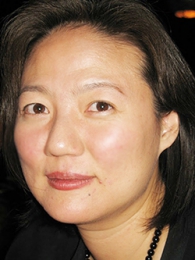[568호 2025년 7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서울대인의 다양성

전경하 (독어교육87)
서울신문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꽝 나올까 봐 복권 안 긁는 바보’라는 대사가 나온다. 기대에 못미칠까 봐, 자신한테 실망할까 봐 하고 싶은 일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고집하는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대사다. 이 대사에 지난해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다.
서울대는 학부대학 신설을 앞두고 인재상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심층면접했다. “도전했다가 30~40세쯤에 초라해질 리스크를 안는 데 압박감을 느끼는 듯하다”, “기존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부정적인 언급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졸업생이라면 리스크를 안는 대신 정해진 길로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나 지금이나 높다.
한 달 전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14명 가운데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경제안보수석, 민정수석 등 8명이 동문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까지 지명된 장관 후보자 16명 중 동문이 8명이다. 실용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폐지론’을 내놓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문들은 중용됐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국회나 공직에 진출한 동문들이 많다. 끈기, 분석 능력, 실행력 등에서 뛰어나다. 하지만 ‘서울대’로 특정 지어지면 비판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때론 잘하면 서울대 출신이니 당연하다고 평가받고, 못하면 서울대 출신인데도 못한다고 더 폄하되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지난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다. 일반고 전체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인데 서울대 진학생은 32%란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로 좁히면 졸업생은 4%, 서울대 진학생은 12%다. 2018년 기준인데 서울대 진학생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다.
보고서는 서울과 비서울 간 진학률 격차 가운데 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하다고 추산했다. 필자는 두 아들을 서울대에 못 보냈지만 애들 학창 시절 동안 서초구에 거주했다. 92%까지는 아니지만 한은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한은은 창의성,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된다면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추천했다.
입시 제도는 워낙 복잡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그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솔직히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수험생이 실험실의 쥐냐’는 격앙된 비난이 낯설지 않은 터라 개선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대가, 동문들이 먼저 바꿔나가자. 서울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2016년 다양성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다른 대학에도 다양성위원회가 생겼다. 구성원의 다양성은 다름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제다. 다양한 구성원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만들어 나가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능력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서울대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 남길 희망한다.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걱정이 무색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