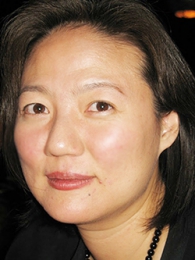[561호 2024년 12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결국,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본지 논설위원
결국,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전영기 (정치80-85)
시사저널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천적(天敵)은 자연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를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곡식을 먹는 참새, 참새를 잡는 매나 족제비같은 동물들이다. 무당벌레의 애벌레는 먹이가 부족할 경우 먼저 태어난 것이 갓 태어난 놈을 잡아먹는 동족간 천적으로 분류된다.
천적은 약육강식의 잔인성을 풍기지만 특정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생태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는 무적이다. 호랑이, 악어, 늑대, 범고래, 상어 등이 최상위에 해당하고, 최상위 중의 최상위는 인간인데 이들이 어떻게 멸종할지는 정확히 예측되는 바가 없다.
요즘 서울대 출신 대통령의 몰락을 보면서 ‘천적’에 관한 상념이 피어 오른다. 몰락의 주인공에 대해 오래 전 취재차 만난 어떤 관상학자는 “그분의 얼굴은 악어상이다. 악어는 천적이 없다. 적을 만나면 큰 입을 쩍 벌려 다 잡아 먹는다. 그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실제 얼굴 생김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다 성격도 굽힘이 없고,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행태가 악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악어가 뭍으로 나가게 되면 예컨대 삵쾡이 같은 날쌘 짐승들한테 먹힐 수 있다. 최상위 포식자는 어떨 때 종말을 맞을까.
2003년에 82세로 돌아가신 조병화 시인은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 가장 짧은 시를 썼다. 12글자 짜리로 제목은 ‘천적’.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감전된 듯 깜짝 놀랐다. 여러 번 읊조리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시인이 세상을 등지기 몇 년 전 그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놨다.
“실로 나를 살리고, 죽이고, 망치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다른 아무 것도 없다. 참으로 긴 내 인생, 그 천적을 잘도 이겨내면서 살아왔구나.”
시인은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천적(즉, 자기)과 싸워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가 “시간을 아낀다.” 철저하게 아낀 시간을 무기로 인생을 여유 있게 꾸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 둘째가 “부지런하게 살자”라는 근면 정신. 시인은 생애를 돌이켜 보며 게으르지 않고 성의를 다해 힘차게 살아왔다고 했다. 셋째는 “시들지 않는 꿈.” 꿈을 꾸고 줄기차게 이뤄나가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즉, 시간과 근면과 꿈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조병화 시인을 보호한 방패이자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천적이 없는 셈이다. 오직 자신이 자기의 적일 수밖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과 싸워 이기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젊을 때는 한창 연마를 하고 나이가 들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노년의 때에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위 중의 최상위 포식자가 무너지는 내적 심리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여러 권력자들한테 드러나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①의심 ②사심(私心) ③분노 ④조바심이다. 이런 성정은 잘 관리 조절해야 한다. 과할 땐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