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호 2023년 11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의대 공화국’ 보다는 ‘서울대 공화국’
‘의대 공화국’ 보다는 ‘서울대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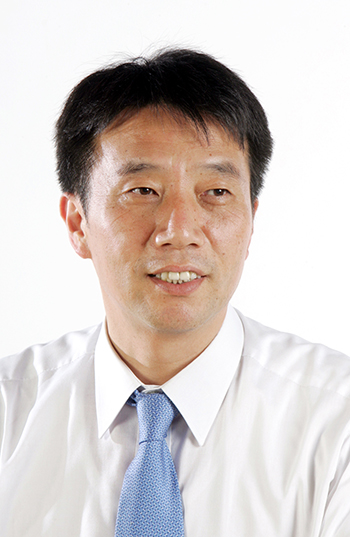
김창균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418명이라고 한다. 입학정원의 10%가 넘고, 4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것은 대학입시 재도전을 위한 속칭 반수(半修)가 대부분이다. 다른 대학에선 예전부터 흔했지만 서울대에 합격해 놓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에 진학하기에 실력이 달렸던 수험생들이 서울대 다른 학과에 일단 합격해 놓은 뒤 재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방방곡곡 의대를 성적순으로 채운 뒤 서울대 다른 학과를 지원한다는 속설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앞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이런 의대 재도전 반수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타 수학 강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TV 드라마에서 입시학원이 최우수 학생들을 추려 운영한다는 ‘의대 올케어반’ 얘기를 듣게 됐다. 저게 실제 상황일까 반신반의했는데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올케어반까지 생겼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40여 년전 필자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이과에서 의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최고 수재들 중에는 자연대나 공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지만 비상한 천재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당시는 서울대 인기학과를 성적순으로 채운 뒤 다른 대학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고3 진학 상담 담임들은 비인기 학과로 하향지원 시켜서라도 서울대에 한명이라도 더 보내려 애썼다. 소질과 적성을 무시하고 서울대 간판만을 노리던 그 때 그 풍토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대입 선호 기준이 왜 ‘서울대 0순위’에서 ‘의대 0순위’로 바뀌게 됐을까. 부모 세대가 50대만 돼도 대기업에서 쫓겨나는 걸 목격한 젊은 세대들이 평생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의대 진학에 인생을 걸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대 지상주의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최고 수재들이 의대로만 몰려가는 세태는 보다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인재들이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안에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서울대 어느 과에 가서라도 최고의 재능을 발휘하면 한 해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의사 중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더 밝고 자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가 더 분발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