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호 2023년 1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천일의 코로나, 이젠 헤어지자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관악춘추
천일의 코로나, 이젠 헤어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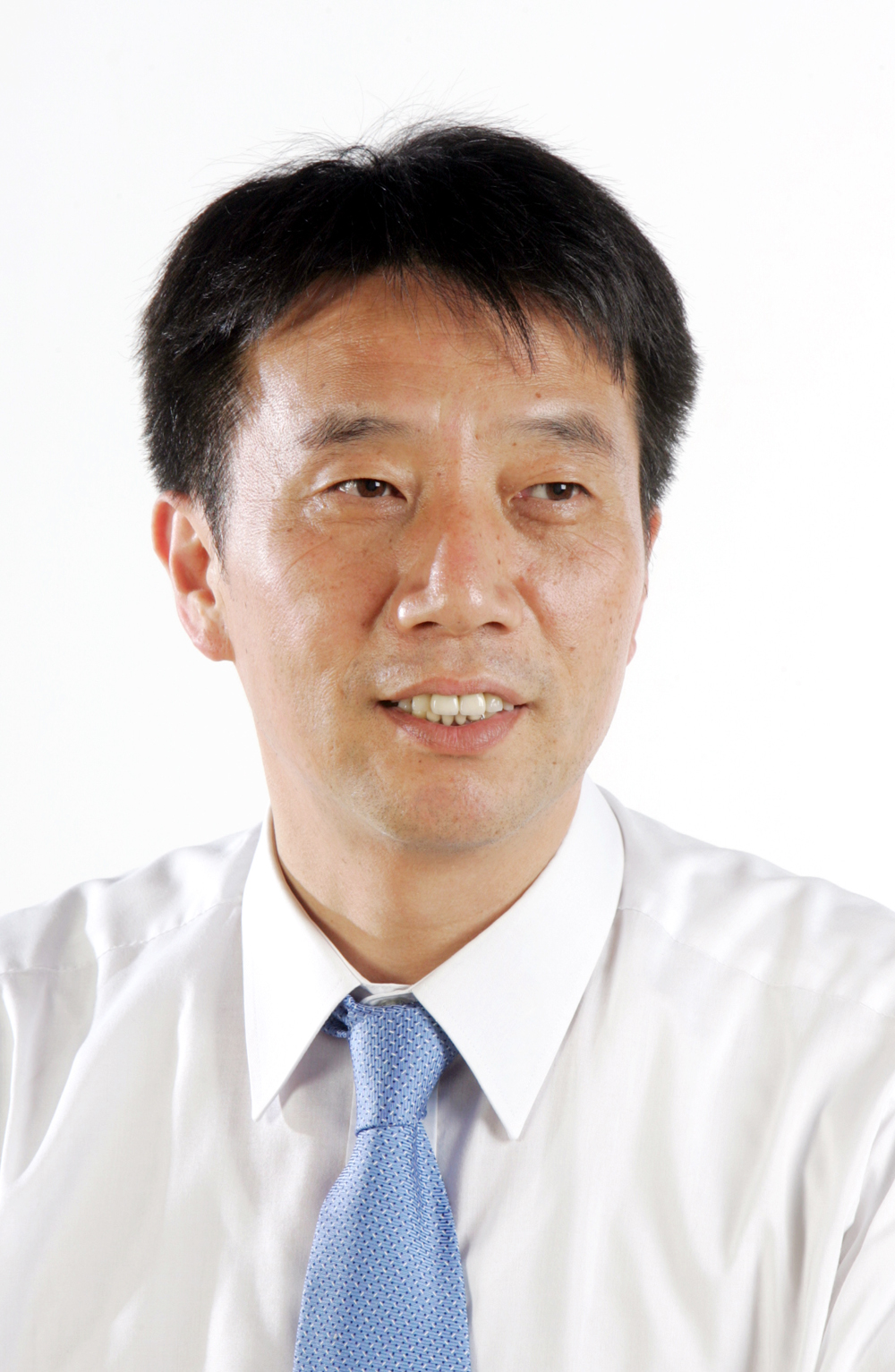
김창균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2020년 1월초, 그러니까 꼭 3년 전이었다. 미 NBC TV 저녁 뉴스에서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제 3국의 질병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길고 지루한 코로나와의 전쟁 발발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신종 플루니 메르스니 하는 전염병을 이미 겪어 봤던 터였다. 발원지인 중국과 몇몇 나라가 겪는 일이겠거니 싶었다. 한국은 중국 옆에 사는 죄로 함께 매를 맞아야 하는구나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기승을 부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러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4월 총선 전 또는, 총선 후 그 어간으로 짐작했다. 코로나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번질 줄은 정말 몰랐다.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뜻의 팬데믹, 말 그대로였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먼 훗날 지구촌 어디서 마주쳐도 “코로나 때 말이야…”라고 운을 떼면 말이 통할 것이다.
2020년말 인터넷에선 “올해는 나이 한 살 안 먹은 걸로 쳐달라”는 우스개 소리가 등장했다.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한 해를 보냈으니 없었던 세월로 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 21학번 대학생들은 미팅은커녕, 과 사무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황금 같은 신입생 시절을 흘려 보냈다.
코로나 사태 만 3년, 날짜를 꼽으면 천일이 훌쩍 넘는다. 5000만 국민이 그동안 쓰고 버린 마스크 개수가 500억개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며칠 전 마스크를 안 쓰고 출근길에 나섰다가 화들짝 놀랐다. 초등학교 때 준비물 빼먹고 등교했을 때 낭패감이라고 해야 할까.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집어들고 입을 가린 채 계산대를 향할 때는 공중질서를 해친 죄책감에 시달렸다.
식사 모임 인원제한이 4명, 6명을 오가다 2명만 마주 앉을 수 있는 극단적 상황도 겪었다. 식당 영업 시간 마감도 밤 10시에서 9시, 심지어 오후 6시까지 당겨지기도 했다.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를 오가다가 2.5단계 절충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강도를 조절해 가며 민방위 훈련을 받는 기분이었다.
영화 ‘천일의 앤’에서 주인공은 “천일동안 사랑이 엇갈리면서 둘이 서로 사랑한 날은 딱 하루였다”고 회고한다. 코로나와 천일동안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코로나를 사랑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광고 문구를 새해 소망으로 빌고 싶다. 코로나, 이제는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