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호 2021년 8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스포츠 한·일전, 그냥 즐길 수 없나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칼럼
관악춘추
스포츠 한·일전, 그냥 즐길 수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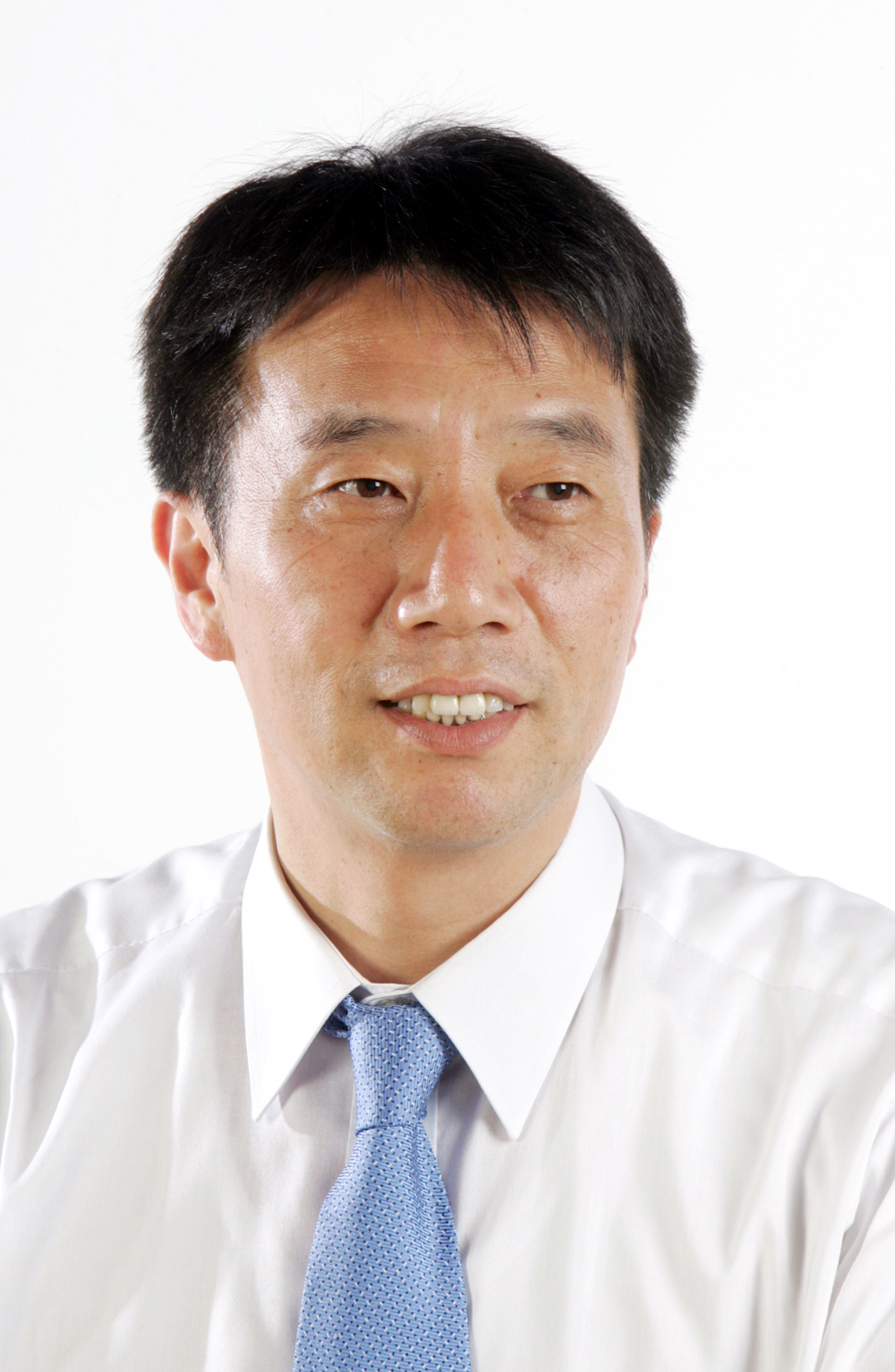
김창균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배구팀이 일본에 승리한 순간 지상파 3사 합계 시청률이 25%를 넘었다. 메달 결정전도 아닌 예선이었는데 TV가 있는 가구 넷 중 하나가 지켜봤다. 여자 양궁 안 산 선수가 개인전 결승에서 3관왕이 된 순간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다.
물론 극적 요소들이 있었다. 세계 랭킹 14위가 5위를 꺾는 이변이었고, 세트 스코어 2 대 2로 맞선 마지막 세트에서 12 대 14 매치 포인트에 몰렸던 게임을 뒤집었다. 팀의 주축 쌍둥이 자매가 ‘학폭’으로 빠진 공백을 팀워크로 메운 점도 대견스럽다. 그러나 국민이 TV앞에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한·일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승부 포인트를 뽑아 냈던 선수는 “한·일전은 가위 바위 보도 지면 안 된다. 배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일본 소셜 미디어에선 우리팀 주장 김연경 선수가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한다. 혼자서 30득점을 올린 경이적인 공격력뿐 아니라, 몸을 아끼지 않는 혼신의 수비,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고 질타하는 리더십까지 겸비한 김 선수에게 매료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일본인이니까 물론 일본을 응원했다. 그러나 김연경 선수가 코트에서 구르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저런 선수가 있는 팀이라면 져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일본 스타 플레이어의 맹활약으로 졌을 때, 우리 국민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954년 FIFA 월드컵 아시아 본선 티켓을 놓고 한·일이 맞붙게 됐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축구협회장은 “일본에 지면 전원 현해탄에 빠져 죽겠다”는 출사표를 남기고 원정길에 올랐다. 1차전 5 대 1 승리, 2차전 2 대 2 무승부로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들은 한·일전을 앞두고 전쟁에 나서는 심정이라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에 대한 애증의 강도가 같을 수는 없다. 한·일전만은 질 수 없다는 정신력으로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모습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패배했을 때 나라에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안쓰럽고 씁쓸하다. 왜 일제 강점기가 지난 지 수십년 후에 태어난 젊은 선수들 어깨 위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하나. 한·일전 중계진의 감정적 오버가 민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한·일전을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스포츠로 대해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