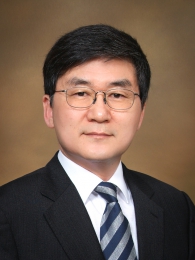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16호 2021년 3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개혁과잉 시대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본지 논설위원
개혁과잉 시대

정연욱
공법85-89
동아일보 논설위원·본지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전 정권 적폐를 청산한다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집권세력이 윤석열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검찰개혁 깃발을 들었다. 여당 주도로 판사 탄핵을 할 때는 사법개혁이라고 했다. 당정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면 “개혁 대상이냐”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 사회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 전선마다 개혁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개혁의 의미를 폄하할 이유는 없다. 개혁이란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각별한 탓인지 개혁 과제가 등장하는 순간 개혁 주체와 청산 대상이라는 선명한 선악(善惡)구도가 만들어진다. 어떤 의제나 정책이든 개혁으로 포장되는 순간 이 프레임에 빠져드는 마법이다. 정치권에서 개혁이란 구호가 일상화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의명분은 더 엄정해야 한다. 개혁 의제가 자칫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편 가르기 구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이견을 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는 퇴색되고, 완력에 기댄 진영 대결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없애는 대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만드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검찰의 폭주를 끝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권이 3년 전 검찰에 대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대목은 불씨가 됐다. 불과 3년 사이에 검찰의 위상이 급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야권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정치적 시비거리가 된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정책을 개혁과제로 포장할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은 그 파장이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치밀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 내내 20차례 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이 세대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집값 스트레스를 안겼다. 앞으로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 실험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명분으로 포장된 ‘중수청’ 드라이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개혁 시즌1의 성과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 과정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라는 논리다. 정책 추진의 명분과 함께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런 근간이 흔들리면 개혁 구호의 빛이 바래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은 시행 전에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정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숙성을 위해선 소통과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이견을 조정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절차이며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것이다. 개혁 과제라고 해서 드잡이하듯이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민주주의 가치는 압도적 의석수나 힘이 아닌, 국민적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개혁구호의 남발, 개혁과잉의 거품을 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