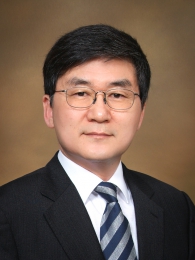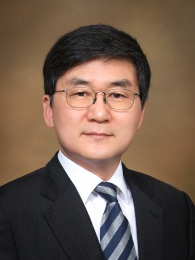[553호 2024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가족이라는 두 글자
고정애 중앙일보 Chief 에디터
가족이라는 두 글자

고정애
제약87-91
중앙일보 Chief 에디터·본지 논설위원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 동안 스친 인상적인 인물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다. ‘교황’이란 직위가 주는 신성 때문이 아니냐고 묻고 싶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2014년 여름 런던특파원이었던 덕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수행기자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방문국 언론에도 제한적으로 기자단 문호를 개방했는데, 당시 10명 규모였다. 교황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교황의 일부 일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수행기자라곤 하나 접근성이 썩 좋았던 건 아니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일 때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느꼈다. 속으로 ‘바티칸 2000년의 닳고 닳은 관료제’라고 투덜대곤 했다.
한순간은 달랐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이 수행기자단 한 명 한 명과 인사하는 시간이었다. 악수와 함께 짧게 인사말을 건네곤 했다. 내 차례가 됐다. 교황과 눈을 맞춘 순간 우주의 시간이 정지했다. 교황의 시선이 온전히 나에게 머물렀다. 우주에 둘뿐인 듯했다. 실제론 20초도 안 지났을 것이다. 영원 같았다.
그 뒤로 오랫동안 그 순간을 곱씹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대개 명사들은 악수하는 순간, 다음 악수할 사람으로 시선을 넘기곤 한다. 교황은 그러지 않았다. 단지 그 때문이었을까. 교황과의 거리로 치면 수백 배 멀었음직한 동료 기자가 한 행사를 취재하곤 이런 글을 남겼다. “그와 시선이 닿을 때 단지 시선이 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은 것 같았다.” 교황에게 뭔가 있었다. 알 순 없었다. 그저 ‘종교인이 됐기에 망정이지 정치인이 됐다면 후안 페론 능가했을 것’이란 불경스러운 생각도 들었을 뿐이다. 동시에 교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무감을 느끼곤 했다.
유사한 종교적 의무감에 들떴던 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들어섰을 때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형형색색의 빛을 보며 진정 신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이겠다 싶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나도 함께하고 싶었다. 역시 몇달 간 교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망설이곤 했다.
정작 교회 문을 열게 한 건 가까운 가족의 와병이었다(병원 바로 옆에 마당 널찍한 교회가 있었다). 이후엔 교회만으론 성에 안 차 부처도 찾고 조물주도 찾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안토니 가우디도 못한 일이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곧 가정의 달이란 5월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자고 너스레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