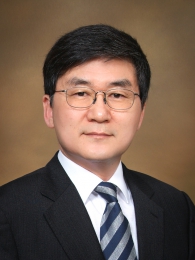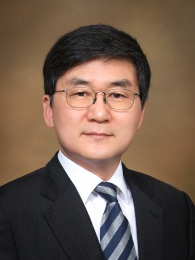[561호 2024년 1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그 해, 우리는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문장
그 해, 우리는

이주영 (지리97-01)
경향신문 경제부문장
본지 논설위원
대통령 오판이 무정부 상태 초래
2016년처럼 지금도 촛불에 위안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이 계절, 느닷없이 마주하게 된 무정부 상태와 혼돈 속을 우리는 걷고 있다. 쏟아지는 뉴스 속보, 화염처럼 솟구치는 분노,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대의 말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비웃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노여움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치미는 분노와, 직업 언론인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자는 내적 갈등 속에 그 어떤 때보다 심란한 계절을 보내고 있다. 아마도 그날 밤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이용당한 군인들도, 그 광경을 목도한 시민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딱 8년 전 겨울도 그랬다. 다섯 살짜리 꼬마와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친 그날, 거대한 군중의 물결 속에서 약간은 흥분되면서도, 어두운 뒷골목에 나부끼는 낙엽을 보는 순간 문득 다가온 그 쓸쓸한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보다 더한 일을 대한민국에서 목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모두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남아있다. 도대체 왜 그는 이런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을까. 의회 권력을 남용해온 야당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다고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경고를 날리겠다는 발상을 실행에 옮기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열받음을 참지 못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은 모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오판이 불러온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후과를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무려 2년 반이나 국정 최고책임자 자리에 극도의 비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앉아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과 무력감마저 든다. 그가 부르짖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위장된 법치주의, 가짜 민주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번 사태는 많은 사람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됐다. 전두환의 ‘서울의 봄’이 있기 전 태어나긴 했지만, 너무 어려 기억조차 없기에, 사실 국회에 무장군인이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도 공포심보다는 ‘이게 대체 뭐지?’라는 황당함이 더 컸던 것 같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의 계엄을 생생하게 겪어본 세대는 그날 밤 엄습한 공포와 두려움에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부모님은 생수나 비상식량을 사둬야 하는 거 아니냐 했고, 80년대 학번인 한 지인은 탄핵 절차와 내란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도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걸 꺼리게 된다고 한다. 계엄령에 동원된 여러 관계자들 역시 자괴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K’자 들어가는 ‘국뽕’ 프레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숱한 역사적 고비와 위기를 잘 극복해온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 믿고 싶다. 8년 전 그날처럼 칼바람 맞으며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시민들 모습에서 위로를 받는다. 국회 앞에서 아이돌 팬들의 응원봉을 흔들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콘서트처럼 집회를 즐기는 모습은 사그라들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조금이나마 지탱해주는 듯하다. 정상국가 대한민국으로 돌려놓으려면 모두가 적잖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