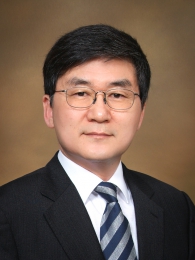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60호 2024년 11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승률 0.5% 야구팀의 1승을 향한 도전
이은아 (지리92-96)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승률 0.5% 야구팀의 1승을 향한 도전

이은아 (지리92-96)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서울대 야구부 20년 만의 2승
390번의 도전에 더 큰 박수를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정규리그 720경기 중 30.7%인 221경기가 매진됐고, 전 구단 평균 관중은 1만명을 넘어섰다. 모두 역대 최초다. 포스트시즌 16경기에도 관중 35만여 명이 몰렸다.
31년 만에 달빛시리즈로 치러진 코리안 시리즈의 열기는 더 뜨거웠다.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표가 매진돼 임시버스가 투입됐다. 야구경기를 중계하는 영화관 티켓이 매진되고, 대구와 광주 곳곳에서는 월드컵 경기 때처럼 거리 응원전도 펼쳐졌다. 선수와 관중의 환호와 눈물에 “야구가 뭐라고…”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수만 관중의 응원이 없어도 간절함만은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야구팀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서울대 야구부다. 무심히 TV 리모컨을 누르다 ‘서울대 야구부-우리 한 번만 이겨보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났다.
1977년 창단한 서울대 야구부는 10월 초 방송 당시 2승 2무 386패를 기록 중인 대학리그 최약체 팀이다. ‘패배의 아이콘’으로 불리다 보니, 단 두 번뿐인 승리는 미디어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역사적인 첫 번째 승리는 창단 27년 만인 2004년 찾아왔다. 그해 9월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에서 송원대를 2대 0으로 꺾은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다시 만끽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4월 서울대는 한국대학야구연맹(KUBF) U-리그에서 경민대를 9 대 2로 물리치고 공식경기 통산 2승을 기록했다.
24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원의 전공은 체육교육과부터 건축학과·수학과·경영학과·경제학과 등으로 다양하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실패한 후 서울대에 진학한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야구를 시작한 학생들이다. 거액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동만 하는 다른 학교 야구부와는 출발부터 다르다. 그래도 열정만은 뒤지지 않는다. 주 3회 정기 훈련과 8박 9일 동계 전지훈련, 2주간의 하계 합숙훈련을 진행하며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른다. 수비훈련을 위해 구르고, 달린다. 선수들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대팀 전력분석까지 한다. “야구를 위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말할 정도로 야구에 진심이다.
다큐멘터리는 도쿄대와의 교류전 준비 과정과 경기 영상, 경기 후 일상으로 돌아간 선수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대인 서울대와 도쿄대의 야구 교류전은 2005년 시작됐다. 2년마다 경기가 열리는데 이번 경기 전까지 서울대는 9전 9패를 기록 중이었다. 1승을 향한 간절함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초반부터 실책과 실점이 이어졌다. 결국 경기는 9 대 2 도쿄대의 승리로 끝났고 통산 패배는 10패로 늘어났다. 지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졌다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은 패배를 통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야구는 인생에 비유되곤 한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집(Home)에서 출발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우리 일상처럼 말이다. 1루, 2루, 3루를 거쳐 홈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도 인생과 비슷하다. 홈런과 안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트나 플라이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다양한 작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인생과 꼭 닮았다.
서울대 야구부의 세 번째 승리까지는 또다시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누군가는 ‘그깟 공놀이’라고 폄하하는 야구를 그만둘 수 없는 원동력일 것이다. 2번의 승리보다 390번의 도전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