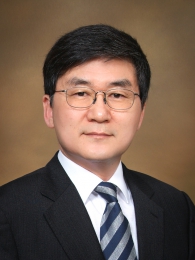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55호 2024년 6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즐겁고 멋진 것들
이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즐겁고 멋진 것들

이지영 (약학89-93)
중앙일보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멋진 골프장서 깃대·벙커에 집중
과업에 몰입하는 우리 삶과 닮아
골프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됐다. 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 등이 돌아가며 아파 연습장과 정형외과를 함께 다니는 신세지만, 홀린 듯 빠져들었다.
골프채 그립을 잡은 첫날부터 재미있었다. 양손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며 공을 맞추는 이른바 ‘똑딱이’ 때부터다. 공 맞추는 데 온 신경을 쏟다보니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고민도 걱정도 사라지는, 일종의 명상 시간 같았다. 심리치료사들이 말하는 뜨개질의 힐링 효과와도 비슷했다. 반복적인 동작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했는데, 골프 연습이 꼭 그랬다. 산만한 멀티태스킹에 시달려온 뇌에 휴식이 됐다. 연습을 마치고 연습장 문을 나설 때면 늘 상쾌한 청량감을 느꼈다.
처음 친구가 골프를 권했을 때 난 사양을 했었다. 쉰 넘어 새로운 스포츠라니, 이미 구력이 쌓인 친구들과 어울리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잘 가꿔놓은 정원 구경 간다고 생각해보라”는 친구의 말이 마음을 끌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골프장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 나도 그 그림 같은 풍경에 한번 들어가보자 했다.
하지만 막상 필드에 나가보니 풍경을 만끽할 여유는 없었다. 새로운 홀에 도착하면 해저드와 벙커 등 장애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곤 목표 지점인 그린과 깃대를 바라봐야 했다. 조경에 감탄하는 시간은 다음 홀로 이동할 때 정도, 아주 잠깐이었다.
인생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 달성과 위험 요소 피하기. 이 두 가지에 매여 사느라 그때그때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지나고서야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깨달으며 아쉬워하곤 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많았는데, 골프를 치며 묘하게 위로를 받았다. 골프장에서 풍경 감상에 빠져드는 골퍼가 없듯 우리네 삶도 주어진 과업에 몰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자각이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순간”이라는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찰나의 순간이나마 스쳐지나갔던 행복이 고맙게 느껴졌다.
실력과 노력만으로 경기를 장악할 수 없다는 점도 인생을 닮았다.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운의 요소가 스코어를 좌우하는 일이 많았다. 오늘 잘 됐다고 내일 잘 되리란 보장을 못하는 것도 물론이다.
골프 재미를 알게 되면서 자꾸 골프 얘기를 하게됐다. 자제하느라 애쓰는 중인데, 이젠 남의 말까지 다 골프 얘기처럼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전 ‘무한도전’ 김태호 PD의 인터뷰 기사 제목이 ‘욕심 버리고 던져보는 게 중요’길래 골프 스윙 얘기인가 했다. “팔에 힘을 빼고 골프채를 던지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여파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예능 프로그램 만들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명중시키겠다는 욕심과 기대는 유연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데, 골프에 적용시켜도 이질감 없을 말이었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로 통하게 돼 있다더니, 공자의 ‘일이관지(一以貫之)’가 실감났다.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이나가키 에미코의 책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를 읽으면서도 골프가 떠올랐다. 어렸을 때 쳤던 피아노를 50대가 돼 다시 배우기 시작한 저자는 과도한 연습으로 손가락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피아노 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뭔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 무작정 노력하는 그 자체로 즐거운 세계가 있더라면서 “그래서 피아노가 멋지다”고 했다. 골프 말고도 또…. 세상이 갑자기 즐겁고 멋진 것들로 가득차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