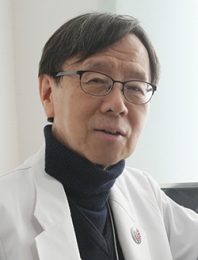[514호 2021년 1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동숭로에서: 마음의 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상규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전 LG화학 부사장
마음의 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상규
영문65-69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전 LG화학 부사장
40대 중반 때였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읽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글씨가 두 겹으로 보였다. 뭐가 끼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떠보았다. 선명하게 보이더니 그것도 잠시, 금방 다시 겹쳐 보였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인근 안과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망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간단하니 걱정 말라는 의사의 말에 무심코 시술을 받았지만 안구에 주사바늘을 찌르는 순간은 아찔했다. 처방해준 약을 얼마간 복용하고 치료를 받자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갑자기 멀쩡한 눈에 이상이 생긴 걸까? 지사 근무로 적도의 나라에서 3년 산 것뿐인데, 적외선이 눈에 영향을 미쳤으면 얼마나 미쳤을라고. 눈을 혹사시킨 적도 없고, 부모형제들 중에 안경 낀 사람도 없으니 가족력도 아닐 텐데.
그 후 몇 년은 그럭저럭 잘 버텼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시야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나빠져 갔다. 그것이 결국 세월 탓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안경점에서 돋보기를 써보니 글씨가 크게 보일 뿐아니라 어찌나 선명한지 깜짝 놀랐다. 결국 50대 중반 들어 자존심을 꺾고 돋보기안경을 쓰게 되었다. 안경을 끼니 사방이 선명하게 보이고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왜 그동안 안경을 안 꼈는지 후회가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얼룩진 렌즈를 자주 닦는 등 전에 없던 불편이 생겼다. 닦기수건을 챙기고, 안경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글을 읽을 때 꺼내 쓰고 다시 챙겨 넣고 하는 것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비 올 때 렌즈가 흐리다고 짜증스러워하던 친구들의 불평이 이해되었다. 게다가 내 특기인 건망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잃어버린 안경을 되찾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결국 싼 안경을 여러 개 사서 안방, 화장실, 사무실 등 곳곳에 비치해 놓았다. 그런데 여분이 있다고 마음을 놓아서인지 이후로는 너무 자주 잃어버려 감당 못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작심하고 비싼 고급 안경을 하나 사서 정신 바짝 차리고 끼고 다녔다. 비상용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몇 년을 버텼다.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린 안경을 되찾는 내 노력은 처절했다. 전날 식당에 놓고 온 것 뿐 아니라, 해외출장 중 호텔에 두고 온 것도 수소문해서 비행기편에 되찾아오기까지 했다. 목줄을 사서 걸치고 다니기도 했지만 꼰대같다는 눈총이 부담스러워 벗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끼던 안경을 기어코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디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허망했다. 집 나간 애견을 기다리는 심정이 이런 걸까.
안경 찾기를 포기하던 날, 결국 동네 안경점 직원의 달콤한 권유에 못이겨 비싼 다초점안경을 구입했다. 꼈다 뺐다 하지 않고 계속 끼고 있으니 쉬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해서였다. 처음 어찔어찔 불편하던 조정기를 극복하고 몇 년째 쓰고 있으니 습관으로 안정된 셈이다. 실내에서도 안경을 놓는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집을 나올 때는 현관 앞에서 잊은 물건이 없나 끊임없이 점검을 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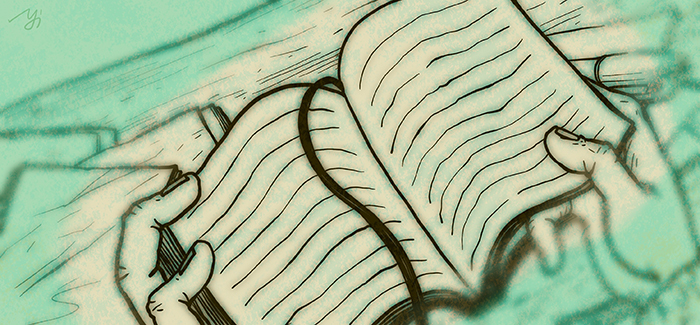
일러스트=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책을 읽거나 운동하는데 아직은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자주 눈의 피로를 느끼고 컴퓨터 화면도 2∼3시간 이상은 계속 볼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에 내 시력은 안경을 끼고도 0.6∼0.7정도로 나빠졌다.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운전면허증 재검을 통과하지 못할까 은근히 걱정이 된다. 땡볕에서는 시력보호을 위해 선글라스를 끼기도 해보았지만 불편해서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런데 근시안의 친구들은 나이 들면서 다시 눈이 좋아진다고 하니 희한한 노릇이다. 시력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더러 보여 애처럽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느낄 때도 있다.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시각 장애인을 본다. 계속 쳐다보기가 민망해서 이내 시선을 돌린다.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먼 산 보듯 뚜벅뚜벅 길을 찾아가는 검은 안경의 시각장애인을 보면 어쩐지 경외감이 든다. 번잡한 시내 중심가에서는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불안하다. 앰불런스나 소방차에 하듯 넌지시 길을 양보해준다. 길바닥에 새겨진 노랑색, 흰색 도형들, 직선길을 가리키는 막대형, 코너나 입구를 알리는 원형이 있는가 하면, 비탈을 알리는 점박이도 찍혀 있다. 무늬가 지워질까 해서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다. 어둠에도 색깔이나 소리가 있을까? 무한의 암흑 세계를 빛, 감각과 소리로 헤쳐나가는 저들의 초감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점자판을 발견할 때, 건널목에서 음향기기 소리가 들릴 때면 은연중 마음이 푸근해진다.
눈감고 한 발로 땅을 딛고 반대편 발을 손에 잡고 몸의 균형을 잡아본다. 10초를 버티기 어렵다. 고속도로 운전 중 잠시 네비로 눈을 주는 순간 옆 차선을 침범해서 차의 핸들을 급히 제자리로 돌린다. 눈, 팔다리, 근육, 신경이 자동시스템으로 안전작동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본다. 사랑하는 아내와 식구, 친구들을 볼 수 없고, 자연과 주위 환경도 볼 수 없겠지. 외출도, 집안에서의 움직임도 누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터인데…. 책을 읽고 TV를 보고 영화 감상하는 것이 즐거운 일상인 내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면 과연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온다.
나는 언제까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글은 언제까지 쓸 수 있으려나? 그러려면 눈을 아껴야 할 텐데. 낮에만 책을 읽는다는 한 친구의 결단이 내겐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 보는 것은 삼가야겠다.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어떤 감각이 나빠지면 다른 부분이 발달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게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니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아야겠다.
나이 들어 시각과 청각이 나빠지는 것이 불필요한 것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과정에서 비록 육체의 눈은 약해져도 사물을 보는 눈, 삶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라도 더 넓고 깊어지기를, 더 선명하고 그윽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동문은 모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LG화학 부사장을 지냈다. 직장생활 40년을 마감할 무렵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 꾸준히 수필을 쓰기 시작했다. 5년간 쓴 글을 엮어 수필집 '끝내 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냈고, 수필전문지인 계간 '에세이문학'을 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맡아 각종 수필대회의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