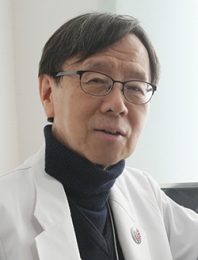[485호 2018년 8월] 기고 에세이
동숭로에서: ‘서울대’라는 고유명사
주수자 소설가
‘서울대’라는 고유명사
주수자
조소72-76
소설가
72학번인 나는 운명의 가이드로 인해 졸업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 반세기의 반을 보내다 회귀하는 연어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년이 되어 돌아와 보니, 서울대 동창들은 각각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어 ‘과연 서울대구나’ 하는 자긍심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타국을 떠도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모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깜빡했다는 이면의 말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세월이 마모해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갓 졸업한 젊은 20대가 겪은 이 사건은 가히 쇼크였다.
70년대 유학생활을 하려면 경제사정상 아르바이트가 필수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저곳, 여행사에서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LA School District의 ESL 보조교사 구직 광고를 보고 거기에다 이력서를 내밀었다. 그 고등학교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했으며 온통 멕시코 아이들뿐이었다. 가물에 콩 나듯 한국에서 이민 온 아이들도 한두 명 끼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캘리포니아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고 언젠간 우리가 다시 차지할 것이고 그땐 어차피 스페인어를 쓸 것이니 영어는 배우기 싫다는 배짱과 게으름으로 가득한 아이들로 이루어진 학교였다. 그래선지 목이 터져라 원, 투, 쓰리, 가르쳐도 끝까지 우노, 두어, 트루아, 고집하는 이상스럽게 낙천적인 곳이었다. 아무튼 나는 그곳에다 당당하게 이력서를 내고 약간은 늠름하게 면접을 치르러 갔다.
면접담당 교사가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서어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거 어디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내 어깨에서 숄더백이 주르륵 저 혼자 미끄러졌다. 면접교사는 내가 긴장했다고 착각했는지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내주며 또다시 물었다. “서어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여기가 무슨 대학이죠?” 그때 이미 나는 정신을 차린 후라, 아, 네. 사우스코리아 북위 3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말해주었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그때를 떠올릴 때면 후다닥,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다. 그래도 피할 도리는 없겠지만. 사실 면접교사의 물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로 놀랄 만한 것은 내가 지녔던 태도였다. 솔직히 나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이, 세상이, 서울대학교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때 나는 22살이었고, 순진했다지만, 나의 세계는 그만큼 비좁았고 엄청 속물적 근성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때의 놀람은 깨달음만큼 컸다. 설마,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랬다, 내 경우는.
변명과 위안을 끌어들이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으리라. 왜? 나의 어머니께서도 나처럼 생각했으므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주입해주셨으므로, 동네 이웃들도 그렇게 여겨주었으므로. 게다가 동기생들도 나처럼 딱지치기해서 친구를 이겨먹은 어린 아동처럼 서울대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으므로. 가슴에 뱃지까지 달고 다니며~ 으악!
이제 나는 겨울과 같은 노년에 이르러 다시금 생각에 잠겨본다. 서울대학이라는 고유명사에 대해. 과연 이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고유명사를 지닌 사람들끼리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의 어깨를 치며 흐뭇해하는 영역인지 또는 그 너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광대무변 우주 가운데, 회오리치는 우리은하, 그 은하수 외곽을 돌고 있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푸른 유리알처럼 둥근 땅의 극동에 위치한, 북위 37도 쯤에 세워진 이 학교는 과연 얼마나 그 주변에 스스로의 모습을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은 미래에 어떤 고유명사로 남을 것인지를.
*주 동문은 모교 미대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미국 콜케이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24년간 해외생활을 하다가 1998년에 영구 귀국했다. 2001년 ‘한국소설’을 통해 등단했으며, 소설집 '버펄로 폭설', 시집 '나비의 등에 업혀', 희곡 '복제인간1001' 등이 있다. 짧은 분량과 담백한 문체가 매력적인 스마트 소설집 '빗소리 몽환도'로 박인성 문학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