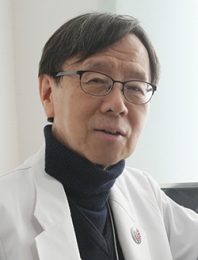[490호 2019년 1월] 기고 에세이
동숭로에서: 호반정곡(湖畔情曲)
오세윤 수필가·소아과전문의
호반정곡(湖畔情曲)
오세윤
의학59-65
수필가·소아과전문의
세밑 소식 뒤 벗에게선 기별이 없다. 통화도 되지 않는다. 벌써 보름째, 남도를 한차례 둘러보았으면 하더니 이 매운 설한(雪寒)에 나그넷길에라도 오른 걸까. 손전화도 쓰지 않는 사람이라 소식 취할 방도가 막연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자위하며 일전 받은 서신을 꺼내 다시 펼친다.
물가의 수양버들 푸른 빛 돋거든 내 그대에게 전하는 안부인 줄 알라며 왕만의 시 한 귀를 얹었다. ‘해일생잔야 강춘입구년(海日生殘夜 江春入舊年-바다의 해는 밤이 채 새기도 전에 떠오르고, 강남의 봄은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찾아든다)’
벗과 나는 육십년 지기다. 정년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뒤 낙향해 호반에 거처를 마련하고 바람 벗하여 산다. 나는 철마다 그에게 내려가 사나흘씩 묵고 온다. 나는 그를 우인이라 부른다. 벗이어서 우인(友人)이요 무겁고 느긋하여 우인(優人)이다.
벗이 강호에 둔거한 지 어느 사이 십년, 처음 방문했던 가을 하루가 엊그제인데 그사이 훌쩍 세월이 흘러 망팔(望八)의 나이가 됐다. 늦가을의 달빛 밝던 그 밤, 낚시도 즐기지 않으면서 무엇이 좋아 호숫가에 터를 잡았느냐고, 내 가까이 거처를 마련하지 않은 서운함을 에둘러 투정하는 내게 벗이 웃으며 답했었다. “물속에 달이 뜬다네, 여긴. 산도 들지.”
점심을 하자며 어부의 집을 찾아 호수를 건너던 그 가을 한 낮이 어제인 듯 생생하다. 물속에 비껴 담긴 하늘 위를 떠가는 뱃전에 앉아 꿈인지 생시인지를 가늠 못 해 아득하던 정회가, 달을 건지려다 물에 빠졌다는 이백의 우화가 거짓이 아니듯 느껴지던 그 한낮의 정한(靜閑)이 바람으로 호수 위에 분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청풍명월지(淸風明月池), 언덕 아래 너른 호수는 사철 내내 한정하다. 가을이면 울긋불긋 물속 가득 단풍이 곱고, 초여름 아침이면 자욱이 호수 위에 물안개가 핀다. 이슬을 밟으며 물가 따라 걷노라면 안개 속 노 젓는 소리, 그물 걷는 어부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곁인 듯 또렷하다. 산자락을 타고 내린 바람이 호반을 건너 둔치의 버들가지를 휘젓는다. 뺨을 스치는 바람에 가슴이 호수 가득 열린다. 산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물도 푸른 곳, 고요 속에 홀연 선계에 든다.
호수에 달빛 흐벅진 밤이면 윤슬이 황홀하고, 건너 검은 산이 그린 듯 잠겨 또 다른 몽환경이 된다. 그런 밤이면 공연스레 안타까워 늦도록 서성이다 훌쩍 자정을 넘긴다.
산자락 안침한 곳, 호수를 내려 보는 단층집이 선가인 듯 평화롭다. 간고한 거실에 부인은 오직 흰 철쭉 한 분만을 키운다. 주위가 온통 꽃이요 초목인데 구태여 따로 가두어 키울 게 무어냐고, 본시 산야가 저들의 터전이니 싹틔운 자리에서 이슬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른 꽃은 거두지 않는다.
아침 식탁도 조촐하다. 쑥갓과 부루, 방울토마토에 메추리알 서넛을 얹은 샐러드 한 접시, 토스트 한 조각과 주스 한잔으로 차림이 간결하다. 남새는 모두 안주인의 텃밭, 벗이 소꿉 전이라 부르는 두 평 남짓한 장독대 옆 따비밭 소출이다. 식후에 차 한 잔을 들고 우리는 정원으로 나간다.
호수를 비롯해 아침 차림까지가 내 오감에는 모두 시(詩)로 담긴다. 벗이 시요 벗의 집이 시다. 안개에 스미는 달빛이 시요 노 젖는 소리가 시다. 산도 물도 바람도 모두가 시다. 사람이 시요 사는 것이 시다. 그 모두를 고요가 아우른다. 호수에 살면서 어찌 시인이 아니 될까.
벗과 헤어져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나는 꿈을 꾸듯 몽몽하게 지낸다. 천계에라도 다녀온 듯, 도화원이라도 떠나온 듯 망연하게 지낸다. 몇 밤을 지내고서야 시나브로 현실로 돌아온다. 창밖에 눈이 날린다. 흩뿌리는 눈발 사이 애처롭게 흔들리는 버들가지에 연록이 어릿하다. 봄이 언뜻 문 앞에 온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