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호 2022년 1월] 기고 에세이
추억의 창: 바나나 들고와 반을 나눠주신 영어 선생님
심웅석 시인
바나나 들고와 반을 나눠주신 영어 선생님

심웅석
의학59-65
시인
의대 동산은 사라지고 없지만
관악 버들골에서 향수 느낀다
해마다 시월이면 의대 구내 함춘회관에서 미술-문예전이 열린다. 회관 건립 기념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 삼년 전부터 시(詩) 2편씩 참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문리대를 졸업한 고교 선배 B교수와 점심을 함께한 후 동행하여 둘러보았다. 대학로에 나오니 플라타너스 넓은 잎사귀들이 정처 없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그 유명하던 학림다방이 어찌 이리 초라한지, 동숭동 옛날 문리대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60여 년 전의 추억에 젖어든다.
즐겨 읽던 ‘학원’ 잡지 표지에 나오는 서울 명문고 학생들의 해맑은 모습은 꿈 많은 시골 고3생을 부러움과 경쟁심에 불타게 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대 의예과, 서울내기들도 쉽지만은 않다는 명문이라 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교과서, 참고서의 저자(교수)들이 줄줄이 나와서 인사-소개되는 걸 보고 과연 여기가 ‘서울대학교’구나, 실감이 났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교과서, 참고서의 저자(교수)들이 줄줄이 나와서 인사-소개되는 걸 보고 과연 여기가 ‘서울대학교’구나, 실감이 났다.
예과 1학년을 문리대 본관 뒤쪽의 단층 건물에서 보냈다. 하루는 영어담당 K선생님이 강의 오면서 바나나를 한 개 들고 오셨다. 그것을 쳐다보는 내게 껍질을 벗겨 반을 나누어 주신다. 얼마나 맛있게 쳐다봤으면, -그렇게 배고프던 시절이었나?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 시절에는 가정교사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들이 많았다. 매일 저녁 맡은 학생을 봐주고 늦게야 내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뒤처진 출발선에서 달리는 기분이었다. 본과 1학년 때는 해부학 실습으로 시체를 만지고 나서 급우들과 교내 동산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다. 의대 구내에 이런 여백의 동산들도 지금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삭막한 분위기가 되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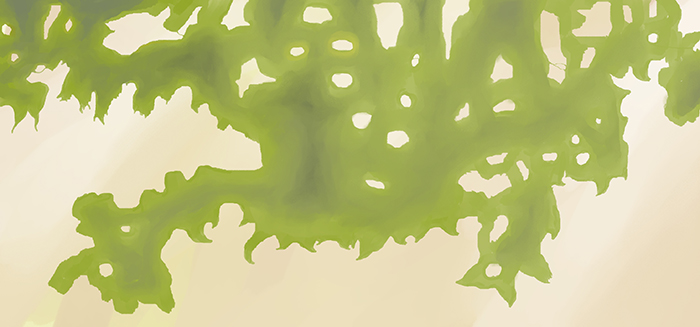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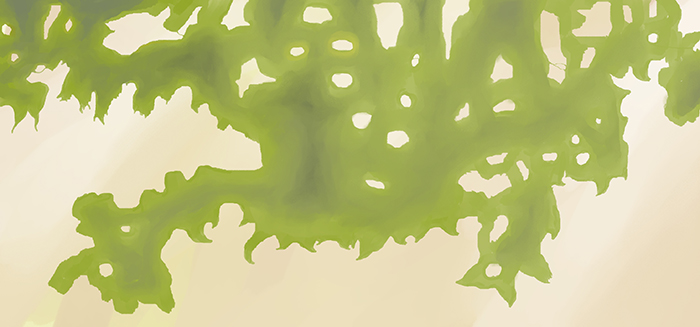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본과 3학년 때 E대 영문과, 불문과 학생들과 짝을 맞추어 창경궁으로 단체 데이트를 간 적이 있었다. 경내에 들어서니 옆에 있어야 할 짝은 보이지 않고 급우들끼리 모여 달밤을 다독이고 있지 않은가. 보조를 맞춰 걸으며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여성 앞에 수줍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혼자 뚜벅 걸었으니 혼자일 수밖에. 그때는 우리 캠퍼스 내에 여학생이 드물었다. 임상을 배우기 시작한 3학년 여름방학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무의도로 진료 봉사를 떠났다. 남해도로 지정 받은 우리 팀은 거기 초등학교 교실에 진료실을 차렸고, 처음 맞은 환자는 주름진 얼굴의 허리 굽은 할머니였다. “어디가 아프세요?” -“맞춰 봐유”. 입을 꼭 다문다. 그 때묻지 않은 영혼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십대에 등산을 하면서 동행한 친구들은 신입생 환영회 때 맺은 그룹이다. 반 이상은 건너가서 미국 의사로 살고, 여기 남은 일곱 명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절친으로 지내는 사이 두 명은 벌써 떠났다. 이들 덕분에 인생이 외롭지 않았다. 전국의 산을 두루 섭렵했지만 관악산에 제일 자주 갔다. 내려오다 우리 관악캠퍼스의 시원한 환경을 둘러보면서, 만일 여기로 오지 않았더라면 동숭동 교정은 폭발하였으리 싶었다. 여기로 이전할 적에는 ‘데모 막기 쉬운 골짜기로 옮긴다’는 설(說)이 있었으나 지금 믿기지 않는다. 홈커밍데이 때 교내 잔디밭에서 사중창이 관악골에 울려 퍼지면 가슴이 뭉클하고- 지나간 날들이 그리워진다.
*심 동문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시인, 수필가다. 계간 ‘문파’에 시로 등단 후 시집 ‘시집을 내다’, ‘달과 눈동자’, 디카시집 ‘꽃 피는 날에’, 수필집 ‘길 위에 길’ 등을 냈다. 한국문인협회원, 시계문학 회원, 계간 ‘문파’ 운영이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