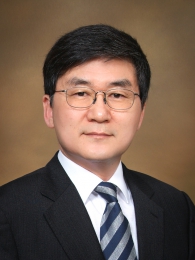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00호 2019년 11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오버 페이스 아닌가요?
임석규 한겨레 디지털미디어국장·본지 논설위원
오버 페이스 아닌가요?
임석규
언어84-91
한겨레 디지털미디어국장·본지 논설위원
오래달리기를 시작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펄럭거리며 매주 적어도 두세 차례씩은 꼬박꼬박 달리고 있다. 50대 중반이니 결코 이른 입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생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들 하지 않은가 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상투적 문구도 이럴 땐 제법 위로가 된다.
꾸준히 산을 다닌 터라 달리기가 대수겠냐고 내심 생각했다.
처음엔 아파트 주변부터 냅다 달렸다. 땀 뒤범벅에 벌게진 얼굴로 숨을 헉헉거리며 5km를 간신히 뛸 수 있었다. 몇번을 도전해봤지만 6km가 한계치인지 더는 달리지 못했다. 공기 좋은 해변도로를 뛰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리는 그런대로 견뎌주었는데 펄떡거리는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고수’에게 물어보니 페이스, 그러니까 달리는 속도를 좀 늦추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렇게 천천히 뛴다면 누군들 달리지 못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살짝 들었다. 내 몸부터 페이스를 조절하라는 뇌의 명령에 쉽게 복종하지 않으려 했다.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달리다 보면 어느새 빨라져 있었다. 오래달리기를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빨리 달리기에 급급하다가 금세 지치고 마는 어설픈 주자가 바로 내 모습이었다.
어쭙잖은 초보 러너가 안쓰러웠던지 달리기 경력으론 한참 선배인 회사 후배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와 글쓰기를 버무려 인생을 회고한 책이다. 매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하루키 역시 처음엔 20분을 넘기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그에게도 특별한 달리기 비법은 없었다. 스피드나 거리에 개의치 않고 쉬지 않고 매일 달리면 몸이 달리기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거리도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였다. 작은 깨달음 같은 게 왔다. 오래 달리려면 우선 느리게 달려야 했다. 1km를 달릴 때마다 구간 속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시계부터 샀는데, 페이스 조절에 매우 유용했다.
알고 보니 적절한 페이스 유지는 오래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오버 페이스만 방지하면 실패는 없다”는 게 마라톤계의 철칙일 정도다. ‘오버 페이스를 막는 체크포인트’도 회자된다. 페이스를 유지하려면 일단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뒷사람에게 추월당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자제력이 필수다. 컨디션이 좀 좋다고 오판해 전력으로 질주하면 낭패 보기 쉽다. 자기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래저래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속도를 줄이니 주변 풍광을 느긋하게 즐기며 기분 좋게 달리게 된다. 이제10km 달리기는 거뜬하다. 15km, 20km가 넘게 뛰기도 한다. 하프를 뛰고 보니 점점 풀코스 완주 욕심도 생긴다. 하지만 가당찮은 생각임을 깨닫고 금세 고개를 흔들고 만다. 마라톤은 한판 승부가 통하지 않는 경기이며, 끈덕지게 연습하고 오래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운동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속도 조절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닐까 싶다.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일 말이다. 감정 과잉 상태에서, 방향감조차 상실한 채, 이리저리 마구 달리다 페이스를 잃어버린 실패한 주자,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 아닌가.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그리고 여론의 공론장에서 지난여름 이후 우리 모두 오버 페이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