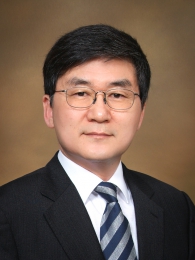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95호 2019년 6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조선족이라 부르든 중국동포라 부르든
신예리 JTBC 보도제작국장·본지 논설위원
조선족이라 부르든 중국동포라 부르든
신예리
영문87-91
JTBC 보도제작국장·본지 논설위원
“천지를 못 보고 돌아선 사람이 하도 천지라 이름이 천지가 됐답니다.”
모처럼 연휴를 틈타 중국을 찾았던 지난달 초, 현지 가이드가 백두산으로 가며 던진 아재 개그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백두산 정상의 천지는 조변석개하는 기상 상황 탓에 흔히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들 하죠. 딱히 누구 덕인지는 몰라도 마침 그날은 날씨가 쨍하게 맑아서 눈 덮인 천지의 웅장한 모습을 오롯이 눈에 담는 천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길이 막혀있는 지금, 백두산에 가려면 중국 동북 지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거쳐야 합니다. 초행인 입장에선 천지의 장관이 준 감명 못지않게 한국인 듯 한국 아닌 한국 같은 그곳의 풍광이 퍽 인상 깊었습니다. 가게마다 한글과 중국어가 병기된 간판이 달려있는가 하면, 곳곳에서 귀에 익은 말씨의 동포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 날, 가이드가 작심한 듯 던진 인사말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돌아가시면 우리 동포들에게 좀더 잘 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들 여기 두고 온 가족들 먹여 살리자고 열심히 일하러 간 것 아시잖습니까. 예전에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나갔던 분들과 다를 게 뭡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저 말을 건넸던 것일까요. 피를 나눈 동포라면서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궂은 일을 대신해 주는 그네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서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속으론 징글징글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덕에 먹고 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 애써 웃는 낯으로 읍소하는 길을 택했을 테지요.
여행 도중 그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왜 한국 땅을 떠나 중국으로 오는 바람에 나를 이리 힘들게 살도록 만들었나 원망한 적도 많았다”고요. 그러고 보니 그를 포함한 수많은 중국 동포들은 힘 없는 나라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리고도 그 나라를 잊지 못해 이국 땅에서 열렬히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들의 자손입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해진 한국 사회가 그들을 온전히 사람 대접하지 않는 건 참으로 남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조선족이라 부르든 중국 동포라 부르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