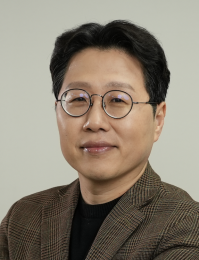[477호 2017년 12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연구가 뭔지 몰랐던 시절
조장희 수원대 석좌교수 칼럼
명사칼럼
연구가 뭔지 몰랐던 시절
조장희
전자공학55-60
수원대 석좌 교수·뇌과학연구소장
모교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 특임연구위원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경성제대의 일본 교수들이 모두 물러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다.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대학의 교수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경성제대’ 때의 일본 교수들의 실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특히,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의 학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서울대의 교수들은 당시 대학만 나오면 될 수 있었고 많은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이들이 교수가 되었다. 따라서 교수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왔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교수가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1950년 말과 60년 초에 들어서 서울대는 미네소타대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미네소타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이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되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하는 ‘학문 연구’의 집단이며 이 집단은 필히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간단한 개념이 우리나라 대학에는 없었고 우리는 대학이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과 대학들이 대학은 ‘가르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기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면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우리는 대학이 ‘가르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은 연구를 하는 대학으로 변신해야 하며 이런 연구는 많은 비용과 우수한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는 연구를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는 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한 교수 밑에서 어떤 문제가 연구의 대상이며 어떻게 끌어나가야 하는지를 학생과 교수가 같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이다.
대학은 가르치는 곳이라는 개념 탈피
연구를 하는 곳으로 변신해야
노벨상 수상 또한 연구역량에 달려 있어
또한 연구는 아직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또 필히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증을 받아서 국제 전문학술지에 발간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학문적인 연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많은 선진 연구시설과 세계적인 연구자와 학자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 외국은 몇 백 년의 연구 전통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능력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발맞추어 SCI(Science Citation Index) 라는 공인된 연구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활발히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요점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고 교수와 연구자들 그리고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 생각된다. 대학은 그 나라의 연구역량의 척도이며 연구역량은 그 나라의 국력이다. 중국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100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선발해서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20 : 1이므로) 5개의 연구중심대학을 선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한된 국가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볼 때 우리도 이에 준하는 몇 개의 선별된 대학을 선발 지원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긴 대학으로 연구중심대학이 어떻게 연구역량을 키우느냐와 연구역량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모범이 돼야 할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연구는 한 대학의 연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정치, 사회질서 확립과 국방과 같은 10년, 20년 후에 한 나라의 산업 발전과 국력의 기반이 되며 우리의 문화 역량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 역시 우리의 대학 연구 역량에 달려있으며 또한 이는 우리가 문화 민족이라는 표상이 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학의 연구 역사가 짧아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 속에서 연구와 학문으로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일류에 공헌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하면서 서울대학교가 이에 모범이 되어 우리나라 대학도 연구와 교육을 통한 세계 속의 대학들로 태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