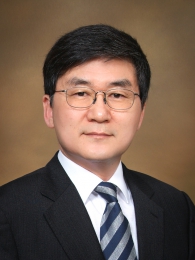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76호 2017년 11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30대 지도자 바람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칼럼
30대 지도자 바람
김광덕
정치 82-86
미주한국일보
서울 뉴스본부장
본지 논설위원
세계 지도자의 얼굴들이 확 바뀌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30대 최고지도자들이 속속 정치 무대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영국의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등 40대 지도자들이 새 바람을 일으켰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도자 면면이 한층 더 젊어졌다.
지난 10월 하순 뉴질랜드에서는 37세 여성인 재신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총리직에 올랐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제2당에 그쳤으나 ‘킹메이커’가 된 소수 정당인 뉴질랜드제일당과 녹색당 등과의 연정을 통해 제1당인 국민당을 누르고 총리를 배출했다. 아던 대표는 뉴질랜드에서 160여 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됐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는 중도 노선을 표방한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프랑스 현대 정치 사상 최연소 국가수반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중도우파 국민당이 최근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서 31세의 세계 최연소 정치지도자가 탄생하게 됐다. 국민당 대표인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1986년생으로, 외무장관으로 있던 올해 5월 당권을 잡았다.
이처럼 30대 최고지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이 확 바뀌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욕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이 계속되고 난민 및 테러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국익과 삶의 질을 적극 추구하는 흐름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 욕구는 새로운 노선의 정당 선택을 넘어 급격한 세대 교체를 촉발하게 된 것이다. 과연 젊은 지도자들이 패기 있게 성공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경험 부족으로 실패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장면을 국내 정치 무대로 바꿔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선 낙선자들이 줄줄이 야당 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5·9 ‘장미 대선’에서 41%를 얻어 승리한 문재인(64세) 대통령은 민주당의 실질적 지도자가 됐다.
또 5월 대선에서 각각 24%, 21%를 얻어 2, 3위로 낙선한 홍준표(63세) 후보와 안철수(의학80-86) 후보는 각각 7월과 8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에서 7% 득표로 4위를 기록한 유승민(경제76-82) 후보는 11월 13일 열리는 바른정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 대표가 되려 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선 때 TV토론을 벌였던 후보들이 나란히 서게 되는 장면이 재연될 수 있다.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여러 야당의 당수가 되는 현상은 1988년과 닮은꼴이다. 1987년 대선에 출마했던 유력 후보 4명 가운데 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대선에서 낙선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후보 등이 총재를 맡은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4월 총선에서 각각 제1, 제2, 제3야당이 됐다.
어쨌든 한국 정치는 미국이나 영국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과 영국에선 정당 이름이 200년 이상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미국의 민주당·공화당, 영국의 노동당·보수당이 그렇다. 그 나라들에선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나타나 당을 개혁하고, 결국 대통령·총리가 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당 이름은 수시로 바뀌지만 정당 지도자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물론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듯이 충분한 경력을 가져야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선주자군에 새 얼굴들이 수혈돼야 우리 정치에서 ‘메기’ 역할을 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도 새 영웅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서도 ‘신(新)영웅시대’를 준비하는 ‘선한 인재’들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