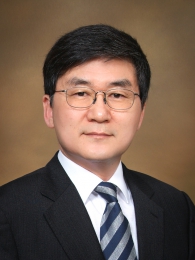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67호 2017년 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김영희 칼럼 '권력이 문화를 ‘사랑’할 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은 희망"
권력이 문화를 ‘사랑’할 때
김영희(고고미술사88-92) 한겨레 사회에디터, 본지 논설위원
지금은 거장이 된 임권택 감독은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 유신시대 첫 국책영화의 메가폰을 쥔 이였다. 당시 영화진흥공사는 ‘유신이념 생활화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내걸고 직접 영화 제작에 나섰는데, 그 첫 작품이 임 감독의 반공대작영화 ‘증언’(1973)이었다. 또 다른 그의 작품 ‘아내들의 행진’(1974)은 농촌의 부녀자들이 마을을 재건한다는 내용의 새마을운동 영화였다. 임 감독은 치욕적인 ‘국책영화의 시기’를 단련의 시기로 삼았다. 이후 자신만의 세계관을 반영한 영화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나갔다. 그래서 그 시기 임 감독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시기에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정권은 진심으로 문화를 중요시한 정권이었다. 공교롭게 박근혜 정권 들어 문화부장과 사회에디터를 잇달아 맡은 덕분에 그 실상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2013년 인터뷰를 위해 만났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문화정책에 몹시 기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6년 넘게 야인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도 안고 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중심이고 사회의 정신적 기반이 척박하다’며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소통, 배려, 나눔 같은 문화적 가치가 모든 걸 우선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 그날 대담에 나선 도정일 선생도 “장관의 인식이 너무 훌륭해 할 말이 없다”고 농담할 정도였다. 1970년대식 냄새가 나는 ‘문화융성’이란 단어에 갸웃하긴 했지만 말이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은 희망"
하지만 얼마 못 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이후에야 퍼즐은 하나씩 풀렸다. 2013년 9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 24개관에서 개봉 이틀만에 내려진 일이 있었다. 메가박스는 당시 “우파 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시위가 예고됐다”며 관객 안전을 내세웠지만, 최근 특검 수사에서 김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에게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엔 청와대 지휘로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관의 표를 일괄 매입해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라’는 액션플랜이 만들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그 뿌리가 ‘문화는 보수이념을 전 사회에 전파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김 실장의 인식이었다. 무릇 현실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문화예술의 원천이고 이에 따라 어느 시대에나 권력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이해 못했다. 직접 국책영화를 제작하던 70년대가 그는 몹시 그립지 않았을까.
지난해 말 서울대 후배들이 ‘부끄러운 동문상’을 조사해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김 실장을 꼽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글프면서도 조금은 위안이 됐다. 부끄러운 동문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 작은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