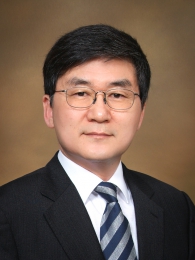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65호 2016년 1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서울대인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나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본지 논설위원
서울대인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나
강경희(외교84-88)조선일보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기자(記者)가 된 거창한 이유는 없다. 박한 재주나마 우리 사회에 정직한 관찰자로 한 가닥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직업의식에서 출발했다. 신문사 밥 먹고 산 지 만 25년. 신문 안 만드는 토요일 빼고 1년 300일을 허구한 날 역사적 소명으로 가슴 벅차게 보낼 순 없으니 때론 매너리즘에, 때론 무력감과 회의감에 부유했던 날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 기자에게 ‘운 좋다’는 건 재물복도, 권세복도 아닌, 일복 많다는 것과 동의어다. 대형 뉴스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록하고 훈수까지 둘 수 있는 게 제일 큰 행운이다.
기자 생활 대부분을 경제 기자로 보냈다. 초년병 경제기자 시절 재정경제원 출입기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파리특파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막 경제부에 복귀한 2008년 9월 발밑이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유럽도 재정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용케 넘기는가 싶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8년. 바깥 사정도 나쁘고 반세기 버텨온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제 체력이 뚝뚝 떨어졌다. 3%대 성장도 못 지키고 2%대로 주저앉았다. 경제라는 하부 구조는 만성 질환이 깊어지는데 정치라는 상부 구조는 오히려 후퇴하는 걸 보면서 절망했다. 차라리 IMF외환위기 같은 급성질환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를 공감하면 극복할 의지도 생기지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각자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인 사회는 절망 그 자체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그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 없지만 올해는 유별났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격랑 속에 2016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TV조선 보도로 촉발돼 한겨레의 심층 보도,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권력 비리가 드러나고 국정은 리더십 공백을 맞았다.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 시위.
무릎을 쳤다. 위기가 늘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다. 예상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경제적 처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성과 공인(公人) 의식, 직업정신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정한 시장 경제도, 법치도, 기회 균등도 열리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40년 인연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안에서 버젓이 작동한 건 똑똑한 머리를 출세와 권력 사유화에만 굴렸던 부도덕한 엘리트들이 호위무사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잘났으나 부도덕한 사람과 잘나지 않아보여도 정직하고 올곧은 시민, 누가 우리 사회에 흉기(凶器)이고 누가 이기(利器)인가.
학창 시절 이 한 구절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많은 서울대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수시로 되새겨야 할 말이다. 서울대인이 높은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는 대한민국도, 관악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암울한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