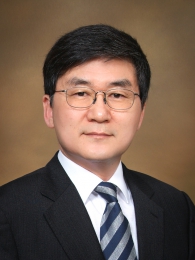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58호 2016년 5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정연욱 칼럼 오만과 민심의 바다
20대 국회의원, 민심을 잘 살펴야
정연욱(공법85-89)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본지 논설위원
뜨거웠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양당 구도를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체제로 뒤집어놓은 총선 민의를 둘러싸고 그 여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서울대 동문은 120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6명으로 같고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132명)에 비하면 당선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들은 선거 기간 내내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바닥 민심의 엄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지 않은 절묘한 ‘황금분할’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오만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이유다.
도도한 민심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정치’에 빠져들면 정치권은 언제든지 심판대에 섰다. 이번 총선도 그 ‘철칙(鐵則)’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시계추를 2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6년 4월 15대 총선 때다. 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140석(전국구 포함)을 얻었고 국민회의는 79석에 그쳤다. 김영삼(YS) 정부 집권 4년차였는데도 신한국당이 예상외로 선전해 서울에서만 과반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국민회의는 총선 결과에 낙담했다. 총선 승리를 이듬해 대통령선거의 디딤돌로 삼으려 했던 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는 전국구에서도 낙선했다. 대선후보 자리까지 위협받으며 2선 후퇴 공세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이었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YS는 강경 드라이브를 밀어붙였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당의 누구를 내세워도 DJ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니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오만이 화를 불렀다. 노동법 날치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은 대선후보 조정으로 자중지란을 겪었고, DJ는 ‘DJP 연대’라는 극적인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1997년 대선은 DJ 승리로 끝났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20년 전 정국을 많이 떠올렸다. 몇 차례 재·보궐선거 승리로 으쓱해진 새누리당은 민심의 여과장치를 던져버렸다. 친박-비박이 맞붙은 지루한 내전에 들어가면서 공천 파동의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오죽하면 평생 1번만 찍었다는 일부 유권자들이 “이번에 절대 투표 안 한다”며 기권을 했을까.
더민주도 당의 주력 기반인 호남에서 참패한 현실을 냉정하게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야당의 적통인데 우리가 공천만 하면 다 따라와야 한다는 오만이 발동한 탓 아닐까. 제1당의 전과(戰果)가 여당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인데도 “우리의 승리”라고 우쭐해하면 민심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제3당의 교섭단체를 확보한 국민의당은 두 거대 정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한 민심이 잠시 거쳐 간 임시 정류장일 뿐이다.
민심은 다시 총선 이후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선거에 승리한 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오만으로 비칠 만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전권을 준 것이 아닌데, 착각하지 마라.”
중국 고전인 정관정요에는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의 ‘수능재주 수능복주(水能載舟 水能覆舟)’라는 말이 있다. 물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이다. 민심의 바다는 언제든지 출렁인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국민은 호랑이다. 민심을 잘 보고 가야 한다”며 “거슬리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갈파했다.
서울대 동문 당선인들은 앞에 펼쳐진 20대 국회 의정 활동이 거대한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발언과 행동이 오만으로 비쳐지면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당선의 기쁨은 누리되 그 여운은 짧아야 한다. 이제 민심의 바다로 항해를 나갈 동문 당선인들의 건승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