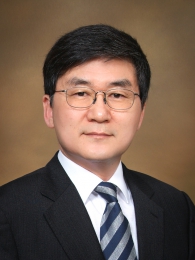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57호 2016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운동권 민주주의, 30년 만의 임무교대
전영기 (정치80-84) 중앙일보 논설위원·본지 논설위원
운동권 민주주의, 30년 만의 임무교대
전영기 (정치80-84) 중앙일보 논설위원·본지 논설위원
아무런 장치 없이 내버려 두면 희망보다 절망 쪽으로 기우는 게 보통 인간의 속성이다. 나 역시 그런 성향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의 직업적 자세는 말과 글, 언어의 힘에 의지해 희망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치러졌다.
2016년 총선 무대는 한국 정치에서 무엇이 퇴장해야 하는지 보여줬다. 첫번째 퇴장 대상은 ‘운동권 패권주의 문화’다.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기적을 만들어냈던 초기 운동권 문화는 젊고 저항적이었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헌신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운동권을 지지했다. 민주화 시대가 30여 년 지속되면서 운동권 의식은 어느덧 정치사회의 지배자가 되었다. 오래된 습성과 달콤한 보상에 젖어 운동권은 스스로 변화를 거부했다. 공부가 없었다. 예민했던 정의감을 독선과 위선이 대체했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시대, 과거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다양하고 중첩된 숱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어울려 공동체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이른바 ‘문제해결형 민주주의 시대’다. 이런 시기에 여전히 세상을 민주와 반민주, 선악 간 2분법적 진영으로 나누고 분파적 권력과 승리 쟁취에 골몰하는 패거리 세력이 활개친다. 이들 운동권 세력은 늙고 완고해졌다. 과거 집착적이고 폐쇄적인데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자기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정신적으로 가련하긴 한데 세력적으로 강성해 그저 연민만 하고 있을 수 없다. 4·13 총선은 지난 30여 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운동권 패권주의 문화가 심판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운동권 민주주의는 시대의 임무를 문제해결형 민주주의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은 총선 전에 이 글을 쓴 필자와 달리 선거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운동권 패권주의자들은 몇 명인가. 그 세력은 19대에 비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 퀴즈의 답을 찾아봄으로써 4·13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성숙에 얼마만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정리해야 할 두번째 유산은 ‘궁중형 패권주의 문화’다. 궁중형은 민주주의 시대에 통치자의 의사결정이 베일에 싸여있어서 붙은 비유적 용어다. 민주화 시대의 과거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때조차도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논이 오고가는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관저에서 홀로 결정하고 참모와 각료, 집권당과 국회에 지시를 내리거나 요구하는 장면만 보여줘 왔다. 통치자의 고독은 때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대통령은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거나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주변과 국회, 정치권을 직접 설득하거나 타협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은 비상시기가 아닌 한 다수 국민이 수긍할만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게 정도다. 그러지 않고 엄격하고 가혹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주의적 방식은 문제해결형 민주주의 시대에선 통하기 어렵다. 여름밤 화톳불을 향해 날아드는 부나방처럼 오직 권력자의 뜻에만 맹종했던 집권당 후보들의 총선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운동권이든 궁중형이든 20대 총선은 패권주의가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