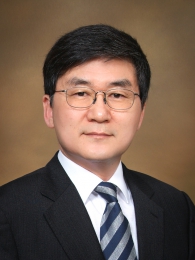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455호 2016년 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다시 帝國 사이에 선 한국
이선민 본보 논설위원·조선일보 선임기자
다시 帝國 사이에 선 한국
이선민 (국사80-84) 본보 논설위원·조선일보 선임기자
‘제국(帝國), 그 사이의 한국’(Korea Between Empires)(2002년)은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앙드레 슈미드 교수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에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고찰한 책이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 당시 주요 언론을 분석해서 근대적 지식이 탄생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대두하는 과정을 추적한 이 저서는 호평을 받았고 우리말로도 번역됐다. 서양인 학자가 한국사를 우리 학자들보다 더 수준 높게 파헤친 이 역저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근대문명과 제국주의의 강풍 앞에 선 한국이 ‘지는 제국’ 중국에서 벗어나 ‘떠오르는 제국’ 일본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그것이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귀결되고 말았던 결과를 오늘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두 제국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슈미드는 그런 상황이 시대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책 제목으로 삼은 것 같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한국은 다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나라의 위상이 바뀌었다.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겨루는 'G2'로 떠오르고 있고,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울고 있다. 동북아가 ‘떠오르는 제국’ 중국과 ‘지는 제국’ 일본이 일으키는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한국은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세 차례 찾을 기회가 있었다. 모두 역사탐방이었기에 자연히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지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월에 서울대의 일본 전공 교수들과 함께 후쿠자와 유기치의 고향인 오이타현 나가쓰, 일본 해군의 본거지인 구레, 원폭 투하 현장인 히로시마를 돌아봤고, 12월에 동북아역사재단 탐방단으로 ‘메이지유신의 태동지’ 하기와 서양문물이 일본에 들어오는 창구였던 나가사키 등을 방문했다. 11월에는 ‘한-중 항일운동 국제학술회의’ 취재차 하얼빈에 들렀을 때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과 731부대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이중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긴 것은 731부대 전시관이었다. 731부대 유적지에 있던 옛 전시관 바로 옆 지하에 지난해 여름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새 전시관을 둘러보면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인들에게 자행했던 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시장을 중국 학생들이 가득 메우고 안내원의 열띤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역사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웃 나라들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히로시마 원폭 박물관은 일본인이 겪은 참상만 강조돼 있었고, 구레의 야마토 뮤지엄은 태평양 전쟁 발발을 서양 열강의 일본 봉쇄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나가사키 앞바다의 군함도에도 일본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만 부각할 뿐 한국인 징용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50년의 굴욕을 떨쳐내려는 결의에 차 있는 중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이에 맞서는 데 급급한 일본 사이에 한국은 놓여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거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훨씬 규모가 큰 전시관으로 응답한 것은 그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돌아보고 동북아에 유럽처럼 역사 화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치 공동체가 들어설 날은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한국이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길 때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지만 고민의 무게는 결코 그때만 못하지 않다. 과연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