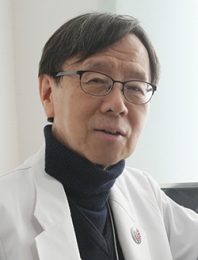[451호 2015년 10월] 기고 에세이
동숭로에서 : 동숭로, Yes와 Maybe와 No의 추억
유안진(교육61-65)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동숭로, Yes와 Maybe와 No의 추억
가끔 싸르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의사는 얼른 사촌한테 전화를 걸란다. 틀림없이 사촌(四寸)이 땅 샀을 거라고. 또 언젠가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자 옛날 애인이 행복하다고 했나?! 라고 응수해서, 그 농담을 옮겨 쓴 적도 있다.
“옛날 애인이 행복하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불행하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다시 사귀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러므로 절대로 만나지 말지어다…“등의 내용이었는데, 읽은 친구들이 빈정댔다. 몇 년 전 시집에는 같은 제목으로 “봤을까? 날 알아봤을까?“라고 써 놓고 무슨 뚱딴지냐고?. 시가 본래 그런 뚱딴지인 줄 서로 잘 알면서도 말이다.
칼럼이 ‘동숭로에서’라니, 학창 때를 암시하는 듯, 학문적 고뇌니 사랑이니 낭만이니… 등이 얼른 떠오르는데, 내 속성이 너무 통속적인가? 그러나 어휘자체의 낭만적 무드와는 너무 아니어서 문득 아쉽고 슬프고 야속해진다. 더구나 동숭로와는 동떨어진 사범대는 용머리동(용두동) 좁은 교정, 벽돌집 몇 채에 부속중학교와 공용하는 운동장이었으니, 마로니에니, 대학천이니…. 어쩌 저쩌의 고유명사들은 내 학창 밖이었고, 어질머리 낭만이나 치열한 불길사랑은 천국-지옥 사이보다 멀었으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목버짐나무와 대학로 대학천’은 종로5가 ‘서울빵집’과 엮이곤 했다. 유학에서 돌아온 한참 뒤까지 그 이름 그대로 있어주어 고마운 서울빵집! 출퇴근길 남편에게 저 빵집에서 데이트했다고 으스대곤 했지만, 허영이고 자존심이었지.
동숭로는 매 학기초 등록금 내던 본부건물과, 종로5가 서울빵집에서 만나, 동숭로를 걸었던 기억만으로도 묘한 의미(意味)가 되는지, 지금도 거기서의 행사 때마다 재음미되곤 한다. 우리는 전차 한번만 타고도 만나지는 종로5가 코너건물 2층 서울빵집에서 만나, 문리대 의대캠퍼스를 어정대다가 헤어지곤 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의대생들은 좋겠다. 히포크라테스의 동상 앞에서 만나자면 되니까.- 뭐. 그렇게 유치했던 기억과 함께, 외교관의 yes는 maybe이고, maybe는 no라던 말은 생생하다. no라고 하면? 묻자, no를 입에 담는 외교관은 외교관 자격이 없다 했는데,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생각나곤 한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나는 늘 촌순이, 어리버리 어쩡쩡이었다. 그 때야말로 정체성혼미와 유예기였으리. 사범대학이면서 중?고교 교과전공과 달라서 그랬을까? 교육학과를 박사학과, 교수학과, 총장학과, 장관학과, 총리학과라고들 진?농담 섞는 까닭이, 중?고교의 과목전공과 직결되지 않아, 졸업생들 진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리라. 대학시절 나는 늘 없는 누구와, 없는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나 자신도 몰랐고, 늘 심리적 정신적인 허기와 추위에 시달렸다. 모든 문은 열린 듯 닫혔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도 불가능했고, 겁나고 두려웠다. ‘고통의 극대화'라고 제 이름을 지었다는 막심 고리끼를 못내 사랑했으나, 비슷한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가뭄에 콩 나듯한 데이트는 서로에게 의미가 되지 못해,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사랑 아닌 사랑으로, yes는커녕 maybe였다가 흐지부지no가 되었던가.
관악에 재직중일 때, 잠시 귀국했다고 연락주어, 낯선 모교 캠퍼스를 안내한 적 있고, 그 나라 문학단체 초청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매운 순두부를 사주었고, 서로의 자식, 손자들 얘기를 나누며 웃어대기도 했다. 그렇게 부담 없는 텅 빈 추억! 내용 없이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동숭로는 늘 그 정도로도 충분하게 생각나, 이런 잡담도 주절댈 수 있을까?.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라는 삼국지의 영웅 조조(曹操)의 말처럼, “남아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충분한 게” 인생인가? 그 철학으로 그는 시문(詩文)에 능했고, 황제 되기를 마다했을까? 어제도 대학본부건물(지금은 예술가의 집으로 호칭)의 어느 행사에서 학창 때의 그 빈약한 얘기로 잔뜩 기대했던 좌중을 웃겼다. 그렇게 언급하니 색깔은 짙어지고 의미도 도드라지는 동숭로가 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