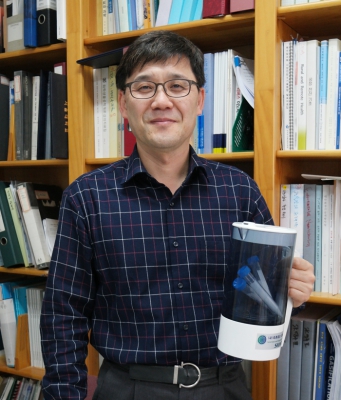[549호 2023년 12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한국만 잠잠했던 빈대, 반드시 문제될 거라 생각했다”
“한국만 잠잠했던 빈대, 반드시 문제될 거라 생각했다”
김주현 (응용생물화학05-09)
모교 의대 열대의학교실 조교수

모기·빈대·이 등 흡혈곤충 연구
“살충제 저항성 날로 높아져”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무엇을 연구하냐’는 말에 김주현 모교 의대 열대의학교실 교수가 답하면 십중팔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모기는 그렇구나 하는데, 빈대나 이를 연구한다면 뭐하러 연구하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도, 밀도가 낮을 뿐 언제나 존재했다. 특히 김 동문이 걱정한 건 빈대였다. “전 세계에서 문제인데 한국만 잠잠한 게 이상했죠. 언젠가 반드시 문제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예상대로 한국은 지금 빈대 몸살을 앓는 중이다. 김 동문이 처음 살아 있는 빈대를 연구한 건 14년 전인데, 요즘에야 빈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작년 말 반날개빈대를 70여 년 만에 국내에서 재발견했고, 최근 살충제 저항성 빈대에 효과적인 대체 약제를 발굴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하며 그는 “‘빈대 전문가’보다 더 넓은 의미의 흡혈곤충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12월 1일 연건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
“갑각류, 곤충류, 거미류 등을 포괄하는 절지동물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건 사람의 피를 빨아 기생하거나 질병을 옮기는 종류예요. 모기, 이, 진드기, 빈대 등이 있죠. 이들의 생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병원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었다. “말라리아를 옮기려면 열원충이 모기 장을 뚫고 나와서 침샘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특정 종류의 모기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같은 이라도 면역력이 강한 머릿니는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몸니는 죽이지 못해 병을 옮기죠. 다같이 흡혈을 해도 특정 절지동물과 소화기관 내의 환경, 병원체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이 곤충은 병을 옮기고, 저 곤충은 못 옮기는 것, 작은 몸에서 그런 복합적인 일이 일어난단 게 너무 충격적이고 신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빈대를 연구한 건 다른 흡혈곤충에 없는 특이한 단백질에 관심을 가져서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가끔 발견되는 빈대들이 심상찮았다. “미국 학회에선 10여 년 전부터 빈대 분과를 따로 두고 살충제 저항성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가끔 빈대가 잡히면 살충제 저항성이 보여 어쩌나 싶었죠.” 흔히 ‘살충제 내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 그 대에서 끝나는 내성과 달리 저항성은 유전적 변이를 뜻한다. 그나마 빈대는 병을 옮기지 않지만, 병을 옮기는데 약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그가 저항성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이유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같은 국내 3급 법정감염병 중 절반 이상이 절지동물이 매개체인 걸 아시나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걸려온 사람만 치료하면 되지만, 만약 그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같이 들어와서 국내에 정착하고 감염고리가 완성되면 큰일이거든요.”
매개체 연구를 하다 보면 24절기가 다르게 체감된다. “봄이면 남쪽에서 참진드기 소식이 들려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녀석들이죠. 여름은 저희 성수기예요. 더워지면 슬슬 강원, 경기 북부에 말라리아 모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채집하러 가요. 많을 땐 한 번에 1000여 마리씩 산 채로 고이 가져와 해부하고, 키우기도 해요. 가을엔 쥐 잡아야죠.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진드기가 쥐에 붙어 살거든요.” 바쁠 땐 주말도 없다며 즐거워만 보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곤충 덕후’였다. 연구실에도 생전 처음 보는 곤충 모양 봉제인형과 모기 그림 티셔츠, 컵 등 곤충 굿즈가 즐비했다. 해외 학회 갈 때마다 사 모았다는데, 빈대는 왜 없는지 물으니 “너무 안 닮았더라”고 했다.
실로 그는 흡혈곤충에게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먹이고 재우며’ 직접 키웠기 때문이다. “대학원 때 머릿니와 몸니로 박사논문을 쓰면서 흡혈곤충 인공 사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빈대는 굶어도 세 달은 버티지만, 이는 사람 피만, 그것도 두 시간마다 먹어요. 연구용 혈액이 늘 있지도 않죠. 당장 먹이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손 빌릴 데는 없고…. 제 다리에 붙였죠.”
누구든 머릿니나 빈대는 기꺼이 내주기보다 감추려고 했다. 문전박대도 여러 번 당했다. 한 마리가 아쉽고 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저도 가렵고 힘들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경우 빈대는 4마리 물린 게 이 200마리와 맞먹어요. 그래도 제 피를 먹으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윤기도 나고요(웃음). 사람을 흡혈하면서 사람과 함께 진화한 것들이잖아요. 좋든 싫든 우리와 가장 가깝다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지곤 해요.” 공들인 인공 사육 시스템이 모교에 잘 정착한 것도 보람이다.
국내 기생충학과 곤충학에서 흡혈곤충은 마이너 분야다. 생리학적 연구는 더 드물다. 모교 박사 졸업 후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내고, 지난해 3월 모교에 부임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이력서를) 정말 많이 쓰고, 많이 떨어졌어요. 열대의학교실에서 연구하는 기생충에 절지동물도 속해요. 처음으로 절지동물 전공을 뽑으셨고, 제가 운이 좋았죠. 내 전공으로 갈 곳이 있을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교에 오니까 그늘에서 자라다 양지바른 곳에 심겨진 묘목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흡혈곤충으로 인한 감염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심도 있는 매개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는 날로 절지동물의 번식에 유리하게 변해가고, 병을 옮기기까지 잠복기는 짧아진다. 약제 저항성은 커지는데 늘어난 해외 교류로 국가 간 전파까지 쉬워지니 총체적 난국이다. “잡아 죽이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약이 듣지 않으며, 어떻게 병을 옮기는지 이해하고 지금부터 관리해야죠. 빈대처럼 문제가 됐을 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 얼마 없는 ‘흡혈곤충 전문가’란 정체성이 너무 소중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하는 연구가 결국은 인류 보건 향상과 복지로 귀결돼야 한단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제겐 흡혈곤충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이 덜 고통받게 하는 게 애정이고 삶의 비전이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연구로 어떻게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지 목표의식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시작인 만큼 즐겁게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