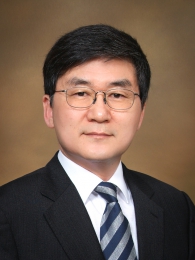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49호 2023년 1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어떤 구순 선물
어떤 구순 선물

김영희
고고미술사88-92
한겨레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남편이 쓴 시어머니 평전 뭉클
모든 삶은 기록되어 마땅하다
지난달 시어머니 구순을 맞아 전국에 흩어진 네 자녀와 그 가족들 12명이 밀양 근처 골짜기 펜션에 모여 1박2일을 지냈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상을 차리고 가족사진을 확대해 걸개 사진과 풍선을 매다니 고급식당의 잔칫상 못지않았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 한잔씩 나누자 흥이 오르셨는지 어머니는 메들리로 노래도 부르셨다.
어머니가 한사코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하셔 고민이라던 남편은 깜짝 선물을 내놨다. 큰아들인 남편이 쓰고 막내딸이 사진과 함께 편집해 한 장 한 장 코팅한 A4용지 크기 13페이지짜리 어머니 ‘평전’이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남편은 어머니를 만나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 당신의 삶을 회고하는 영상을 조금씩 찍어놓은 터였다. “어머니가 더 기억력이 쇠하기 전에 기록이라도 해둬야겠다는 정도”였지, 딱히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랬던 기록이 어머니의 선물 거절로 ‘급하게’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셈이다.
지방에서 혼자 힘으로 갖은 장사를 하며 네 자녀를 키운 어머니다 보니, 일찍부터 떨어져 살았던 아들과 살갑게 당신의 과거를 이야기 나눌 기회는 좀체 없었던 듯하다. 남편은 어머니가 말라리아를 2년 넘게 앓은 데다 “여자가 많이 배워 뭐하냐”는 할머니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던 사연도 기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세상일에 관심이 많아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 치매를 막으려 지금도 하루 한 페이지씩 천자문 쓰기를 하고 설거지와 손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일상도 책에는 담겼다.
지난해 ‘한겨레’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신청하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구술자서전을 매해 쓰는 작가 모임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린 적 있다. 작가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이냐’고 하던 노인들도 구술자서전 작업을 통해 인생을 반추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더라고 했다. 어머니는 신부님이 성당의 여러 신도 앞에서 “나이 드신 분 중 가장 조리 있게 말하는 분”이라고 당신에 대해 말했던 것을 가끔 얘기한다. 그만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것이 한이 됐을 것이다. 남편은 평전이라 부르기 민망하다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000’라는 제목의 책자는 어머니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응원과 지지가 되지 않았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록은 더욱 손쉬워졌다. 빛나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 기록되어 마땅하지 않은 삶은 없는 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