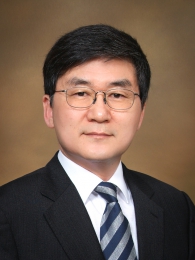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44호 2023년 7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과거는 낯설어야 한다
과거는 낯설어야 한다

고정애
제약87-91
중앙일보 Chief 에디터·본지 논설위원
전면전 치닫는 역사 논쟁
역사적 사실·맥락 살펴야
최근 평전의 증보판 발행을 곁눈질하며 한 언론인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자 최병우(1924~1958)입니다. 일제와 해방공간, 대한민국 수립과 한국전쟁, 냉전으로 이어진 격랑의 현대사 한복판에 있던 인물입니다. 서른네 살의 짧은 삶 동안 주일 외교관이었고 한국은행원이었고 마지막 6년은 기자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정도로 글로벌리스트였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쇼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엔 중국·대만 간 국지적 충돌을 취재하다 숨졌습니다. 내로라하는 타국 기자들과 경쟁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찌 한 사람에게 이처럼 다채로운 모습이 담길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겠으나 최병우였기에, 또 격변기였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또 있습니다. 현재 통념보다 복잡다단한 현실입니다. 잘 안다 여겼으나 잘 몰랐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중학 시절에 일본인으로 여겨질 정도로 일본어를 잘했으나 일본어로 말하길 꺼려했다는 건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식민교육의 모델로 여겨지던 중학교장 이와무라 도시오의 영향을 받아, 교장의 모교(고치고교)로 진학했습니다. 식민지 청년의 마음은 어떤 풍경이었던 걸까요. 그가 종군기자로 남긴 정전협정 조인식 취재기도 인상적입니다. ‘기이한 전투의 정지, 당사국 제쳐놓은 결정서로 종막’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백주몽(白晝夢)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뿐이었다. 유엔 측 기자단만 하여도 약 100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은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구의 한 역사가가 “과거가 현재의 친밀한 메아리가 아니어야 한다”, “과거는 편치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게 떠오릅니다. 단지 우리의 현재 욕구에 부합하는 과거라면, 굳이 방문해서 배우려는 동인이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층적인 최병우의 삶에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역사 논쟁’이 대단히 열렬합니다. 진영 간 전면전 양상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내용적으론 외려 빈약해진 듯하다는 점입니다. 맥락과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동기나 당위만 강조하곤 해서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할지 입을 벌리기 전에 짐작할 정도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려는 게 아니라, 과거를 무기 삼아 싸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