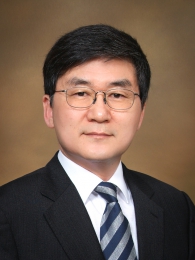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41호 2023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천원의 아침’ 숟가락 얹는 정부
김영희 한겨레신문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느티나무칼럼
‘천원의 아침’ 숟가락 얹는 정부

김영희
고고미술사88-92
한겨레신문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요즘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이 화제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원가를 학교가 부담하는 식이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현장을 찾다 보니 간혹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기 2년 전인 2015년부터 ‘천원의 식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아침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다음 해엔 저녁, 2018년엔 점심으로까지 확대됐다. 순천향대는 2012년부터 실시했다는데, 아무래도 이 이름이 내 기억에 각인된 건 서울대 때부터였던 것 같다. 얼마 전엔 서울대 재학시절 1000원짜리 아침을 단골로 이용하던 학생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제도 담당 사무관이 됐다는 ‘미담’ 기사도 나왔다.
‘천원의 아침’에 줄 선 학생들의 사진을 보다 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말 학생회관 풍경이 떠올랐다. 과 선배들은 간혹 후배들 점심을 사게 되면 학생회관 1식당으로 데려가 500원짜리 식권 쿠폰을 나눠주곤 했다. 이른바 ‘사깡’이라 불리던 사범대 앞 간이식당의 400원짜리 자장면, 공대 쪽 공깡의 비빔면 등도 우리 세대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다. 반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엔(N)분의 1 문화라고 한다. 바람직한 변화임은 분명하나, 그만큼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하긴 학생식당 외엔 학교 안에서 갈 곳이 변변찮던 과거와 달리, 이젠 대학 캠퍼스마다 값비싼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입점해 있다.
인기 편승해 지원대상 2배 늘려
민생고·지방대 위기부터 살펴야
그나마 ‘천원의 아침’마저 재정 여건이나 동창들의 기부 사정이 괜찮은 학교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수많은 지방 대학들한테는 ‘언감생심’이라고 한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지역 교육대학의 교수는 “학생 수가 줄어 원래 세 곳이던 학생식당 입점 업체가 한 곳으로 줄었다”며 “그것도 워낙 자주 바뀌어 우리 학교는 이런 지원사업 신청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에 대한 호응이 뜨겁자 이달 초 지원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데다, 어느 여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밥 한 공기’를 비우면 쌀값 폭락과 여성들 다이어트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니,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나무랄 이유는 없다. 다만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제도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열악한 지방대학 문제나 민생고에 대해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천원의 아침’에 대한 열광 역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