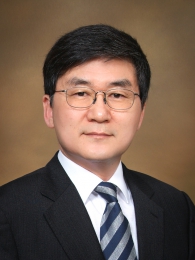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29호 2022년 4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누가 누구에게 불편을 끼치나
누가 누구에게 불편을 끼치나

김희원
인류89-93
한국일보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십수 년 전 발목을 삐어 깁스를 한 채 밥솥을 사러 간 적이 있다. 목발을 짚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세상과 반목했다. 도착 직전에야 불이 깜박이는 것을 보고 부지런히 가도 어김없이 누군가 문을 닫은 뒤였다. 반복되니 야속하고 억울했다.
30여 년 인생을 살고 처음으로 장애인 처지를 공감했다. 보이지 않는 벽 속에 혼자 갇힌 느낌이었는데 장애인은 평생 이런 불편과 무시 속에 살 것이란 생각에 미안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간 살았을 때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훨씬 많이 보았다. 한국에선 안 보이는 걸 그저 당연시했던 것이다. 더 놀랐던 건 그들을 대하는 캐나다인의 태도다. 버스는 인도에 바짝 붙어 서서 차체를 낮추고, 휠체어든 유모차든 타서 고정할 때까지 모두 불평 없이 기다린다. 한번은 전철에서 한 승객이 내리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을 건드렸던 모양이다. 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며 “Sorry, man”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중한지 나는 그의 인생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싶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공연한 공격과 비난으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일부 시민의 입에선 “경찰은 안 잡아가고 뭐하고 있나”, “세금으로 지들 먹여 살리면 고맙습니다, 할 것이지” 같은 험악한 말이 나오고 혐오 분위기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당 대표가 혐오의 메시지를 던지면 소수자를 차별하고 비난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한다. 직접적 공격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회사에 늦는 게 큰일이라면 출근은 커녕 외출도 엄두 못 내는 현실은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어쩌다 한번 겪는 불편에 화가 날진대 평생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묵살 당하고 살아온 삶은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장애인들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위를 한다. 그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 헌법이 적용되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권리 없는 삶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자 또한 같은 시민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발언은 그들을 시민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