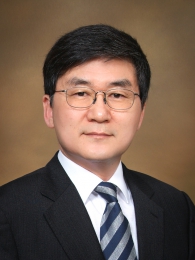[525호 2021년 12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좋아서 하는 일
임석규 한겨레 문화부 선임기자·본지 논설위원
좋아서 하는 일

임석규
언어84-91
한겨레 문화부 선임기자·본지 논설위원
직책을 바꿔 현장 기자로 복귀했다. 기자 초년부터 늘 하고 싶던 공연 담당 기자다. 고전음악 분야를 맡다 보니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연장이 취재 현장이다. 좋은 공연 자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들 한다. 평소 고전음악을 즐겨 들었으니 몰입해 감상하는데, 원래 취미도 일로 하면 피곤한 법이다. 하루 저녁에 5시, 8시 공연 프로그램을 잇달아 관람해야 한 적도 있다. 어쨌거나 좋아서 하게 된 일이니, 오랜만에 돌아온 현장이 더없이 소중하다.
예술의전당 동편 언덕배기엔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이 있다. 최근에 ‘엔(N) 스튜디오’라 불리는 그곳을 취재했는데 음악 전공자가 아닌 처지에서 신기한 경험이었다. 작곡가의 창작곡 악보 초고를 놓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처음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작곡가가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하는 ‘오케스트라 리딩’ 현장이었다. 작곡가도, 지휘자도 30대 초반이었다. 현대에 창작되는 고전음악만큼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받는 예술 장르는 드물 것이다. 당대인들의 무심한 눈길을 견디며 현대음악에 열정을 쏟는 젊은 음악인들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대중의 환호와 거리가 멀다는 점은 고음악도 마찬가지다. 수백 년 전의 서양 음악을 당시의 악기로, 그 시대 작법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일에 열렬한 애호가 아니면 큰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내 고음악 연주자들과 연주단체는 늘어나고 있다. 고음악에 빠져드는 젊은 음악인들도 드물지 않다. 춘천에서는 벌써 24년째 해마다 고음악축제가 열리고 있다.
예술이 대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만 열매 맺는 건 아니다. 바흐의 마태수난곡, 첼로모음곡도 한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야 재발견돼 진가를 인정받았지 않았던가.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맷집과 지구력을 시험받고서야 비로소 고전 반열에 드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만난 현대음악, 고음악 종사자들에게 ‘왜 하느냐’고 질문을 던져봤다. 대답은 같았다. “좋으니까, 안 하면 죽을 거 같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