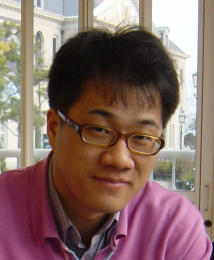[503호 2020년 2월] 오피니언 녹두거리에서
녹두거리에서: 여덟 살짜리 은인에 대하여
설재인 소설가
여덟 살짜리 은인에 대하여
설재인
수학교육08-12
소설가, 아마추어 복서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다. 발레리나처럼 풍성하게 퍼지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날이었다. 담임은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툭하면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 아이들을 회초리로 마구 때렸다. 그게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겠다 말도 못한 채 참고 또 참다 결국 일을 벌이고 만 것이었다.
간신히 붙잡고 있던 끈이 툭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순간, 아, 이제 나의 모든 학교생활은 시쳇말로 ‘개망했’구나, 하는 체념이 찾아왔다. 그리고 연약한 자유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울음이 함께 터져 나왔다. 뜨끈한 것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나무로 된 마룻바닥으로 주르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문자 그대로 ‘앙앙’ 울었다.
아무리 담임이 엄하다 한들 그 자리에서 짓궂게 놀리지 않고 배길 수 있는 아이가 있었을까(나는 성악설을 믿는다). “어, 오줌 쌌다!”하는 말이 터져 나오고 교실이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르르 주위로 몰려들었다. 더러운 오줌을 밟진 않으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려다 보니 내 자리를 중심으로 커다란 원 하나가 생겼다. 나는 울면서, 교탁을 떠나 걸어오는 담임을 보았다. 눈물 때문에 그의 표정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우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에겐 말로 맞고, 담임에겐 회초리로 맞는 하루가 될 터였다. 콱 죽고 싶었다.
그때 짝꿍이 외쳤다. “이거 물이야!”
모두 일제히 걔를 바라보았다. 나까지도. 그 애는 다시 말했다. “내가 물통을 쏟았어!”
그럴 리가. 아무리 마룻바닥이 짙은 나무색이어도 투명한 물과 싯누런 오줌은 쉽게 구분이 간다. 게다가 어디선가 냄새도 솔솔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나 아이들은 누군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는, 더럽고 가소로운 오줌싸개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급격히 놀림에 흥미를 잃곤 투덜대며 하나둘씩 자리로 돌아갔다. “아닌데… 물 아닌 것 같은데…….”라고 주워섬기면서. 그 애가 그렇게 주장하니 담임 또한 나더러 오줌을 쌌다고 혼내기 머쓱했던 걸까. 그는 짝꿍더러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럼 물을 흘린 네가 저걸 걸레로 다 닦아내라고. 그리고 그 애는 그렇게 했다. 그동안 나는 울먹이며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겁만 잔뜩 집어먹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않은) 채로.
그 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생각한다. 2학년을 마치고 다른 지방으로 전학을 갈 때까지 나의 초등학교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고 내 편이 되어준 짝꿍의 이름을. 그러나 그 이름 석 자는 야속하게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기억 저편으로 멀리 날아가 버려서, 인터넷이며 SNS가 이토록 발달한 시대에도 나는 걔를, 내 생의 첫 은인이라 할 법한 친구를 결코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인간관계의 유지엔 절망적으로 소질이 없고 기억력마저 좋지 않은 터라, 은인들을 자주 잊곤 한다. 정말이지 몹쓸 습관이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서운해 할지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곤 한다.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그때 걔를 어려움에서 구해낸 게 누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어디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을 상상을 하면 무릎을 꿇고 진짜로 미안하다고 빌고 싶은데, 동서남북 중 어디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도 통 모르겠다.
그 대신, 나의 은인됨에 대해 다짐한다. 분명 살면서 나도 아주 드물게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가 내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아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진 말자고 다짐한다.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선의를 베푼 후엔 쿨하게 휙 돌아서서, 그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모두 잊어버리자고 다짐한다. 마치 마룻바닥을 모두 닦아낸 후 내가 전학을 갈 때까지 단 한 마디도 그 일에 대해 꺼내지 않던 나의 짝꿍처럼. 그것이 내가 그 애에게, 그리고 내가 미처 챙기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은인들에게 작게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여덟 살짜리 은인보다 스물네 살을 더 먹어 서른둘을 맞은 해의 시작에서야 그런 생각을 한다. 부족하게도.
*설 동문은 모교 졸업 후 특목고에서 수학 교사 생활을 하다 돌연 퇴직해 작가로 전향했다. 취미로 복싱을 즐기며 스스로를 무급의 복싱 선수이자 작가라고 일컫는다. 첫 단편소설집 ‘내가 만든 여자들’이 이주 노동자, 왕따, 성폭력, 내부고발, 여성 서사, 페미니즘 등 뜨거운 이슈를 담아 화제가 됐다. 최근 에세이 ‘어퍼컷 좀 날려도 되겠습니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