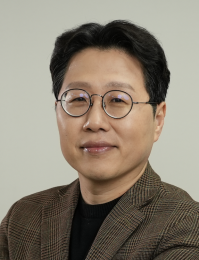[491호 2019년 2월] 기고 에세이
녹두거리에서: 1990년 스티븐 호킹 서울대 강연에 갔더라면…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칼럼
녹두거리에서
1990년 스티븐 호킹 서울대 강연에 갔더라면…
강석기
화학87-91
과학칼럼니스트
지난해 3월 14일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학부 4학년이던 1990년 어느 날이 떠올랐다. 1988년 출간된 호킹 박사의 책 ‘시간의 역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호킹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1990년 9월 한 잡지사의 초대로 호킹 박사가 방한했고 서울대에서 ‘우주의 기원’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한 것이다.
이날 호킹 박사를 보기 위해 학생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도 처음에는 강연을 들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캠퍼스가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을 보고 포기했다. 멀리서나마 호킹 박사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꺼리는 습성이 이긴 셈이다.
그런데 수년 전 호킹 박사의 자서전 ‘나, 스티븐 호킹의 역사’를 읽다가 ‘그때 강연 현장에 있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뒤늦게 찾아왔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일명 루게릭병)으로 사지가 마비된 건 물론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호킹 박사가 블랙홀과 관련한 놀라운 연구를 해냈다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지만, 1990년 갓 스무 살을 넘은 나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인간승리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나이 마흔을 훌쩍 넘어서 호킹의 자서전을 읽다 보니 인간 호킹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호킹은 옥스퍼드대를 졸업할 무렵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자서전에서 호킹은 “내가 불치병에 걸렸고 몇 년 안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깨달음은 꽤 충격적이었다”고 쓰고 있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그럼에도 호킹은 열심히 연구를 했고 제인 와일드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했다. 물론 몸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고 발음도 점점 불명확해졌다. 이 장면을 읽기 전까지는 ‘루게릭병에 걸리면 5년 정도 산다는데 호킹 박사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물리학에 호킹이 있다면 생명과학의 살아 있는 전설은 1953년 DNA이중나선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일 것이다. 2010년 나는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게놈 관련 한 컨퍼런스를 취재하러 갔다가 당시 82세인 왓슨을 직접 봤다. 하버드대 유전학자 조지 처치 교수가 주관한 이 컨퍼런스에는 당시까지 게놈을 해독한 26명 가운데 13명이 초대됐다. 이 가운데 2007년 두 번째로 게놈을 해독한 왓슨과 2009년 한국인 최초로 게놈을 해독한 김성진 가천의대 교수도 있었다.
그의 책 ‘이중나선’에서도 드러나듯이 왓슨은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날도 함께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듀크대 미샤 앵그리스트 교수와 한판 붙었다.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진 모르겠지만 왓슨이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온 주제에…”라는 식의 말을 했고 앵그리스트가 “이 인종차별주의자 같으니라고…”라며 맞받아쳤다. (왓슨은 2007년 한 인터뷰에서 “흑인은 지능지수가 낮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39년간 몸담았던 콜드스프링하버연구소를 떠났다.) 수백명의 청중이 보는 앞에서 노인과 중년 사내가 얼굴이 뻘게져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고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인 처치 교수가 중간에서 이들을 말리느라 쩔쩔매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아무튼 사태는 수습됐고 오전 일정이 끝났다. 몇몇 사람들이 왓슨을 찾았고 나도 김성진 교수를 따라가 왓슨과 몇 마디를 나눴다. 두 사람은 김 교수가 미 국립보건원(NIH)에 있을 때 알고 지냈다고 한다. 짧은 담소를 나눈 뒤 김 교수는 왓슨과 함께 한 사진을 찍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사진을 찍어준 뒤 ‘저도 좀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려다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오전의 소동도 떠올라 관뒀다.
그런데 그날 오후를 보내며 이때 왓슨과 같이 사진을 찍지 않은 걸 후회했다. 행사는 오전에 끝났기 때문에 왓슨은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6시 반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표를 듣고 궁금한 게 생기면 아이처럼 손을 번쩍 들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왓슨의 미성숙함이 대인관계에서는 단점일지 몰라도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 호킹의 서울대 강연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한 것만큼이나 2010년 왓슨과 기념사진을 찍을 기회를 놓친 게 두고두고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