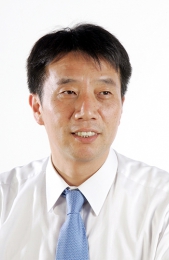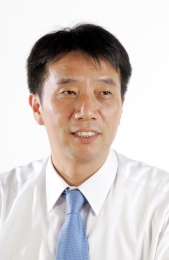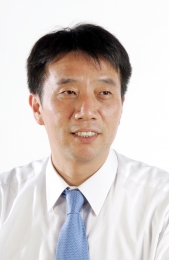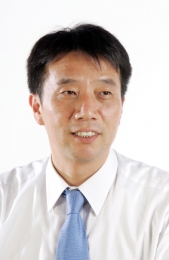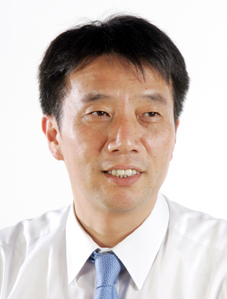[469호 2017년 4월] 오피니언 관악춘추
2017년의 '80년대식 충돌'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장, 본지 논설위원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장, 본지 논설위원
5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야당 후보가 지난 1월 자신의 집권 구상을 담은 대담집을 냈다. 필자는 그 책을 읽으며 1980년 대학교 새내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당시 접했던 대학 신입생 의식화 서적과 너무나 분위기가 비슷했다. ‘친일세력이 심판받지 않고 독재세력과 붙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면서 ‘우리 삶을 억압해 온 낡은 구조들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하는 대목이 특히 그랬다. 세계 10위권 국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30여년 전 운동권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다니, 이런 리더십으로 2020년대 대한민국을 덮쳐올 시대적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해 왔다.
문득 10년 전쯤 일이 떠올랐다. 신문사 정치부 정당팀장이었던 필자가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에서 후배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옆 좌석 대학생들이 주고 받는 대화 속에 “이거 왜 이래, 386처럼…”이라는 대목이 귀에 꽂혔다. 후배에게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야유”라고 해석해 줬다. 필자가 바로 ‘80년대 학번이자 60년대 출생’인 386세대다. “20대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다리 취급하는구나” 싶어 서글펐던 기억이 난다.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더 진화해 오지 않았겠나, 그러니 요즘의 20대는 1980년대 운동권 논리를 구석기시대 유물 취급하지 않겠느냐 짐작했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됐다. ‘80년 서울의 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때 그 풍경을 2017년 서울대 캠퍼스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3월 11일 서울대 본관에서는 80년대 거리 투쟁을 방불케 하는 격전이 치러졌다. 총장실을 점거하고 장기 농성을 벌여온 학생들과 이들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기습작전을 벌인 학교측이 충돌했다. 학생들은 소화기 가루를 뿌리며 반발했고 학교측은 그런 학생들을 향해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렸다. 흡사 최루탄 가루와 물 폭탄이 뒤범벅이 된 민주화 투쟁 현장을 보는 듯했다.
서울대생들은 새로 만드는 시흥 캠퍼스 이전 반대를 위해 장기 점거 농성을 벌여 왔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신군부 군화발에 맞서 짱돌을 들어야 했던 80년대 대학생들을 흉내내야 할 만큼 절박한 사유였을까. 서울대 캠퍼스의 ‘80년대식 충돌’은 대선 유력 후보의 ‘80년대식 문제의식’ 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