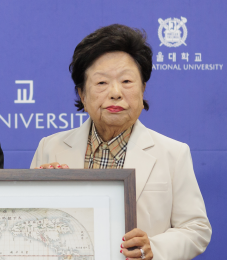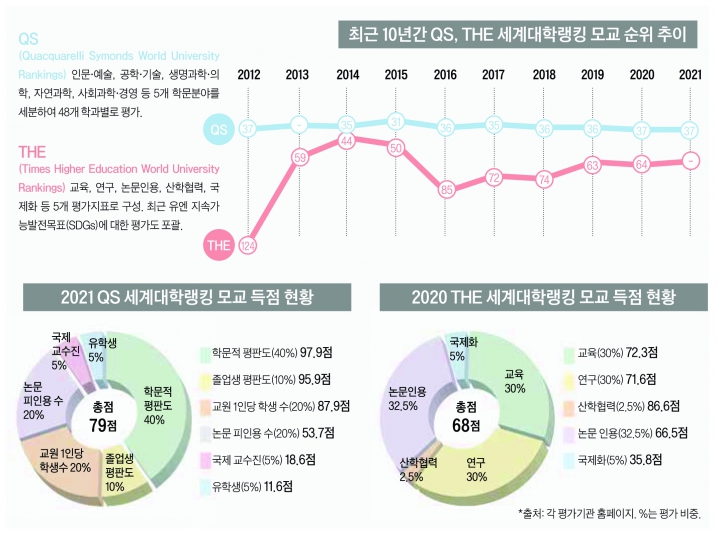[458호 2016년 5월] 오피니언 동문기고
대학, 이대로 좋은가?
조장희 차세대융합기술硏 특임연구위원
조장희(전자공학55-60) 차세대융합기술硏 특임연구위원·미국 학술원 회원 및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2016년 3월 2일자 모 일간지에 서울대에서도 젊은 교수 20명에 연 1억씩 10년 지원해 노벨상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을 들어 “아, 이제는 우리 대학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 기회에 이에 더해서 몇 자 더 적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아직도 대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대학은 학자들이 모여서 학문 연구를 하는 곳이다. 정치나 사회문제를 좀 뒤로 하고 10년 20년 후에나 알아줄까 말까 한 연구를, 또 잘 알아주지도 않는 연구를 하는 곳이다. 우리 학생들은 그들 바보같이 연구하는 교수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배우는 곳이다. 영국의 캠브리지가 그랬고 미국의 하버드가 그런 곳이다. 노벨상은 극히 드문 예를 빼고는 좋은 연구를 한 후 30년 40년 후에나 탈 수 있는 학문 연구의 꽃이지만 노벨상을 위한 연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연구가 30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한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대개 70~80대이면서 그들이 30~40년 전에 한 연구를 인정 받아 상을 타게 됨으로써 “아, 30대에 모두 노벨상 연구를 했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노벨상을 타기까지는 몇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30~40년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이 그때쯤이면 나이가 들어서 이미 타계했으므로 상을 탈 수 없게 된다. 노벨상은 살아 있는 사람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30대 때 연구가 노벨상을 탄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학문 연구는 나이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정년이라는 제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며 오히려 이들 연구경력을 더 우대하고 또 백분 활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1960~70년대에 비해서 20년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라는 사슬에 묶여 수많은 유능한 교수와 연구자들이 학문연구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문 분야 역사가 짧고 경력 있는 학자와 연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연구중심대학(하버드나 컬럼비아대학 같은)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학문에 대한 전통이 없는, 학문의 역사가 짧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학문을 일으키고 또 이어가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훌륭한 학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또 이를 통해서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연구’와 같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새로운 학문의 연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난 후에 남이 할 수 없는 아직도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도전이고 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원자나 핵물리 또는 요사이 많이 알려진 입자 물리의 대명사 ‘힉스’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투자로 수십년을 연구한 결과이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필자가 다녔던 스웨덴의 웁살라대학은 1960년대에 벌써 당시에 몇 안 되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지하 50m 깊이에 설치해 놓고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는 뒷산에 수천명이 연구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핵물리 연구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학의 ‘Big Science’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학이 되려면 세계적인 학자들의 집합체를 이뤄야 한다. 이어서 이들을 통한 ‘Big Science’가 이뤄지고 이 속에서 많은 젊은 학생과 학자들의 30~40년 후에 노벨상을 탈 연구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교단에서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 대학의 임무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대학이 될 수 없다. 대학은 학자가 모여서 학문의 연구를 하는 곳이다. 유럽이나 미국 대학들의 힘은 바로 세계의 석학들을 모셔오고 또 이들이 시간과 제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데에 있다.
끝으로 우리가 20명에 1억씩 10년을 투자해서 노벨상을 타겠다는 계획으로 20년 후에(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일의 경우 한 명이라도 노벨상을 탄다면, 우리는 그때 겨우 컬럼비아대학의 100분의 1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없고 실효성 없는 계획을 서울대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BK21도 해 봤고, WCU(World Class University), 기초과학연구 프로젝트(IBS)도 해 봤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BK21은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기 전에 국내 대학 교수들이 나눠 가졌고, WCU 역시 학문연구의 기본 취지를 몰라서 노벨상급 학자들을 모셔다가 강의만 시키다 그만뒀고, IBS는 무조건 100억씩 나눠 주는 식의 획일적인 연구비 분배로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면서 연구계의 대혼란을 일으킨 ‘획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홍콩 대학이나 싱가포르대학처럼 할 수 없을까? 세계의 분야별 리더들을 영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Big Science’를 일으키도록 하여 젊은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제일 급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 20~30년 후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줄 세계적인 리더급 학자들을 제대로 영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계속 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가 기득권 지킴이나 대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끝으로 필자가 몸담았던 컬럼비아대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컬럼비아대학에서는 정교수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데 그 자격은 세계적으로 그 분야를 일으킨 학자를 모셔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내부에서의 승진은 그리 많지 않다. 이 간단한 원칙(Academic Principle)은 연구중심대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를 100명이나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교수임용 및 영입관례는 좋은 예로서 우리 서울대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