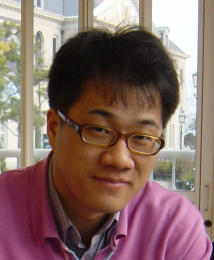[457호 2016년 4월] 기고 에세이
녹두거리에서 : 부디 굶지 마시길
조용호(신문81-85) 소설가·세계일보 문학전문기자
부디 굶지 마시길
조용호(신문81-85) 소설가·세계일보 문학전문기자
‘천원의 아침식사에 이어 ‘천원의 저녁식사가 시작됩니다’
사진부에서 전송해 온 ‘렌즈로 보는 세상’ 사진에는 뜻밖에도 서울대 학생회관식당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가 클로즈업돼 있었다. 바쁘고 주머니 얄팍한 학생들 아침밥 먹이기 운동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학생회관 식당 B메뉴를 1,000원으로 내린데 이어 저녁 식사도 학생들에 한해 1,000원에 제공한다는 알림막이었다. 신문 주말판에 사진기자가 찍어온 사진 아래 자유롭게 설명을 붙이는 게 내 업무 중 하나다. 백일장 대회에 나가 주제가 주어지는 대로 무조건 칸을 메워야 하는 처지와 같아 매주 곤혹스러웠는데 눈을 감고도 식당 내부를 환하게 그릴 수 있는 그 시절 그곳 사진이어서 사뭇 감회가 컸다.
그 시절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들이 많았다. 매달 하숙비를 송금받을 정도라면 그래도 꽤 지원을 받는,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 축에 끼었다. 자취생들이 매일 숙소에서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기는 힘든 일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식당에 신세를 많이 졌다. 동아리 방에서 어쩌다 동료나 선후배들이 싸온 도시락을 발견하면 서랍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 전투적으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바닥이 나곤 했다. 도시락 싸 온 이들은 짐짓 하소연을 하면서도 큰 불만을 내비치진 않았다. 그들끼리 치를 후속 이벤트 때문이었을까. 이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위장을 다스릴 다음 장소는 학생회관 식당. 한 녀석이 400원짜리 백반 식권(라면은 150원, 계란라면은 200원, 짜장면 200원)을 하나 사서 배식을 받아오면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달려들었다. 돌아가면서 빈 식판 들고 배식구 아주머니들 앞에서 머리를 살짝 조아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빈 식판이 채워지곤 했다.
사진에서 촉발된 그 시절 학생회관식당에 얽힌 추억은 더 있다. 그 식당은 아크로폴리스 옆 캠퍼스 중심부이고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는 장소여서 시위의 발화 지점으로 곧잘 이용되기도 했다. 내 데뷔작인 단편소설 ‘베니스로 가는 마지막 열차’에도 이곳 식당이 나온다. 그 졸고의 일부는 이렇게 흘러간다.
‘학생회관 식당 창가에 앉아 홀로 점심을 때우려는 순간, 한 학생이 메가폰을 들고 식탁 위로 올라서서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파쇼 타도! 살인마를 때려잡자! 수십 장의 전단이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순간 식당 밖 광장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비명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학생들 사이에 섞여 있던 일군의 사복조가 메가폰을 든 남학생을 덮쳤다. 순식간에 주변학생들과 사복조들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바깥에선 전경들의 군화발 소리가 뛰어오고 있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습기찬 봄 공기를 뒤흔들면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무전기의 잡음들이 전쟁터의 총소리처럼 요란했다.’
돌아보면 그 시절 먹는 것에 대한 시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당시 시대 분위기의 저변에는 ‘밥이 하늘’이라는 기층정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지배하던 시절, 먹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숭고한 가치로 무의식에 심어졌던 것 같다. 요즘은 밥값 때문에 아침 저녁을 굶는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바쁘다는 핑계, 체중 관리의 필요성들이 훌쩍 식사 시간을 건너뛰게 만들거나 다른 간식거리들이 배를 대신 채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1,000원짜리 식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성세대의 태도,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관심 환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날 나는 사진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부디 여러 핑계로 굶지는 마시길. 예부터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풍경만큼 더 흐뭇한 일은 없다던 부모들 마음, 헤아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