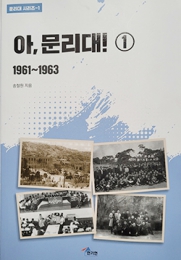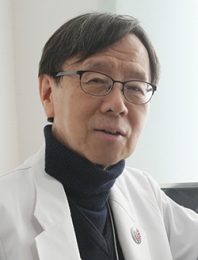[452호 2015년 11월] 기고 에세이
동숭로에서 : 옛 문리대 캠퍼스의 명물 디오게네스 형은 어디에?
정소성(불문64-69) 소설가·단국대 명예교수
옛 문리대 캠퍼스의 명물 디오게네스 형은 어디에?
정소성(불문64-69) 소설가·단국대 명예교수
대학을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은 것 같다.
그러자니 자연 대학생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서 가물거린다. 대부분의 기억은 망각되었거나 흐릿해져 버린 것 같다.
수 개월 전 어느 신문사에서 서울대 문리대에 대해서 추억담을 써달라고 하여, 담당 기자와 함께 사진 기자를 데리고 옛 캠퍼스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옛 캠퍼스 터를 찾아간 나의 첫 느낌은 ‘허무’였다. 당시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느낌이었다. ‘예술가의 집’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는 본부건물만이 눈에 익었을 뿐이었다.
그나마 교정에 마로니에가 그대로 서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이런 허무감을 부채질하는 것은, 이 터에 존재했었던 문리대가 관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아주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옛 문리대 출신 혹자는 이름만 인문대학으로 바뀌었지 대학은 그대로 살아있다고들 하지만, 자위적인 이야기이고 엄연히 다른 대학이다.
문리대가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이름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나.
문리대 터에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자의적인 이야기이다. 마로니에나무와 본부건물 이외에는 상가로 변하거나 새로 지은 다른 용도의 건물로 대체되어버렸다. 이나마 해당 행정청인 동대문구에서 힘써서 간신히 가능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기야 없어진 대학의 옛 강의동을 보존할 이유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과 헤어져서, 허무감에 가슴이 짓눌려, 마로니에 아래 벤치에 앉았다.
남들은 백년 넘은 캠퍼스를 자랑하는데, 모교라고는 꼴도 없이 사라졌으니 어찌 허무하지 않으랴. 하기야 이런 느낌은 문리대만의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 모든 단과대학의 공통의 것이리라. 강의동의 터만 바뀌었지 대학의 체제는 그대로인 대학은 그나마 덜할지도 모르겠다.
문리대는 강의동도 그 터도 체제도 다 없어진 것이다. 부질없는 소리지만, 문리대 옛터를 상가로 불하하여 얼마나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여기 이 터를 그대로 서울대의 소유로 남겨놓아 꼭 문리대가 아니더라도 문리대 일부와 대학원, 그리고 연구단지로 전용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이 조성된 좁은 광장 한 귀퉁이에 옛 문리대 강의동들의 모형도가 서 있어서 한결 허탈감을 부채질했다. 무슨 갑각류동물의 허물처럼 느껴졌다.
마침 기이하게도 이런 지독한 허탈감과 허무감을 뚫고 떠오르는 한 사람 문리대인의 모습이 있었다. 철학과에 다니던, 존함은 잊어버렸지만, 별명이 디오게네스라는 분이었다. 한여름철에도 두터운 겨울 오버코트를 입고 다녀서 붙은 닉네임이었다. 2, 3년 선배였다는 기억이다. 당시로서는 드물던 등단한 시인이었다.
나는 이분이 왜 오뉴월에 겨울 오버를 입고 다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나고 겨우 십년이 막 지나고 있을 무렵이라, 학생과 교수들이 퍽 가난하였다. 교복을 사입은 학생들이 드물었고, 대부분이 가까운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들인 군복을 사 입고 군화를 사 신고 다녔다.
특히 시골서 올라온 학생들은 잠 잘 데가 없어서 대학의 강의실에서 누워자기가 일쑤였다. 디오게네스나 필자나 입주가정교사 자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강의실 신세를 지곤 했다. 강의실에 스민 냉기를 녹이려고 겨울 오버를 입고 다닌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디오게네스 형과 친해질 수 있었다. 교수님들도 월급으로는 반 달밖에 견디지 못하였고, 나이 차이가 적은 아들을 둘 둔 교수님들은 등록금 때문에 교차적으로 입대를 시키는 것이 정석이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흐릿한 망각과 상실감 저 너머 기이하게도 생존여부를 알 수 없는 문리대 명물 철학과 디오게네스 형이 겨울 오버를 걸치고 마로니에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를 쓰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형도 모교처럼 사라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