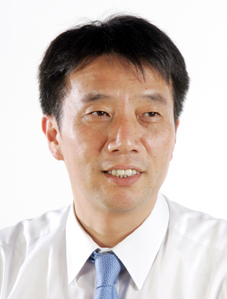[448호 2015년 7월] 오피니언 느티나무광장
민폐보다 내 편의를 앞세우면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본보 논설위원
서울 강남에서 자택 격리된 50대 여성은 지방에 내려가 골프를 치다 강제 귀가조치를 당했다. 이유를 물으니 “답답해서”라고 했다. 이 여성의 개인 정보가 SNS로 확산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일부가 연쇄 휴업해야 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여성에게 의료진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환자도 보호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들어온 후 열이 오르며 가래가 끓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추적해 보니 삼성병원 응급실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은 폐쇄됐고, 의료진, 직원 등 70여 명이 격리 조치됐다.
메르스에 감염된 아버지를 병문안했던 40대 남자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에 출장갔다. 입국 심사때는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남자와 접촉했던 중국인 35명이 격리당했다. 한 사람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한국은 졸지에 “미개한 나라”로 격하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식, 장례식을 비롯해 회식에까지 참석했고, 심지어 공중 목욕탕까지 다녀온 대구 공무원도 있었다. 목욕탕은 며칠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그와 직간접으로 접촉한 6백여 명이 격리, 감시, 정보제공 대상이 됐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부족할 정도다.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필자는 솔직히 보건당국이나 삼성 서울병원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화가 난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것이 무능(無能)보다 더 흠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파악해 잠재 감염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보건 당국의 책임이지만, 그 경로를 지나쳤던 국민 개개인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망은 뚫리게 마련이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 넣는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메르스 사태에서 불거진 일부 몰지각한 행태를 보면서 새삼 일본의 ‘메이와쿠(迷惑) 문화’를 떠올리게 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되레 “폐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가르침부터 듣게 되는 국민과 민폐(民弊)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편의(便宜)만 챙기는 국민, 양쪽 국민들이 공동체 대 공동체로 경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렵사리 과거사 갈등을 봉합지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런 질문이 머리를 맴돌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