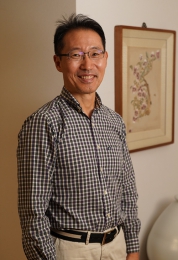[528호 2022년 3월] 문화 나의 취미
“영화 ‘서편제’ 네 번 보고 삶이 달라졌다”
17년째 판소리 삼매경 민일영 (법학74-78) 전 대법관
“영화 ‘서편제’ 네 번 보고 삶이 달라졌다”
17년째 판소리 삼매경 민일영 (법학74-78) 전 대법관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초장 아니다….”
포털사이트 동영상 카테고리에 민일영 전 대법관을 검색하면 유독 한 영상이 튄다. 7년 전, 대법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국립국악원 국악콘서트에 출연해 흥보가의 ‘화초장’ 대목을 부르는 영상이다. 법복 대신 한복을 입은 그가 놀부 심보 장황하게 읊다가 거들먹대는 놀부 마누라 걸음걸이를 흉내내니 객석은 웃음 만발이다. ‘판소리하는 대법관’ 별명 떼고 은퇴한 지금도 판소리에 정진하는 그를, 3월 3일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났다.
“해학적이라 흥보가를 좋아해요. 제일 맘에 드는 대목이 화초장입니다. 처음엔 무슨 ‘장’이 그리 많은지, 외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계속 부르니 입에 붙더군요. 소리 해보면 몸으로 알게 돼요. 이게 그야말로 내 음악이고 조상들의 정서와 혼이 녹아 있다는 걸.”
영화 ‘서편제’가 히트친 1993년 판소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법원 민사실무연구회 연말 특강에 임권택 감독과 배우 오정해씨를 초빙한 적 있다. 연구회 간사였던 그가 영화를 네 번이나 보고, 지리산에서 촬영 중인 임권택 감독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어렵사리 성사됐다. ‘소리 좀 들려달라’는 요청에 오정해씨의 난감한 표정이 지금도 역력하다. “지금은 나도 고수 없이 소릴 안 하지만 그땐 뭘 알았나요. ‘1고수 2명창’이라 하죠. 상청(고음)과 하청(저음)을 넘나들 때 고수의 장단이 뒷받침을 해줘요. 사정사정해서 해 주셨는데, 다음에 민사지법 특강 부탁할 땐 김명곤 고수까지 모셨죠. 판소리 사설을 정리해서 조그만 프로그램북도 만들고요. 임 감독님이 이런 강연 처음이라며 감동한 눈치예요. 오정해씨는 판소리 안 배워보겠냐고 하더군요.”
마침 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 실행 못하고 8년이 흘렀다. “이젠 정말 배워야겠다” 싶어 찾아간 민요판소리 동호회. 저녁 걸러가며 연습하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밥 먹고 소리만 하는 ‘산공부’도 했다. 일에 치여 잠시 놓았을 때도 마음속엔 검질기게 소리를 품고 살았다. “원랜 음악하고 담을 쌓았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다는데 누군지 몰라 외계인 소릴 들었죠. 술자리에서 노래 시키는 게 고역이었고요. 소리 하고 나선 자신있게 단가 한 곡은 불러요.”
동호회서 시작, ‘산공부’까지
“흥보가 완창해보고 싶다”
법전 가득한 책장에서 그가 빼온 책은 소리꾼마다 ‘다른 버전’으로 부른 춘향가 사설 모음집. 바쁜 대법관 시절에도 책상에 놓고 틈틈이 뒤적였다. 고어 가사도 어렵지만 판소리는 ‘이면(裏面)’을 살리는 게 관건이라 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우리 소리의 매력이죠. 소리를 할 때 인물의 입장에 녹아드는 게 이면이고요. 개인사와 배경을 헤아려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소리꾼은 방성통곡하는 쑥대머리 후반을 눈물 쏙 나게 부릅니다. 춘향가 이별 대목은 내가 춘향 되어 몽룡을 사랑하는 듯 불러요.”
판소리 배우는 데 필요한 건 다름아닌 용기. 국립국악원, 한국국악협회, 동호회 등 가르쳐주는 곳이 많다. 일반인은 30분만 해도 목이 쉬니 수업도 길어야 1시간 내외다. ‘사랑가’, ‘쑥대머리’, ‘박타령’ 같은 몇 분짜리 눈대목 하나를 두어 달 공들인다. 민 동문은 요즘 한국국악협회 성동지부 강승의 명창에게 주 1회 개인 레슨을 받는데, 엄두를 못 낼 정도로 판소리 레슨이 고가는 아니라고 했다. “대중가수에게 몇백만원 주는 건 안 아까워 하면서, 국악인 부르면 몇십만원 주는 것도 아까워 해요. 소리꾼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움도 내비쳤다.
러너가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꿈꾸듯, 소리 하는 그의 목표는 ‘흥보가’ 완창. “10분짜리 ‘제비노정기’를 작년 가을부터 배우고 있으니 4시간짜리 완창은 언제 하겠느냐”면서도 ‘완창하게 되면 꼭 소식 전해달라’는 말에 슬몃 미소를 지었다. 청주지법원장 시절, 법원에서 지역민을 위한 국악 공연을 열었다가 얼떨결에 무대에서 ‘화초장’ 불렀던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한다. 당시 지역 주민 사이 팬카페도 생겼다.
판소리는 사실 그의 다종다양한 일상 중 ‘한 대목’이다. 묵향에 빠져 서예전을 열었고, 등력은 그간 다닌 국내외 산행을 엮어 네 권 분량의 책이 나올 정도. 주말엔 탑골공원 노인 무료급식소에 나가 밥을 푼다. “아직까지 저 따라 소리를 시작한 사람은 없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겁들을 내요. 후배 법관들에게 늘 ‘판결 쓰고 사건 기록 보는 데만 빠져 살지 마라, 남의 일 처리해준 것일 뿐 나이 들어 나한테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다지만 시간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겁니다. 획 하나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죠.”
인터뷰는 촬영을 위해 부채를 쥔 그가 능수능란 발림(몸짓)을 하다 ‘판소리 마무리 자세’라며 부채와 팔을 쫙 펴 보이는 것으로 끝났다. ‘부르는 건 무리더라도, 올봄엔 판소리 들어나 볼까’ 싶은 마음을 읽은 듯 그가 말했다. “소리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저도 처음엔 매달 국립극장에 드나들었죠. ‘얼씨구’든 ‘잘한다’든 상관 없어요. 판소리는 소리꾼과 관객이 한몸 돼야 흥이 나는 것이니, 추임새 맘껏 넣어 보세요.”
박수진 기자
▽민일영 전 대법관의 '화초장' 공연 보기
박수진 기자
▽민일영 전 대법관의 '화초장' 공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