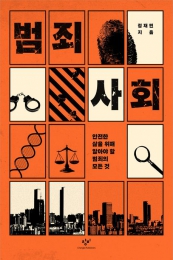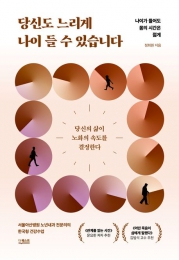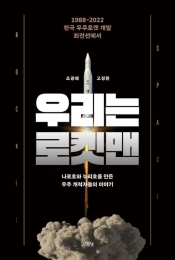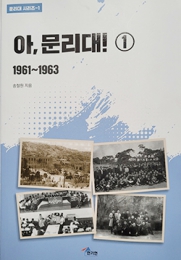[514호 2021년 1월] 문화 신간안내
화제의 책: '엄마의 마지막 말들'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박희병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음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엄마의 마지막 말들
박희병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창비
‘반소매 입고 안 춥나?’
호스피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반팔셔츠를 입고 병원을 찾은 아들의 걱정부터 입밖에 냈다. 때로는 배고플까, 잠 못 잘까 염려하는 말을 앞세웠다. 말기암과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을 앓으며 독한 약기운으로 흐린 정신에도 그 말들은 또렷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돌이켜본 아들은 새삼 느낀다. “이 세상에 내게 이리 말할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 ‘엄마의 마지막 말들’은 그 아들, 박희병(국문75-7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어머니 임갑연씨의 말들을 기록한 책이다. 고전문학과 예술사를 연구하며 연암 박지원과 문인화가 이인상 등에 대한 저서를 낸 그는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 1년간 휴직하고 간병에 매달렸다. 사모곡이자 간병일기이고, 죽음의 의미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실까지 짚어낸 인문서다.
길어야 두세 문장, 혹은 외마디 외침. 단시(短詩)와 같은 어머니의 말에서 인문학자답게 의미와 은유를 찾아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인지장애를 앓는 어머니의 말은 때때로 두서없고,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상경한 지 오래여서 한동안 쓰지 않던 고향 사투리도 병상에서 돌아왔다. 남들은 그저 맥락을 잃은 발화로 치부했지만 아들은 그 말들에서 당신이 지금 머무르고 계실 어딘가를 헤아렸다.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소녀 시절 고향으로 돌아가 계시리라 생각했고, ‘연탄불 갈아야 한다’ 느닷없는 외침을 듣고선 자다가도 일어나 가족을 위해 연탄불을 갈던 어머니의 새벽으로 함께 돌아가서 뒤늦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되새겼다.
‘춥다. 옷 더 입어라’, ‘돈 있나? 용돈 좀 주까?’, ‘저 밖에 풀이 참 잘 자란다’. 부단히 주변을 관찰하고 가족을 챙기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선 살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안도와 행복감을 얻었다. “일반인의 눈에 호스피스 병실의 환자들이 생활도 없고, 그저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편견이다. 그분들에게도 나름의 생활이 있고 남루한 삶이지만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그의 말이다. ‘고마 이 손 잡고 집에 가자’던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웃게 해드리려 초로의 나이에 덩실덩실 춤도 췄다. “엄마가 아파도 인생은 흐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보호자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간병인 제도 등에 대한 단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신 307일간, 규정에 따라 여섯 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다. 다른 환자들처럼 어머니가 그저 향정신성 약물에 취해 있게 두지 않으려는 생각이 의료진과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 보호자와 주치의 사이 ‘협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처치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호스피스는 삶의 본래적 과정과 단절되지 않았다며 각별한 윤리의식도 강조했다.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물음을 남겼다. 박 동문은 삶만큼 죽음도 “외롭되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맞겠다”며 이제부터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골똘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학자 아들의 공부길을 평생 지켜봐준 어머니다. ‘내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안됐다’며 간병하는 아들을 염려하다가도 ‘희병이 가가 정말 공부 잘하데’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다. 동숭동 문리대에서 함께 모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노학자는 다짐한다. “이제 나는 지켜봐주는 엄마 없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길을 가야 한다. 엄마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촌음을 아껴 공부하려 한다. 그게 엄마의 뜻일 것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