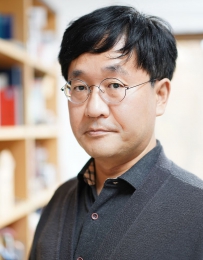[560호 2024년 11월] 기고 에세이
‘정년이’와 나이롱 극장의 추억
이진희 (국민윤리교육84-88)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동문기고
‘정년이’와 나이롱 극장의 추억

이진희
(국민윤리교육84-88)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나이롱 극장’이 있었다. 지붕도 없는 임시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라 ‘나이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여기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들이 짙은 화장을 한 채 다소 과한 몸짓으로 창극을 했다.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 무료입장이라 소일거리로 찾는 사람들은 많았고, 무대 아래 깔아 놓은 가마니에 옹기종기 모여 보곤 했다. 공연이 끝난 후, 물건 판매가 시작되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이들도 있었다. 1970년대 중반,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우리 창극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이롱 극장은 갈 곳 없던 창극인들과 상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협업하던 일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이런 창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바로 TV 드라마 ‘정년이’다.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원작 웹툰이 흥행에 성공했고, 웹툰 사상 최초로 창극으로 제작되어 성황리에 공연도 마쳤다. 이것이 다시 각색되어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등장 배우들은 애써 남도 사투리를 배우고 3년 전부터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흡인력 있게 다가왔고, 나 역시 보는 내내 어릴 때 나이롱 극장의 추억이 잔잔하게 밀려왔다.
드라마의 배경은 1956년, 전쟁 이후 혼란했던 시절, 판소리와 무대를 사랑한 여성국극인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유쾌 발랄한 천재 소리꾼인 주인공 정년이는 만화 ‘달려라 하니’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의 캐릭터를 합쳐놓은 듯, 흙수저의 생존본능 악착같음에 짠함과 정겨움이 묻어있다. 전통 사회에서 근현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난관을 이겨내고 성장해 가는 파란만장한 그녀의 서사는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삶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드라마의 소재가 된 여성국극은 영화나 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서서히 침체되었고, 특히 후진 양성에 힘쓰지 않은 탓에 안타깝게도 명맥을 잇지 못했다. 드라마의 흥행으로 이제 국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례없이 압축 성장을 한 우리는 과거 우리 전통과 옛것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레트로 감성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요즘 세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하여 반갑다. 이번 기회에 국극 등 명맥이 위태로운 전통문화를 지원하고 발굴 복원한다면 K컬처의 붐을 지속하고 알리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