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호 2024년 3월] 문화 나의 취미
1평이라도 정원 직접 가꿔보면 압니다, 행복
정원 마니아 김동훈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1평이라도 정원 직접 가꿔보면 압니다, 행복
김동훈 (법학96-01)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직접 전지 가위 들고 정원 공부
서양 정원 고전서 국내 첫 완역
조경학자일까, 정원가일까. 서양 정원의 최고 고전으로 꼽히는 책을 120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완역한 용기. 해박한 지식과, 원서 속 이국의 정원들을 찾아다니며 3년간 번역에 매달린 집념. 지난해 11월 출간된 번역서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은 이탈리아 정원의 정수가 담긴 책의 가치도 가치지만 의외의 번역자로도 주목받았다. 김동훈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이다.
손수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틈틈이 정원을 공부해온 김 동문은 ‘주경야독’형 정원 마니아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만나 “한국 정원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번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의 세 가지 즐거움을 꼽았다. “보는 즐거움, 하는 즐거움, 갖는 즐거움”이다.
9년 전 방문학자로 이탈리아 헌법을 공부하러 간 로마에서 ‘보는 즐거움’을 제대로 알았다. 현지에서 1904년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이 쓴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을 읽고 이탈리아 정원에 푹 빠졌다. 그 유명한 프랑스와 영국 정원의 원류인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정원의 역사와 구성 원리가 담긴 책이다. “격조 있는 설명으로 정원에 깃든 역사, 건축, 문학, 예술을 알고 보니 정원이 다르게 보였다. 우리도 정원 감상법을 배울 때가 왔다”고 느꼈다.
비전공자에게 어렵고 낯선 내용이지만 직접 정원 일을 해봐서 한결 번역이 수월했다.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자주 가선지 전원이 익숙하고 좋았어요. 결혼 후 서울 근교에 꽤 큰 텃밭을 얻어 농사를 짓다 문득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텃밭 한편에 정원을 꾸렸죠.” 정원 가꾸기가 엄청난 지적, 감성적 소양이 필요한 종합 예술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국내에 나온 모든 정원 책을 섭렵했다.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까지 읽으니 동시대 우리의 미감을 담은 ‘한국식 정원, 한국식 조경’의 부재가 크게 다가왔다. 서양은 물론 일본, 중국도 고유의 정원 문화가 뚜렷하고 정원학이 발달했는데 왜 ‘한국의 정원’은 존재감이 흐릿할까.
“한국에 정원이 별로 없는 건 이탈리아 부유층만큼의 부를 가지지도 못했지만, 사실 대갓집도 마당은 텅 비워놓고 나무 한두 그루 담 옆에 심은 게 다거든요. 유교적 금욕주의 영향이에요. 조선시대에 왕이 창경궁 우물에서 흐르는 물길을 구리로 된 수로로 만들려 하니 신하들이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반대했답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즐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까지 마음 깊이 있는 듯해요. 도시화 이전엔 늘 자연이 가까웠으니 정원을 가꿀 필요도 못 느꼈을 거고요.”
자연 경관 자체가 정원이 되는 한국 ‘원림(園林)’의 극치로 담양 소쇄원, 창덕궁 후원 등이 꼽히지만 “한국식 정원을 논하기엔 양도, 질도 아쉽다”는 것이 그의 생각. “한국식 정원이란 무엇인지, 정체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례가 적더라도 한국 정원의 미를 이론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한국식 정원을 만들어 가야죠. 천국, 낙원을 뜻하는 ‘paradise’의 유래는 정원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입니다. 정원이 낙원과 행복의 관념을 지상에 구현한 곳이라면, 나의 행복, 나아가 한국인들의 행복의 관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자연 풍경도 잃고, 아파트살이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은 ‘그림의 떡’이다. “정원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책을 번역하면서 미안하기도 했다”는 그다. “제가 자연을 경험하며 자라고, 작으나마 내 텃밭과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행운이죠. 하지만 정원이 정말 운 좋은 사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듯이 여겨지는 건 안타깝기도 합니다. 도시에선 공원이 정원을 대체한다고도 하지만, 진짜 편안함과 행복은 내 개성대로 꾸미고 관리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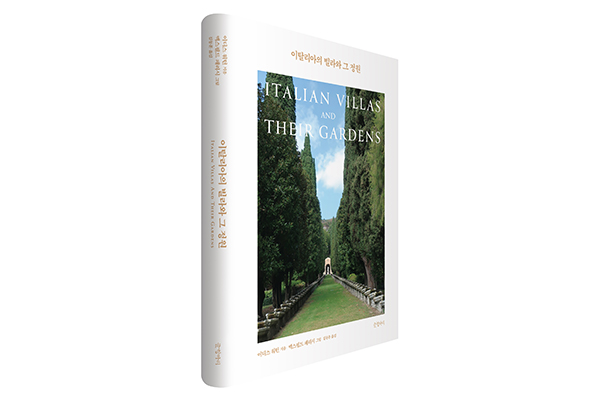
김 동문이 번역한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

김 동문이 상주 할머니 댁에 가꾸는 정원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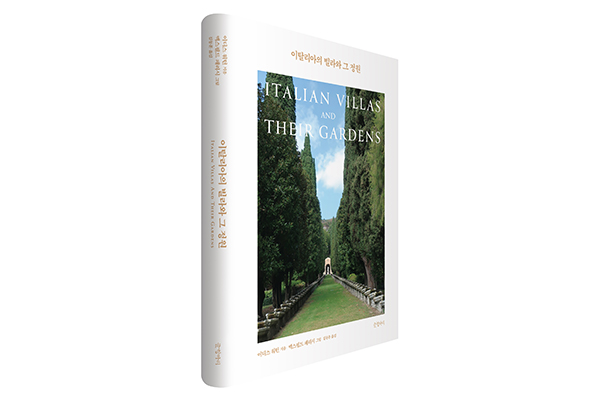
김 동문이 번역한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
넉 달 전 나온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은 예상보다 빨리 2쇄를 찍을 것 같다. 우리도 정원에 관심이 없지 않다는 방증이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한 뙈기 가졌다면, 김 동문처럼 그 구석에서 정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정원도 과실수와 채소를 심은 실용적 정원에서 출발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상하는 ‘기쁨의 정원’으로 발전해 왔다. 그는 “정원을 둘러싼 돌담도 돌 모양 하나하나 골라 직접 쌓았다. 농사와 달리 정원 가꾸기는 마치 그림 그리듯 예술 작업을 하는 듯한 재미가 있더라”면서, 작더라도 내 소유의 땅이면 더 좋을 거라고 말했다.
“요즘 텃밭 분양도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1년 후 돌려줄 땅과 내 땅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공원과 정원의 차이랄까요. 내 땅을 일구고 있으면 붕 뜬 존재같던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하늘과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 사람들이 자기 땅 딱 한 평만 가져도 인생이 행복할 텐데 싶더군요. 국민 1인, 아니 가족당 한 평씩이라도 자기 땅을 일구는 날이 꼭 왔으면 해요.”
“요즘 텃밭 분양도 많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1년 후 돌려줄 땅과 내 땅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공원과 정원의 차이랄까요. 내 땅을 일구고 있으면 붕 뜬 존재같던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하늘과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 사람들이 자기 땅 딱 한 평만 가져도 인생이 행복할 텐데 싶더군요. 국민 1인, 아니 가족당 한 평씩이라도 자기 땅을 일구는 날이 꼭 왔으면 해요.”
그가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연구관의 길을 택한 건 “헌법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헌법에 ‘국가는 경관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된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했다. 정원 관련 경관법도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하위법에 만들어도 되는데, 헌법에 있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디스 워튼이 책을 쓴 지 120년 후에 가도 정원 풍경이 똑같은 이유를 알았죠. 정원은 홀로 아름다울 수 없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때 그 가치가 빛나요. 한국에 2007년 경관법이 생겼지만 실효성이 약해 ‘왕릉뷰 아파트’ 같은 일이 있었죠. 언젠가 경관법으로 논문도 써보고 싶네요.”
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