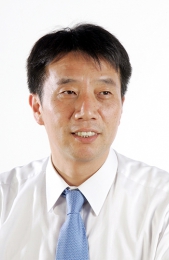[537호 2022년 12월] 오피니언 추억의창
추억의 창: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홍영준(의학84-90) 원자력병원 원장·수필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홍영준
의학84-90
원자력병원 원장·수필가
서울의대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것저것 첫 학기 등록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큰 눈이 내려 길이 몹시 미끄러운데도 어머니는 굳이 아들과 함께 가길 원하셨다. 연건동에서 약대를 졸업하신 어머니는 아들이 동문이 된 게 한없이 자랑스러우셨던 게다. 그간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을 관악캠퍼스가 신입생 아들로 인해 불쑥 친근하게 다가왔고 내친김에 연건동으로 각인된 당신 모교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고 싶으셨을 것 같다.
어머니와 함께 둘러보던 서울대 교정은 눈에 파묻혀 놀랍도록 고요했다. 육각형의 결정체가 다양한 크기의 눈송이를 만들면서 입자 사이에 생겨난 많은 틈이 주변 소리를 빨아들이기 때문이었다. 뽀드득거리는 발자국과 이따금 나뭇가지에서 후드득 쏟아지는 작은 눈사태만이 적막을 깰 뿐이었다. 관악캠퍼스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그렇게 하얀 눈과 고요함, 그리고 그 속에서 또렷이 느낄 수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후 펼쳐진 나의 의예과 시절은 관악의 첫인상이 무색하게 희뿌연 최루탄 연기로 점철되었다. 학교 정문은 시위 진압을 위해 몰려온 전경들로 인해 걸핏하면 봉쇄되었고 꿈을 노래해야 할 학생들은 처절한 운동가요를 대신 불러댔다. 무력감에 찌들고 불안감에 힘겨워했던 암울한 젊은 날을 보내면서 나는 눈 덮인 관악캠퍼스를 무시로 떠올렸다. 새하얀 눈이 붉고 푸른 상처를 거즈처럼 덮어주고, 그 육각형 결정체가 분노 서린 외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주기를 기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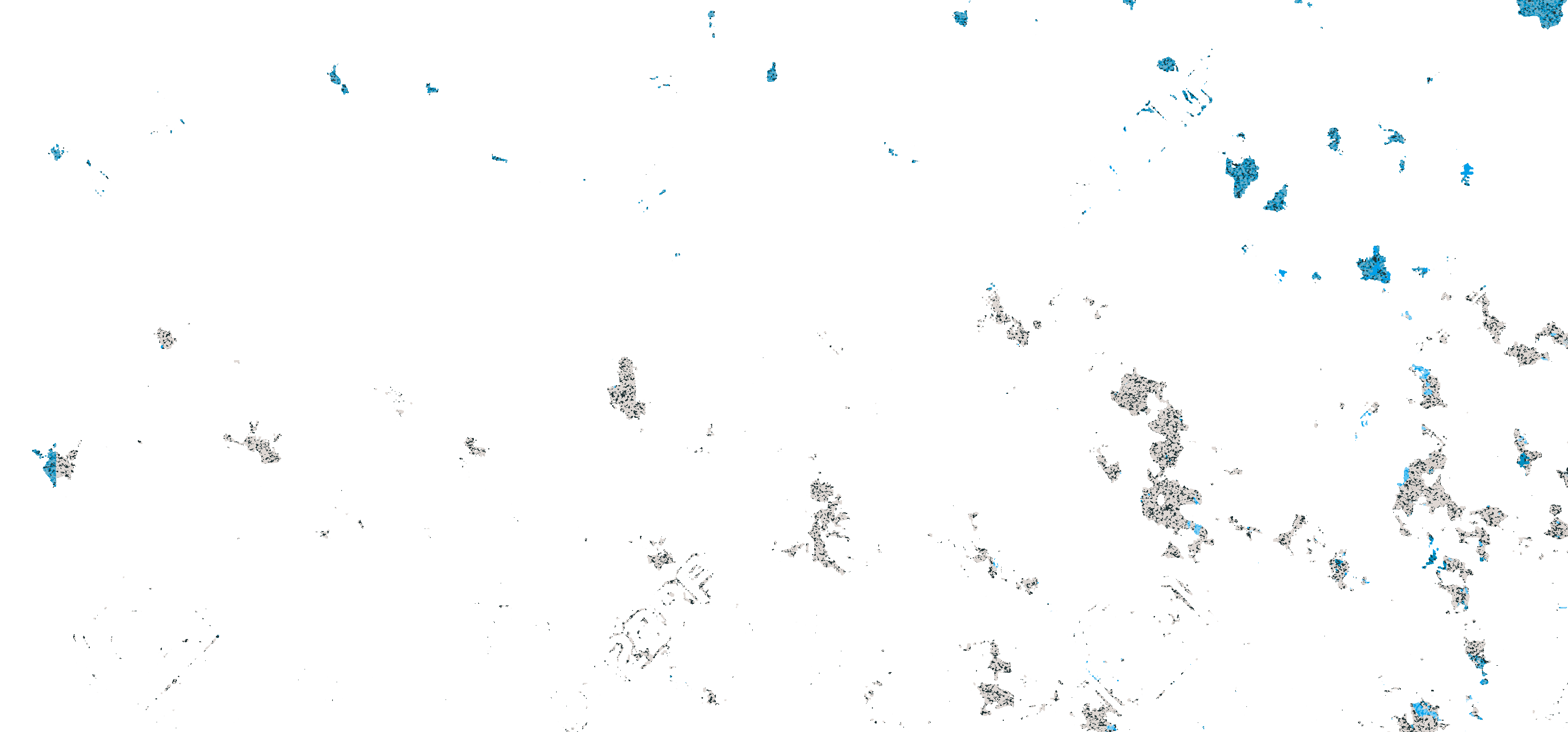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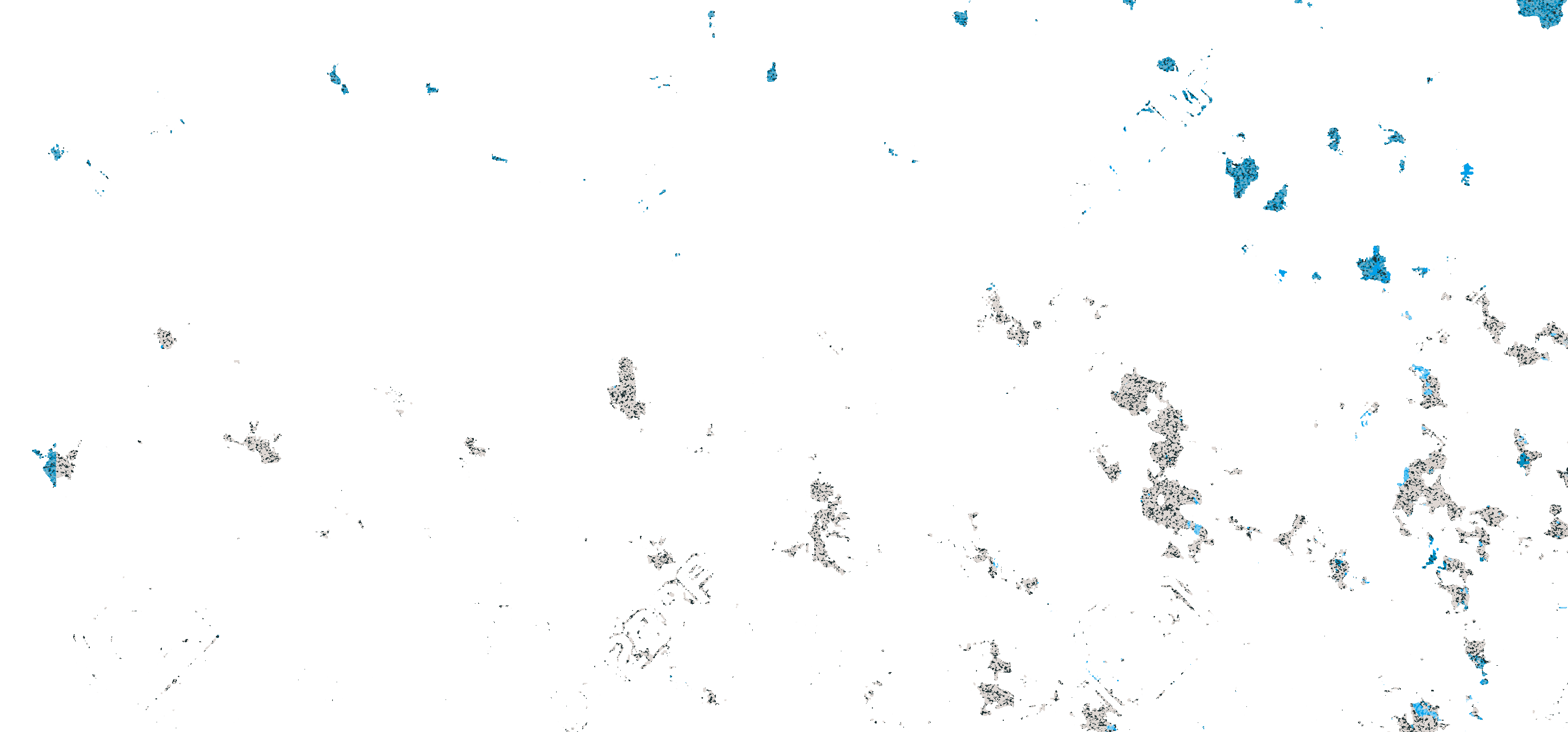
일러스트=김나은(디자인학부4학년) 재학생
의대 본과에 올라가던 해 개강을 얼마 앞두고 눈이 몹시도 많이 내리던 날 연건캠퍼스에서 한 선배를 만났다. ‘골학(骨學)’ 공부에 필요한 사람 뼈를 전달받기 위함이었다. 의대 동아리나 동문회에는 저마다 대대로 전해오는 사람 뼈들이 있기 마련이다. 진짜 사람의 뼈를 처음 본 나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얀 눈 덕에 으스스한 느낌을 접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체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는 경건한 다짐을 할 수 있었다. 해마다 라일락 필 무렵이면 무지막지한 학업 부담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정신 줄을 놓아버린다는 의대 전설이 있을 정도로 본과 생활은 만만치 않았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뼈를 건네받던 날 쏟아지던 서설(瑞雪)과 그날의 마음가짐을 여러 번 떠올렸음은 물론이다.
의대 본과에 올라가던 해 개강을 얼마 앞두고 눈이 몹시도 많이 내리던 날 연건캠퍼스에서 한 선배를 만났다. ‘골학(骨學)’ 공부에 필요한 사람 뼈를 전달받기 위함이었다. 의대 동아리나 동문회에는 저마다 대대로 전해오는 사람 뼈들이 있기 마련이다. 진짜 사람의 뼈를 처음 본 나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얀 눈 덕에 으스스한 느낌을 접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체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는 경건한 다짐을 할 수 있었다. 해마다 라일락 필 무렵이면 무지막지한 학업 부담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정신 줄을 놓아버린다는 의대 전설이 있을 정도로 본과 생활은 만만치 않았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뼈를 건네받던 날 쏟아지던 서설(瑞雪)과 그날의 마음가짐을 여러 번 떠올렸음은 물론이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던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김춘수 시인이 1969년에 발표한 시다. 샤갈의 마을에 3월에 눈이 오면 봄을 바라는 사내는 관자놀이 정맥을 바르르 떨고, 겨울 열매들은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며, 아낙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는 내용의 감각적인 시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엉뚱한 연상작용이지만 서울대학교가 떠오른다.
옛 선배들이 ‘공산당’이니 ‘계집, 술, 담배’니 하면서 자조적으로 일컫던 ‘국립서울대학교’의 상징물은 언젠가부터 발랄한 후배들에 의해 ‘샤’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가로수길’을 본뜬 ‘샤로수길’도 낙성대 쪽에 있다. ‘샤갈의 마을’을 ‘샤고을’ 정도로 줄여 부르면 좋겠고 그럼 당연히 국립서울대학교와 연결된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곧 ‘서울대학교에 내리는 눈’이며, 그 눈은 희망이며 위안이자 새로운 다짐임을 내 대학 시절의 경험이 증명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억지스러운가.
*홍 동문은 원자력병원 연구부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이자 작가다. 의사 수필동인 박달회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글을 쓰고 번역한다. 일터인 병원과 일상에 대한 소회가 담긴 에세이집 ‘공릉역 2번 출구, 그곳에서 별을 보다’를 최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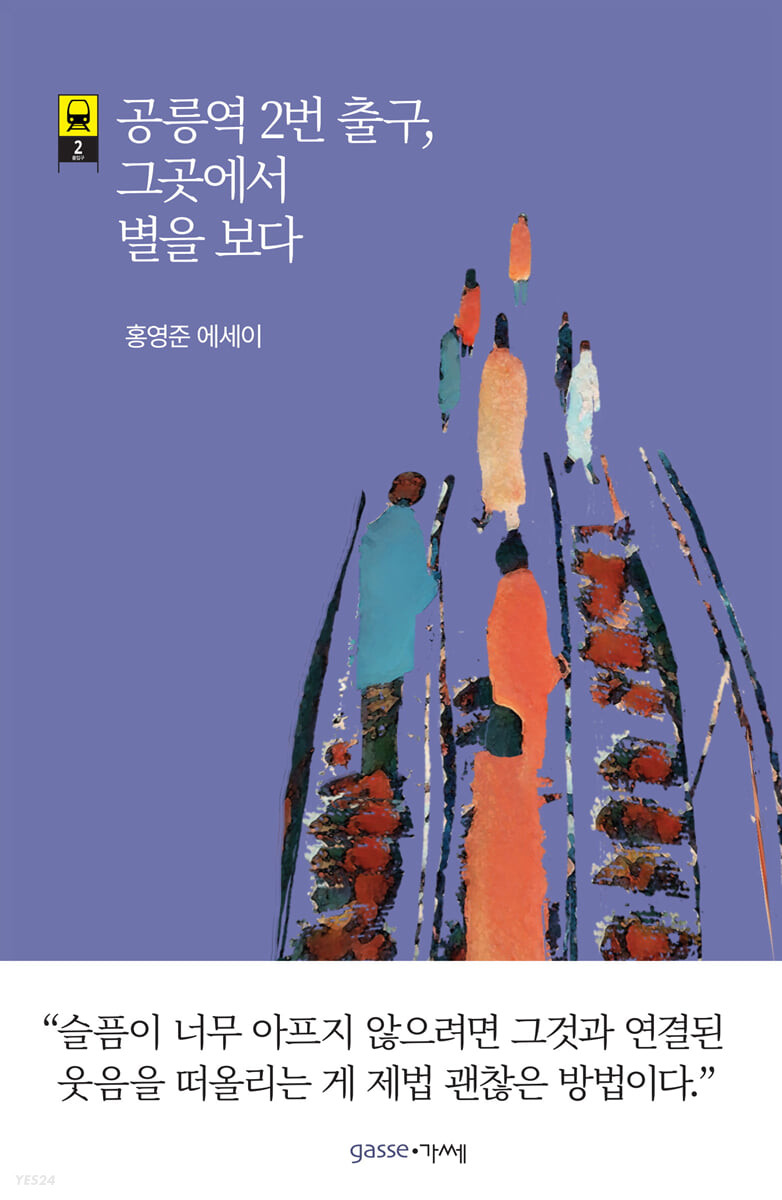
홍 동문의 책 '공릉역 2번 출구, 그곳에서 별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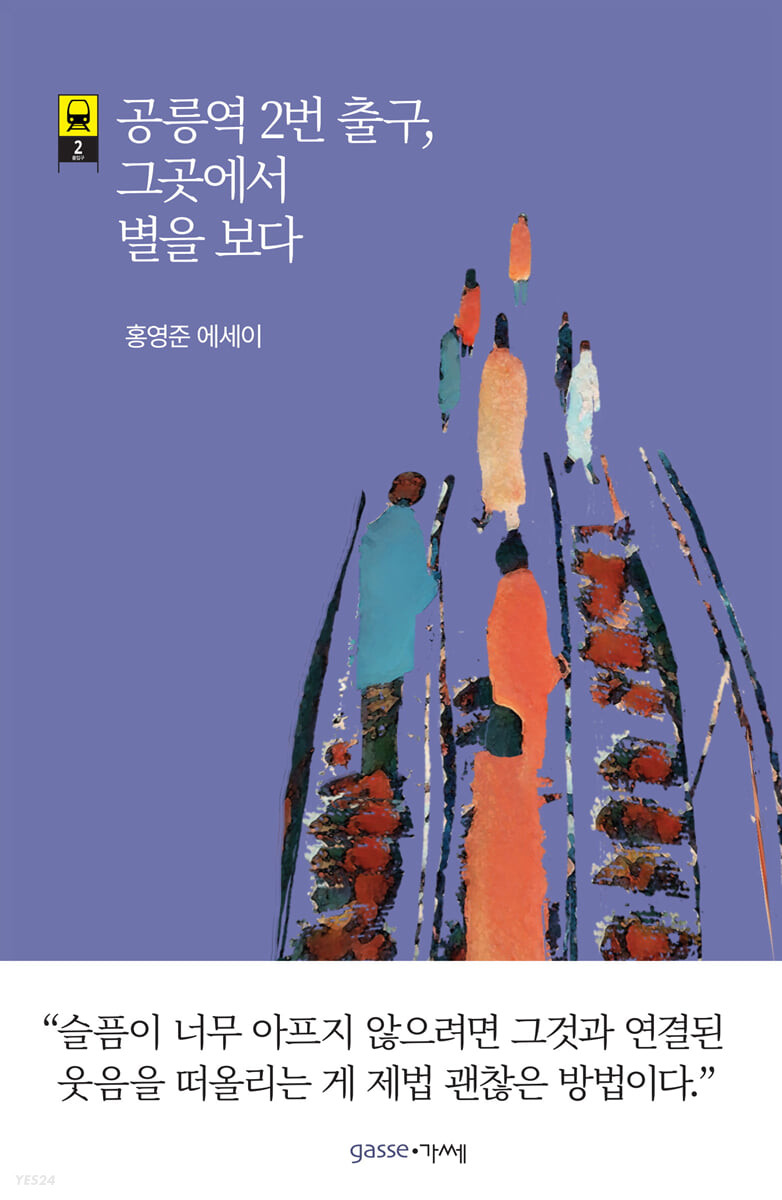
홍 동문의 책 '공릉역 2번 출구, 그곳에서 별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