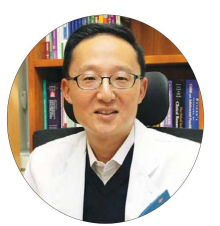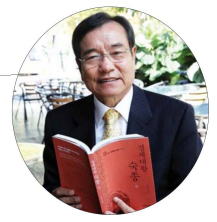[438호 2014년 9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경상대 인문한국 최원석 교수 20년간 지리·풍수 연구한 자칭 ‘산가’ “산의 인문학적 전통 계승·회복에 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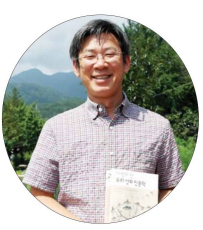
경상대 인문한국 최원석 교수
20년간 지리·풍수 연구한 자칭 ‘산가’
“산의 인문학적 전통 계승·회복에 진력”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지는 약 70%를 차지한다. 경상대 인문한국(HK) 최원석(지리82-89) 교수의 저서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한길사刊)에 따르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더 크게 산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이 책은 우리 겨레와 산이 함께 진화해온 과정을 문화적·역사적으로 밝혔다. 주로 자연생태학적으로 이루어져온 산 연구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풀어내 화제가 됐다.
저자인 최 동문은 ‘산가’를 자처한다. 그에게 이 책은 “20여 년간 산을 공부해온 삶의 궤적이자 분신”이다. 최 동문의 산 이야기는 오랜 시간 맺어온 한국인과 산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민족에겐 ‘산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산악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산이 삶의 원형 공간으로서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죠. 도시나 마을 공간을 구성할 때는 꼭 산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상인 풍수도 우리 산천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틀로 활용했고요.”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 사사
‘산천 유전자’가 가장 뚜렷하게 발현된 것이 ‘조산’의 전통이다. 선조들은 먼저 배산임수에 입각해 고을을 형성했다. 그래도 지형·지세가 부족한 곳은 흙이나 돌을 인공 산처럼 쌓고 나무를 심는 조산을 통해 보완했다. 최 동문은 “우리네 조산은 천연스러운 멋이 있다”며 “현장 답사를 가면 마을숲이며 돌무더기들이 인공인지 자연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자연을 슬며시 이어냈다”고 감탄을 전했다.
최 동문은 한국 풍수지리학의 대가인 최창조(지리69-73) 전 모교 교수에게서 석사과정부터 풍수를 배웠다. 서양 근대지리학이 어딘가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했던 그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가르침이었다. 명당에 집착하는 중국 풍수도 체질에 맞지 않았다. 좋지 않은 땅도 명당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비보풍수를 전공으로 택했다. 한국 풍수의 핵심 키워드인 산을 주제로 모교에서 석사 논문을, 고려대에서 박사 논문을 썼다.
답사를 위해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의 산을 발로 뛰는가 하면, 고지도와 지리지 등 방대한 고문헌도 살펴봤다. 그 결과 이미 한국에 ‘산의 인문학’이라고 할 만한 훌륭한 전통 지식이 축적돼 있음을 확인했다. 그의 연구는 풍요로웠던 산의 인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회복하는 의미도 지닌다.
요즘 최 동문은 지리산의 문화를 연구 중이다. 지리산은 오랜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깃들어 살아온 전형적인 ‘사람의 산’이다. 사람들의 생활 터전과 산의 자연 생태·역사·문화·종교 등이 거대하게 결합돼 있어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민간생활사의 자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지리산이 세계와 인류의 신성한 ‘어머니 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 동문은 자택도 당연히 눈앞에 바로 산이 보이는 집을 택했다. 풍수학자는 어떻게 좋은 집터를 고르는지 비법을 묻자, 그는 복잡한 풍수 이론 대신 “사람도 편하고 수수한 이를 좋아하듯이 자연도 사람처럼 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평생 학문으로서 풍수를 대하며 함부로 풍수 조언하는 이른바 ‘반풍수’, 얼치기 풍수를 경계해온 그의 대답이다.
지리산 문화 세계유산 제안
문득 모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악산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 어머니 등에 아이가 업히듯 관악산이 모교를 업은 모양입니다. 등에 업을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아이지요. 품에 있을 때보다 자립심도 길러지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호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등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다소 알쏭달쏭한 대답을 내놓은 최 동문은 “풍수를 전혀 모르는 아내가 말해준 것”이라며 웃음지었다.
오랜 연구 기간만큼 두꺼운 그의 저서지만 책장을 덮을 때는 종주를 마치고 하산하는 듯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어느덧 가을 산이 성큼 눈에 들어오는 계절을 맞아 최 동문은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요즘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 많이들 즐겨 찾으시죠. 주민들도 만나고, 삶의 자취와 문화를 느끼는 산행 풍속도는 ‘등산’보다 옛 선비들이 즐겼던 유람에 가까운 듯합니다. 등산 장비를 갖추듯이 산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유산하신다면 산행이 훨씬 풍요로워지고, 사람과 산 사이의 관계도 이상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요. 제 연구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