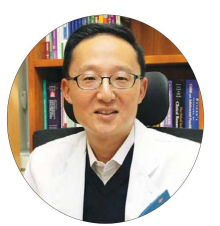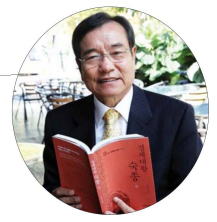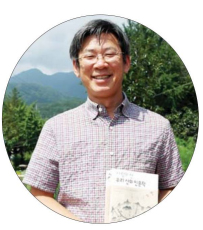[438호 2014년 9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동양화과 이종상 명예교수 신리성지서 한국 천주교 역사 기록화 작업

모교 동양화과 이종상 명예교수
신리성지서 한국 천주교 역사 기록화 작업
진경산수 대가… 독도 회화에 담은 첫 작가
일랑 이종상(회화59-63) 화백. 그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최초’, ‘최고’란 수식어가 붙는다. 생존하는 유일의 화폐 영정 작가, 최초의 고구려 벽화 연구 작가, 미대 출신 첫 모교 박물관장, 최초의 철학박사 미대 교수, 독도를 처음 회화에 담은 작가, 진경산수의 대가 등등.
김형영 시인은 이 화백을 두고 “수없는 회오리바람의 늪에서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미완의 구도자, 뼈를 깎는 실험정신으로 따를 수 없이 홀로 기더니만 어느 사이 무법의 문턱에 들어선 대자유인”이라며 “욕심 많은 ‘금강도사’”라 불렀다. 지칠 줄 모르는 노화백의 무한 에너지에 대한 찬사이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기도 한 이 화백은 요즘 경기도 파주에서 한국 천주교 기록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황 방한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타 직업 중에는 좀처럼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그를 8월 26일 서울 평창동 카페에서 만났다.
‘금강도사’에 비견되는 기운
이 화백은 충남 당진의 천주교 유적지인 신리성지에 조성된 다블뤼 주교 기념관에 다블뤼 주교와 순교 성인 4위의 주요 행적을 기록화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박물관, 대법원 청사, 삼성 본관, 국립극장 로비 등에 걸린 작품을 본 동문은 잘 알겠지만, 그의 작품 중에는 4m가 넘는 것들이 많다. 이번에 그리는 기록화도 1천 호가 넘는 대작이다.
“큰 작품을 하다 보니 늘 공간이 문제입니다. 평창동 작업실에선 무리가 있어 서울 근교에서 찾다 파주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오래전 딸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화 테레사상’을 제작하던 곳과 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바칠 작품을 만들 곳이니 이곳에서 하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예술을 종교로 삼아왔던 그에게 자신을 닮아 미대에 입학했던 딸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딸아이의 생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안 본 색, 안 본 세계가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종교적 영성이 바탕이 돼야 참된 작품도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작업 중인 순교 성인들의 행적을 연구하며 한국의 자생 천주교 역사를 그림에 담으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5천 원·5만 원권 영정 그려
화폐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손만 만져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이 화백은 5천 원권과 5만 원권 지폐의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을 그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고 싶어할까.
“예전에 한 협회 사람들이 초청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가 끝났는데 질문도 없다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5천 원짜리 화폐에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는 겁니다. 5만 원권이 나오기 전 시절이죠. 그걸 어떻게 다 해주나. 못 해주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는데, 협회장이 따라와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약속을 꼭 지킬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원들이 가져왔다는 돈에 사인을 해줬는데 그걸로 100배를 받고 팔아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중국 낙양성에 소학교를 지어줬더라고요.”
과학과 신앙으로 그림을 완성하다
지인들에게 이 화백은 ‘맥가이버’로 통한다. 기계에 능통하기 때문. 자동차 수리도 웬만해서는 손수 해결한다. 여초 김광섭 선생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구상 화가 김태 선생은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그를 불렀단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15년 이상 된 구형이지만 외관도 깨끗하고 성능도 말짱하다. 그의 손목에는 스마트시계, 가방에는 늘 태블릿 PC가 있다.
“루브르미술관에서 제 작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뢰했을 때,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작업해 루브르미술관 카루젤 성벽에 걸 작품과 공간 구조를 보여줬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건축물을 지을 때도 3D로 제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물질의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 자연을 담는 데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 반쪽짜리 작품밖에 표현할 수 없죠.”
이날 인터뷰는 5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마쳤다. 남다른 성장 과정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자생 미학에 대한 예술세계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모교 박물관장 시절 미술관 유치와 미대에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이야기 등은 풀어내지 못해 아쉽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