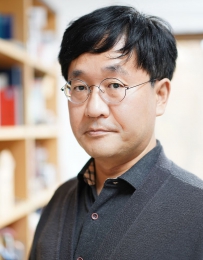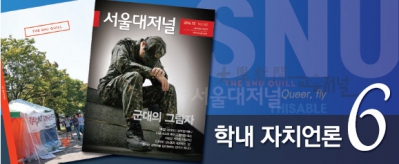[488호 2018년 11월] 오피니언 재학생의 소리
제27대 총장선출을 바라보며
조정빈 언어학과 4학년 대학신문 편집장
두 번째 제27대 총장선출도 이제 중간지점을 지났다. ‘대학신문’에서 활동한 2년 중 절반 가량은 제27대 총장선출이 이어졌다. 내가 편집장이 되고 겪은 최초의 사건이 총장최종후보자의 성추문과 불명예사퇴였으니, 수십년 후에도 학보사 시절을 떠올리면 ‘총장선출’이 자연스레 뒤따라 나올 것만 같다.
2018년 7월 6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총장은 4년에 한 번 뽑고 신문사 임기는 2년이니 이론적으로 한 기자가 두 번의 총장선출을 겪는 것은 불가능해야 했다. 또 한 번의 총장선출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다신 없어야 할 일이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총장선출을 보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학내 구성원 여럿을 모아 좌담회를 두 번이나 열고, 금요일에 급하게 면수를 늘리면서까지 인터뷰나 각종 보도를 충실히 담아내려 노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여론은 잠잠했다. 총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학내가 들썩였던 것도 잠시였다. 페이스북 페이지 기사의 도달률은 평균에 못 미쳤고, 홈페이지 기사 조회수도 기대보다 낮았다. 총장선출과 관련해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정책평가단에 등록하는 화면을 연출해 1면 사진에 넣기도 했다. 바뀐 건 없었다. 모 교수님은 기껏 학생들 총장선출에 참여시켜줬더니 정책평가단 등록도 안 한다며 수업 때 불평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학생들이 투표해봤자 반영비는 약 7%니 사표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속상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속상해야 할 부분은 총장이라는 자리의 존재감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왜 정책평가단에 등록하지 않는지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총장선출 소식에 무심하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속상해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총장의 무존재감에서 비롯한다. 총장 직무대리 체제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는 없다. 학교는 늘 그렇듯 어기적어기적 어떻게든 굴러간다. 몇 가지를 빼면 천편일률적인 총장후보자들의 공약은 누가 뽑히든 학교는 지금 모습 그대로일 거라는 비관적 인식을 낳는다. 거대한 ‘국립대학법인’의 리더라는 자리가 무색하게도 누가 되든 학내 사회에 희망을 주진 못한다.
거대조직인 서울대가 총장 한 명 잘 뽑는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는 어느 서울대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서울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 비전 없인 총장이 누가 되든 서울대는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이 상태로는 지금 후보자들이 운운하는 ‘위기의 서울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