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호 2024년 10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한눈팔지 않고 좋은 기사에 집중, 신문사가 살아남는 최선의 길”
고문정 모교 언론정보학과 박사
“한눈팔지 않고 좋은 기사에 집중, 신문사가 살아남는 최선의 길”
고문정 (경제07-11)
모교 언론정보학과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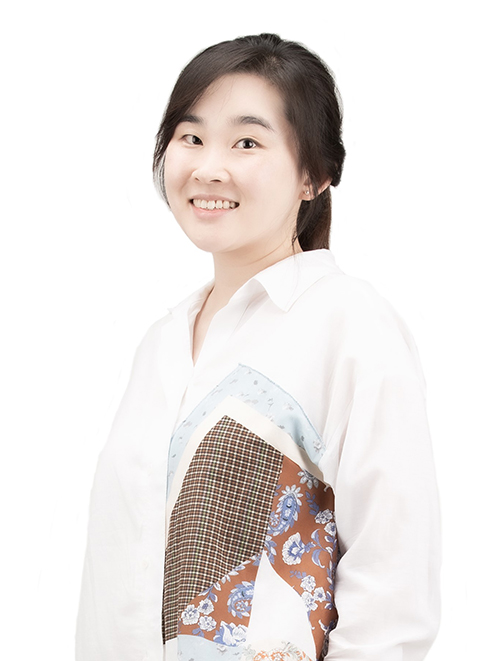
70개 신문사 사업 전략 분석
1회 정신영저널리즘 학술상
지난 8월 모교에서 언론정보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고문정 동문이 졸업 논문으로 제1회 정신영 저널리즘 학술상을 받았다.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의 탐색: 품질, 주목,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적 추구’란 제목으로 쓴 이 논문은 그동안 도외시됐던 언론의 상업성을 드러낸 연구로, 신문사가 좋은 기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언론의 사명이나 책무 때문만은 아니며, 상품으로서 좋은 기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고문정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인지 저에겐 모든 주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했어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고고한 규범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쌓인 반면, 기업으로서 신문사가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미디어 조직의 수익 창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널리즘적 가치들과 신문사의 운영 전략을 결합하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흔히 언론의 공공성과 상업성은 서로 양립하기 힘든 ‘딜레마’로 인식되는 데 반해, 고 동문은 저널리즘적 가치를 수익화하는 전략을 ‘일관적으로’ 지킬 때 투자와 품질, 주목,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투자는 기사 생산이나 광고 영업 등에 들어가는 취재비 교통비 인건비 교육비 회의비 원고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품질은 물론 기사의 질을 뜻하며, 경제적 성과는 매출이나 이윤의 증대다.
“주목은 신문사가 기사를 통해 획득하는 대중의 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이용자의 주목을 얻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 연구는 외려 뉴스를 매개로 한 주목 경쟁엔 소홀한 채 저품질 기사를 생산하는 것으로 비용 감축 경쟁을 벌이거나 기업 협찬 수익에 의존하거나 용역사업, 부동산 사업 등 뉴스 외 사업으로 다각화를 많이 할 경우 투자-품질-주목-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비용 감축 전략은 매우 적극적으로 펼친 일부 신문사에서만 효과가 나타나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외려 손해라는 결과가 나왔죠.”
좋은 기사에 투자해 주목을 받고 독자층을 넓히는 저널리즘적 가치 추구가 신문사의 이윤을 늘리고 나아가 언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과 상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 논문은 학술적 통계적으로 증명해냈다.
고 동문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언론의 성과, 모두를 개선하기 위해선 언론인 개개인의 노력이나 용기만으론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사업전략 같은 조직의 구조적 측면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라고. 언론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같은 가치들이 지속가능하게 추구되려면 이러한 규범들이 언론인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언론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뿐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품질과 주목,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할 때 그것이 가능하리란 뜻에서 제목을 정했고요. 11년간 축적된 온·오프라인 신문사 7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각 언론사의 사업전략, 기사 생산 전략이 기업 목표와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느 정도 유형화되더군요.”
그 결과 소위 메이저 언론사로 불리는 국내 일간지 중 상당수가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고려가 낮으면서도 단기 목표를 두고 비용 최소화 전략을 펼치는 신문사들’로 분류됐다. 유력 매체들이 외려 비윤리적 기사, 기사형 광고를 양산하며, 자회사를 동원해 온라인 트래픽을 높이는 데 치중할 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자원과 브랜드이미지,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쉽게 돈 버는 데에만 골몰한다는 것. 저널리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전략이지만, 고 동문은 “언론사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사업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선택이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저널리즘의 질적 위기와 신뢰 하락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포털 중심의 유통 구조나 뉴스소비자의 취향 같은, 언론사 바깥 상황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외적 환경에서도 대응 전략은 신문사마다 달랐어요. 누군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독자층 확대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더 좋은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고품질 기사를 ‘이달의 기자상’ 수상 기사 위주로 측정한 것은 한계가 있겠으나, 정기적으로 수여되는 상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과거엔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엔 급격히 줄었을 뿐 아니라 재학생 언론인 지망생마저 자취를 감춘 요즘 현상에 대해선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단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엔 나름의 사명감이 좀 적은 연봉이어도 언론계를 택하게 했다면, 실리에 민감한 요즘 젊은 세대는 출신 대학을 떠나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덜 느끼는 것 아니겠냐는 기자의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기레기’란 신조어에서 보듯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예전 같지 않으니 모교 출신 인재들이 언론계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고 동문은 “직업인으로서의 보상과 사회인으로서의 보람을 함께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각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