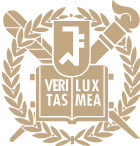[561호 2024년 12월] 인터뷰 화제의 동문
케네스 데이비슨 메달 받아 최고 선박 연구자 인정…“조선업 호황 방심하면 안 돼”
김용환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케네스 데이비슨 메달 받아 최고 선박 연구자 인정…“조선업 호황 방심하면 안 돼”
김용환 (조선공학83-87)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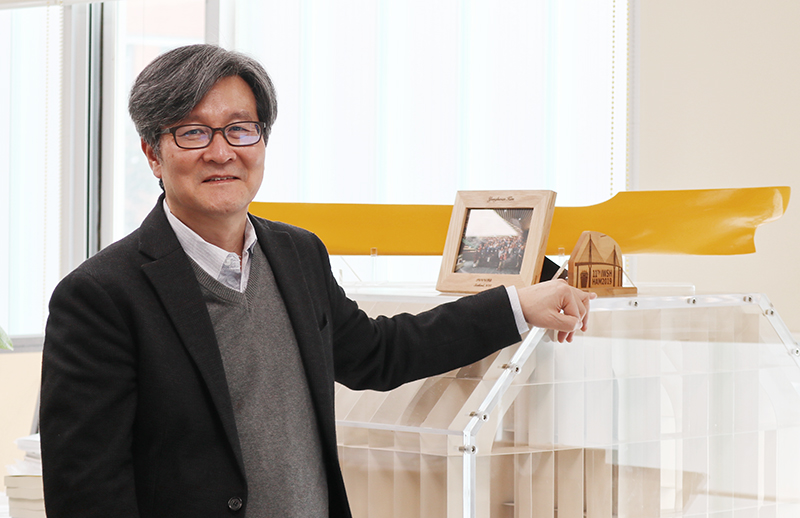
김용환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슬로싱 실험용 모형 곁에 섰다.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지원 상승
“학계에선 모교가 리더십 보여야”
김용환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10월 15일 미국조선학회에서 수여하는 케네스 데이비슨 메달을 받았다. 2년에 한 번 선박 연구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인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메달이다. 한국인 최초이자 비서구권 국가 최초 수상자인 그에게 혹자는 “조선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조선학회와 양대산맥인 영국왕립조선학회 석학회원이기도 하니 무리가 아닌 해석이다.
11월 28일 관악캠퍼스 42-1동에서 만난 김 동문은 “개인적으론 지난해 독일 바인브룸 추모연사로 지명된 게 더 의미가 컸다”고 덤덤히 말했다. “조선공학자로서 평생 가도 못 이룰 것 같았던 꿈이었어요. 메달도, 상장도 없지만 바인브룸 추모 연사 지명은 저희 전공자들에겐 ‘선박 유체역학에서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는 ‘슬로싱(Sloshing)’ 연구의 권위자. 슬로싱은 컵을 흔들면 커피가 출렁이듯, 선박 내 연료 탱크나 액체 화물이 배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는 현상이다. 커피 때문에 잔이 깨질 염려는 없지만 선박에선 다르다. “LNG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에서 액화시켜 운반합니다. 화물창에 극저온을 못 견디는 철을 쓸 수 없어 슬로싱이 주는 충격에 취약해요. 탱크 벽면이 파손되어 LNG가 새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죠.”
이 때문에 선박의 안전성을 승인하는 선급들은 슬로싱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충격을 선박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 김 동문은 LNG선에서 슬로싱 충격 하중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해석법을 개발해 왔다. 그 해석법이 올해 초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와 한국 등 세계 주요 선급에서 통합해석절차로 승인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동안 선급마다 다른 해석법에 맞춰 조선소들이 매번 실험과 해석을 달리했어요. 서울대가 통합을 이뤘죠. 프랑스 회사 GTT와 함께 서울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슬로싱 실험 데이터를 가진 덕분이었어요. 몇몇 선급은 서울대 절차를 본떠 해석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잘나가는데, 한국 조선공학엔 왜 이런 세계적인 성취가 드물었을까. 1972년 울산조선소 건설 이후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에 오른 2000년대 이전까지 국내 조선공학과는 전국에 단 몇 개뿐이었다. 1946년부터 항공조선과가 있던 모교를 필두로 소수의 인재들이 조선 입국을 다졌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자 전국 조선공학 교육과정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백년 전부터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선공학을 선도해 온 미국과 영국을 우리가 따라잡아 온 게 지난 몇십년입니다.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아카데믹 리더십을 가진 연구자는 많지 않아 보여요. 학생 많이 배출하고, 취업시키는 노력은 했는데 학문적으로 성숙한 역량을 보여주진 못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산업계와 학계 양면으로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조선공학과 입학생이 5배, 교수는 10배 많습니다. 논문 수는 20배고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도 뛰어나요. 중국은 ‘국가중점실험실(Key Laboratory)’을 두고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조선공학에서 서울대의 라이벌인 상하이교통대에 우리 대학의 약 3배 규모 수조와 최대깊이 45m까지 실험할 수 있는 해양수조가 있는데 정부나 기업체가 협약을 맺어 장기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줘요. 우리로선 상상 못 할 일이죠.”
김 동문이 이끄는 선박유탄성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영국 로이드선급재단에서 120여 억원을 지원 받아 선박 유탄성 연구와 안전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초임 교수 시절부터 김 동문의 역량을 높게 산 결과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실은 단기적인 산업체와 정부 연구비를 받아 운영하느라 장기적 연구를 지속할 여력이 부족하다. “한국의 조선 생태계가 좋아지려면 다각도에서 조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졸업생들이 중소 조선소도 가고, 기자재 산업과 해운 쪽도 가고, 정부에서 정책도 만들어 내야죠. 글로벌 조선 시장점유율이 평균 8%밖에 안 되는 일본의 동경대가 학과는 없어도 여전히 조선해양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뽑는 건 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요직에 들어가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중소형 상선 조선소도 변변히 없는 영국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를 보유하고 여전히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세대가 후배들에게 그런 다양성을 못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희망적인 건 최근 생산, 친환경, 디지털, AI 등으로 조선공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 한때 걱정을 샀던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진학률도 최근 많이 개선됐다. 김 동문은 “사실 나도 젊을 땐 조선공학에 인생을 바치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입시 점수에 맞춰 입학했고, 그저 대기업이라 대형 조선소 연구소에 취직했는데 근무 하면서 제게 연구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모교 선배의 권유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MIT에서 연구교원을 할 때 ‘한국에 돌아가서 가르치고 연구하라’던 동료의 말을 따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이제는 제 인생의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선업 성공의 우산 아래 있던 학계가 앞장서야죠. 특히 서울대라면 학문과 교육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